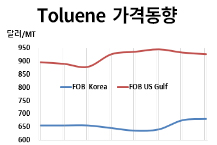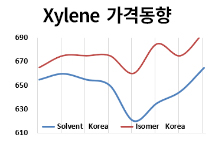2020년은 연초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불어닥치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해였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홍콩 독감이나 메르스 정도로 여겼으나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해 12월18일 현재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75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67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이러니는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확진자 176만명, 사망자 31만7500명으로 모두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중국산 수입규제에 나서고 중국이 협상으로 해결을 시도할 때까지도 미국의 힘과 지도력을 의심하지 않았으나 유럽이 무너진데 이어 미국까지 처참하게 짓밟힘으로써 중국의 코로나19 전략이 먹혀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제기될 정도이다.
화학산업은 미국의 중국산 수입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침으로써 2020년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연초에는 2019년 가을부터 시작된 중국 경제 침체의 후폭풍에서 벗어나는 듯했으나 곧바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짐으로써 자동차, 전자 등 수요산업 공장 가동중단으로 이어져 질곡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코로나19 퇴치를 선언하고 경제 활성화에 나서면서 석유화학은 사상 초유의 폭등사태를 경험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일정수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 유럽이 침체된 가운데 나타난 폭등현상을 과연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스럽게 작동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수요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공급과잉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현물가격이 일방적으로 폭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더군다나 PE가 그렇고, ABS가 그렇듯이 아시아 가격 폭등의 배후에는 중국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메이저인 사이노펙이 중국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하거나 내수가격이 폭등하면 현물가격이 뒤따라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국이 과연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신증설을 통해 자급률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중국 메이저들이 현물가격 폭등을 선도함으로써 현물가격이 폭등하면 중국의 수입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현물가격 폭등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때아닌 횡재를 한 기분이 들겠지만 중국의 특이한 행동과 행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꾸로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언제 한국산 수입을 규제하고 나설지 알 수 없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태 때도 한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보복을 취하지 않았던가.
우리에게 일본이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이라면, 중국은 과연 가까우면서도 친근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정부의 태도도 그렇고, 중국 국민의 자세도 그렇고 아마도 정반대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국은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상임에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