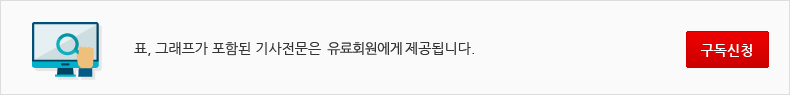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정답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당사자들이 행하는 외교와 경제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거둘 것인지도 확신하지 못한 채 파워게임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정치적‧경제적 위상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생산의 30% 이상을, 글로벌 소비의 50% 수준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을 마다하지 않고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지향점이 불분명해지면서 글로벌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으며, 중국 수요를 겨냥해 중국 진출을 강화하던 글로벌 석유‧화학 메이저들도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나 합작투자를 주저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이 대격변(Great Divergence)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서구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글로벌기업들이 중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홍콩을 복속하면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음은 물론 중국 지도자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최근에는 여자 같은 미모를 이유로 아이돌까지 퇴출시킨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1970-1980년대 일본의 성장에 이어 1980-1990년대에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며 해외기업의 중국 투자를 장려했으나 글로벌 경제성장의 45%를 담당하고 있는 오늘은 자급자족을 외치며 미국을 견제하기에 바쁘고 중국식 사회자본주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급성장세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글로벌기업들도 리쇼어링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떠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2005년 16%에서 2018년 10%로 하락했다.
그런데도 바스프가 중국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바스프는 글로벌 화학기업이지만 미국기업이 아닌 독일기업이라는 점이다. 미국-중국 대결국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정치적 결정을 따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 적과 동지는 어제와 오늘 다를 수 있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소비재나 유통 분야는 거래가격 설정, 공급품목 선택, 디지털화 등에서 중국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쉽지 않지만 화학은 산업의 중간소재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코스트 경쟁력과 품질이 최우선한다는 점이다. 중국 화학기업들이 자급화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나 바스프 수준을 따라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래인 2030년경에는 아시아가 글로벌 경제를 주름잡을 것이 분명한 가운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교두보로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과거 중국이 불확실할 때는 한국이나 일본을 교두보로 중국에 진출했다면, 반대로 중국을 교두보로 확보한 가운데 동남아, 인디아 시장을 공략한다면 글로벌 1위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중국의 정치적‧지정학적 대립 구도는 디지털 기술의 주도권을 넘어 생존게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고 영업 관련 데이터 보호, 환경, 노동 등 복합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이 화학산업 트렌드를 리드하기 시작했고 전자상거래,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