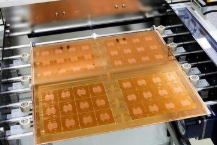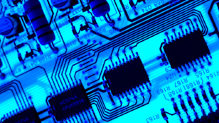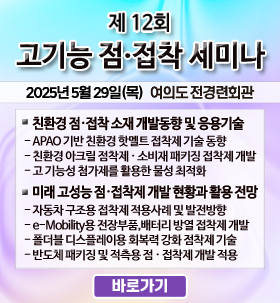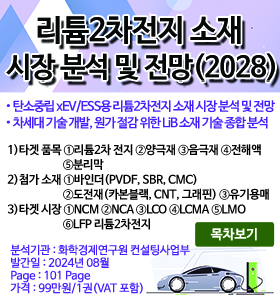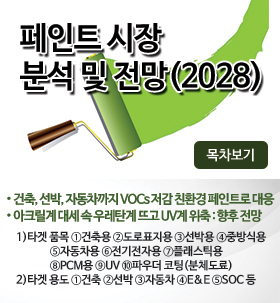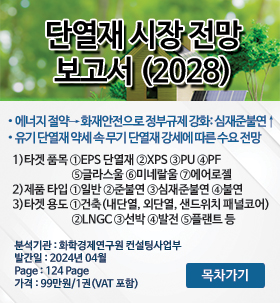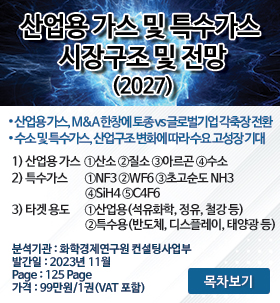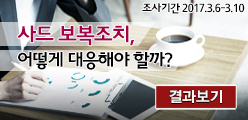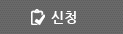|

석유화학과 시멘트가 폐플래스틱 확보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폐플래스틱을 재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시멘트는 쓸모없는 폐플래스틱을 소각해 환경오염을 일정수준 차단하는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시멘트는 원래 섭씨 140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소성공정에서 연료로 석탄을 사용했으나 석탄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폐플래스틱을 열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연료비용을 크게 줄임은 물론 처리비용까지 보조받아 일거양득 효과를 보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는 선진국의 골칫덩어리로 시멘트가 생활폐기물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폐기물 소각, 매립으로 발생하는 코스트와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유연탄 사용량까지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 순환경제 구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유연탄 대신 폐플래스틱을 활용함으로써 유연탄 연소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폐플래스틱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문제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시멘트는 철강, 석유·화학에 이어 3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어서 폐플래스틱 소각을 양보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유럽, 미국, 일본은 1990년대부터 시멘트 제조공정에 생활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997년부터 생활폐기물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기업들은 400만톤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로에서 처리할 수 있어 100% 대체하면 폐플래스틱 8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폐플래스틱 발생량은 961만2000톤으로 2010년 487만8000톤에 비해 2배 증가했고 2020년에는 1000만톤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재활용량이 674만톤에 달한다고 하나 CR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MR도 264만톤으로 27.4%에 그치며 소각(에너지 회수)이 410만톤으로 무려 42.7%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 시멘트, 보일러의 대체연료로 활용하는 TR이 절대적이다.
시멘트의 폐플래스틱 처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이유이다.
그런데 갑자기 석유화학산업계가 시멘트의 폐플래스틱 소각을 중단토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멘트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비용까지 받았더니 난데없이 소각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태에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렇다고 석유화학기업들의 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석유화학은 선진국들이 재생 플래스틱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폐플래스틱 재활용을 서둘러야 하고, 순환경제·탄소중립을 목표로 폐플래스틱을 재활용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너도나도 건설하고 있어 폐플래스틱 400만톤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을 소각 처리하고 있어 100만톤 확보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시멘트는 폐플래스틱 매립을 줄이기 위해 소각을 강요하고 처리비용까지 보조해 줄 때는 언제이고, 필요하니까 소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멘트는 가연성 폐기물 투입량을 2019년 130만톤에서 2021년 230만톤으로 크게 확대하는 등 정부 시책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폐플래스틱을 확보하지 못해 해외에서 폐플래스틱을 구매해야 할 형편이고, 중국공장 건설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스스로의 편익만을 요구하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다. 해외에서 1차 가공을 거친 폐플래스틱은 탄소 감축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석유화학은 폐플래스틱 수집도 스스로 하겠다고 요구해 무리하더니 이제는 폐플래스틱 소각까지 막아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모두 해결해주기를 바랄 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안타까운 현주소이다.
<화학저널 2023년 10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