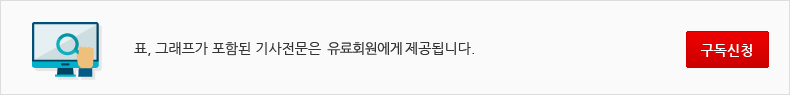에쓰오일(대표 오스만 알 감디)이 에틸렌(Ethylene)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선언해 주목된다.
에쓰오일은 자사 정유공장에서 추출한 오프가스와 나프타(Naphtha) 등을 활용하는 믹스 크래커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FS)를 진행하고 있다.
NCC(Naphtha Cracking Center)에서 생산한 에틸렌 등 기초화학제품을 원료로 유도제품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도 상업화할 방침이다.
총 5조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3년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경쟁 정유기업들이 잇따라 에틸렌 생산을 추진함에 따라 에쓰오일 역시 대규모 투자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에쓰오일이 계획하고 있는 석유화학 컴플렉스는 에틸렌 생산능력 150만톤의 스팀 크래커와 유도제품 플랜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온산 정유공장과 가까운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건설할 계획이다.
온산 정유공장은 원유 처리능력이 하루 67만배럴에 달하며 석유화학 설비 완공 후 단일거점으로는 세계 최대 통합형 생산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40만평방미터 상당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투자를 구체화하고 있다.
에쓰오일 등 정유기업들이 에틸렌 생산에 나서는 것은 석유제품 수요가 곧 절정기를 맞이한 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에쓰오일보다 앞서 에틸렌 생산을 결정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설비를 통합해 나프타 외에도 잉여 중유, 오프가스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여수에 2021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올레핀 생산설비인 MFC(Mixed Feed Cracker)를 건설할 예정이다.
MFC는 국내 및 아시아 석유화학기업들이 주로 가동하는 NCC와 달리 나프타는 물론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생가스 등 다양한 유분을 원료로 투입할 수 있으며 주로 중동 정유기업들이 채용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신규 MFC를 통해 에틸렌 70만톤, PE 50만톤을 생산하고 국내에 공급함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수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 사업 확장을 통해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과 합작으로 2021년까지 대산에 에틸렌 생산능력 75만톤의 NCC를 건설할 계획이다.
총 2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으로 PE 플랜트 건설도 검토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회복을 타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석유화학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에쓰오일도 나프타, 오프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에틸렌에 그치지 않고 PE, PP 등 폴리올레핀(Polyolefin)까지 생산할 방침이다.
정유공장에서 얻은 원료를 석유화학제품으로 완성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정유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에쓰오일은 2014년부터 진행해 4조8000억원대로 투자한 RUC(Residue Upgrading Complex) 및 ODC(Olefin Downstream Complex) 프로젝트를 2018년 마무리했다.
RUC 설비에서는 HS-RFCC(High Severity-Residue Fluid Catalytic Cracker) 프로세스를 통해 잔사유를 프로필렌(Propylene) 66만톤, 에틸렌 20만톤, 휘발유 등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전환하며, ODC는 RUC에서 생산한 프로필렌을 원료로 PP 40만톤 및 PO(Propylene Oxide) 30만톤 등 유도제품을 생산한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NCC 투자를 마무리하는 2022년 에틸렌 생산능력이 170만톤에 달하고, 프로필렌, PE, PP, PO도 상당량을 갖추어 정유기업에서 석유화학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회사인 아람코(Saudi Aramco) 역시 중동, 아시아, 미국에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통합형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에쓰오일의 대규모 투자 역시 아람코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2018년부터 미국이 셰일가스(Shale Gas) 베이스 및 PE 수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어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중도에 투자를 접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