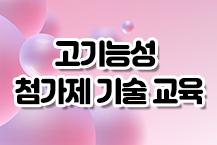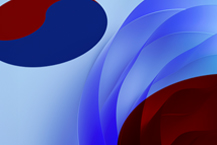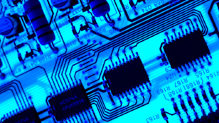|
친환경성 타고 전해질용 수요 기대 … DKS, 대전방지용 주력
화학저널 2019.08.05
이온액체가 물, 유기용매의 뒤를 이어 제3의 액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온액체는 염류이면서 상온에서 액체, 불휘발·불연, 높은 용해력 성능을 갖추고 있어 LiB(리튬이온전지) 전해액을 비롯해 의약품 성분 추출용매, 바이오매스(Biomass) 원료인 셀룰로오스(Cellulose) 용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 진행되고 있다.
수지첨가제, 프로세스 용매 등 시약 이외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온액체 생산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양산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온액체는 양이온과 음이온만으로 구성된 화합물로, 일반적인 염류는 상온에서 고체상태로 액체(용융염)로 만들기 위해서는 300-400℃ 이상 가열해야 하지만 이온액체는 영하 100℃에서 영상 200℃ 영역에서 액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400℃ 이상 고온에서도 물성이 안정적이다.
이온액체 연구개발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1990년 초반으로, PC 등 일반 사용자용 전자기기가 보급되면서 LiB를 비롯한 다양한 전해질 소재가 주목받아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불휘발성일 뿐만 아니라 불연이고 화학적 특성이 뛰어나 폭발·화재 등이 일어나기 어려운 고안전성 소재로 일부 영역에서 실용화됐으며 앞으로도 보급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2차전지 전해질과 함께 잠재적으로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영역은 바이오매스 연료 제조를 위한 셀룰로오스 용해 분야로, 이온액체는 식물섬유의 견고한 수소결합을 풀어내는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침지만으로 셀룰로오스만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온·고압 환경에서 알칼리 처리하는 기존 공법과 같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용도에서도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온액체는 피부침투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어 유효성분을 이온액체에 녹여 부착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다.
이밖에 자성을 보유한 이온액체를 사용한 DDS(Drug Delivery System)용 바이오캡슐 소재, 식물소재에서 유효성분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제약용 용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화학 프로세스에서는 환경부담이 적은 그린케미스트리를 위한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온액체는 불휘발성이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처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회수·재이용이 가능해 화학 프로세스 용매나 추출용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코스트 문제는 보급을 위한 과제가 되고 있다.
수치첨가제 등 상업 생산하고 있는 것도 있으나 수요 대부분은 연구개발용 시약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체로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톤 단위로 주문이 들어오는 사례도 있어 이온액체 생산기업들이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양산체제를 정비하고 있어 코스트 하락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DKS가 이온액체를 대전방지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소량 첨가만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코스트 경쟁력이 우수하고 수지의 물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이점을 내세워 가전, 전기제품 및 제조공정의 정전기 대책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연구개발도 차세대 LiB용 전해질을 시작으로 에너지, 디바이스의 첨단영역에서 사업화 탐색을 가속화하고 있다.
DKS는 1990년대 프랑스 대학으로부터 제조·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이온액체를 사업화해 Elexcel AS 브랜드로 공급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음이온 구조인 LiFSI(Lithium Bis(fluorosulfonyl)imide) 음이온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대전방지제는 수지 표면에 석출해 대기 중 수분과 반응하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계면활성제에서는 습도 조절 문제, 무기필러에서는 투명성 저하, 첨가량이 많은 전도성 고분자에서는 수지 물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점도 및 융점이 낮고 도전성이 높은 Elexcel AS는 습도에 의존하지 않고 소량으로도 효과를 발휘하며 투명성과 수지 물성을 유지할 수 있어 첨가량을 줄임으로써 코스트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KS는 전기자동차(EV), 스마트폰 등에 투입되는 LiB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전해액용으로 이온액체를 사업화할 계획이었으나 배터리 구조설계, 난연제 등 다른 해결책이 있어 채용되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전방지제용 투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이온액체를 사용하고 있는 전기제품 분야에서는 LCD(Liquid Crystal Display)가 대형화되면서 정전기를 없애기 어려워지고 정전기 영향에 민감한 IC칩을 시작으로 정밀기기 채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DKS는 Elexcel AS의 특성을 활용해 기존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하이엔드(High-end) 전기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양이온 구조의 분자 제어를 시작으로 계면활성제 기술을 활용해 특성 발휘 여부를 좌우하는 수지의 상용성을 개선하는 등 커스터마이징에도 대응하고 있다.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고정용 및 재생에너지용 LiB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으며 용해 및 반응시킬 용매용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용매용은 DKS가 생산하고 있는 CNF(Cellulose Nano Fiber) 소수성 그레이드와의 조합을 기대하고 있다.
CNF 시장은 소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운스트림 분야의 새로운 선택지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9년 8월 5·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