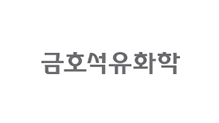플래스틱 용기는 경량성 및 가공성이 우수하고 위생 면에서도 뛰어나 식품유통에 빼놓을 수 없는 포장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선, 육류 등의 포장용기에 많이 채용되는 PSP(Polystyrene Paper), OPS(Oriented Polystyrene) 및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시트, PP(Polypropylene) 시트를 가공한 투명용기, 음료·액체 조미료용 PET병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및 독신가구 증가에 따라 채소 및 전자렌지용 식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육류, 생선 등 신선식품 매장에서 야채를 취급하는 점포가 늘어나는 등 식품매장의 야채 판매비중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인력부족 및 상품조달, 가공능력 확보 등 해결과제가 많아 시장의 니즈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및 슈퍼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명 식품용기 소재가 주목받으며 그동안 주류였던 OPS를 대신해 내열성이 뛰어난 PET 및 PP 시트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 FP는 저비중·고내열 특성을 활용해 전자렌지 가열·조리용으로 투명 PP용기 보급 확대를 적극화하고 있으며 해당용기를 사용한 야채, 어패류, 육류 등 신선재료의 식품용기를 차별화상품으로 슈퍼 및 편의점 등에 제안하고 있다.
Chuo Kagaku도 투명 PP를 사용한 식품용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용도의 PP 적용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PET 시트는 내열성 및 환경부하 저감 효과 등이 호평을 받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FP가 폐PET병 재활용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용기포장 재활용법 시행 이후 경량화·박막화를 중심으로 플래스틱 용기 사용량을 줄이는 활동이 이어져왔으나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따라 경량화 및 사용량 절감 활동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을 중심으로 폐PET병 및 식품용기 등을 원료로 사용한 재활용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해 샐러드 및 과일 등의 투명용기에 PLA(Polylactic Acid) 등이 채용되고 있는 바이오 플래스틱도 LCA(Life Cycle Assessment) 기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코스트 절감, 가공성, 내열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이 주목되며 포장용기의 기능·특성을 활용한 신규시장 창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FP는 식품기업 등과 협력해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용기를 주요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렌지를 사용할 수 있고 음식 맛을 극대화하도록 독자 개발한 식품용기를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Chuo Kagaku는 재가동한 Tohoku 공장을 통해 생산자 스스로가 상품개발을 실시하는 6차 산업용 식품 포장재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소재 기능 및 상품 기획력을 바탕으로 농산물·해산물 등의 상품화를 지원하며 소량다품종 생산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다.
플래스틱 용기는 안전·안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수한 기능·특성을 보유하고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소재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화학기업들은 식품산업과의 공조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일본 식품산업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시장이 축소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과감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가공식품 생산기업들은 기술을 집약시켜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가공제품 자체의 매력은 물론이고 판매처에서 시식, 메뉴제안 등의 판매촉진 활동을 실시해 고객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수입식품의 관세가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해외의존도가 높은 식품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나 농수산 시장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은 화학을 통해 고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보존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화학산업은 식품의 유통·수송 체제를 고도화하고 식품 제조공정을 청정화했을 뿐만 아니라 포장소재·포장기술·식품첨가제 등을 개발하며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식품은 잡균이 들어가거나 공기가 닿는 것만으로 성분이 산화돼 향기, 색, 맛 등이 변질·열화될 수 있으며 영양소가 파괴되고 유해한 산화물이 발생해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기업들은 식품의 품질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플래스틱 포장용기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PE(Polyethylene), PP, PS 등을 포함해 30종 이상의 수지를 식품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 폴리올레핀(Polyolefin) 위생협의회는 식품용 용구 및 용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등을 요약한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지별로 규격 등 위생관련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적합한 용기 및 원료 등에 인증서를 교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들은 주로 수지, 첨가제, 플래스틱 가공, 유통, 식품제조 등 관련기업으로 원료에서 생산제품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인증서를 활용해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
2011년 동북지방 대지진 당시에는 일본산 수지 및 첨가제 공급이 불안해지자 해외기업들이 인증서 취급에 나서기도 했으나 최근 인증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식품의 품질향상과 안전대처 등을 고민하며 위생·안전에 기헌하는 기준을 함께 작성하고 유지시키자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식품 포장용기는 국제적인 공통기준이 따로 없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출 기준규격 등을 통해 BPA(Bisphenol-A), 납, 안티몬 등 유해물질과 불순물에 대한 관리 기준 및 규격을 정해두고 있다.
특히, BPA에 대한 용출기준이 엄격한 편으로 EU와 동일한 0.6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폴리올레핀위생협의회의 인증서가 존재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앞으로 후생노동성과 연계를 심화시켜 인증서 제도를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국과 교류하는 등 외부와의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