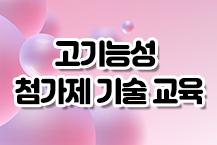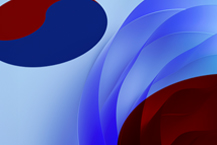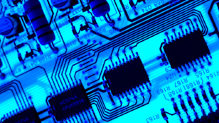|
한화케미칼, CA설비 25만톤 전환 검토 … 중국수출이 목적
한화케미칼이 가성칼륨(Potassium Hydroxide) 생산을 검토하고 있어 유니드의 독점구도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유니드(대표 김응남)는 국내 가성칼륨 생산능력이 22만톤으로 중국 UJC 20만톤, OJC 12만톤을 포함하면 총 54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 점유율도 1위로 나타나고 있다.
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은 CA(Chlor Alkali) 시장이 침체되자 여수공장 CA 설비의 원료를 염화칼륨(KCl)으로 변경해 가성칼륨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소 및 가성소다(Caustic Soda)가 수요정체 및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중국에서 반도체 세정제용 가성칼륨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드는 가성칼륨 수출이 2012년 12만7606톤에서 2013년 14만2355톤으로 증가한 후 2014년 13만8926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했으나 2015년 15만269톤으로 8.2% 증가했다.
유니드의 중국법인인 UJC와 OJC는 매출이 2013년 17억1978만위안, 2014년 16억3430만위안으로 파악되고 있다.
설비전환을 완료하면 한화케미칼은 가성칼륨 생산능력이 25만톤에 달해 유니드의 국내 생산능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가성칼륨 시장은 수요기업들이 소량을 현물형태로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수입제품을 저가에 대량 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니드가 독점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유니드는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독점기업의 입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 관계자는 “수요기업들이 중국산 채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니드가 중국에서도 공공연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수요처가 거래를 중단하고 중국산을 채용하면 유니드가 해당 중국기업을 찾아내 압박을 넣을 정도로 영향력을 과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성칼륨은 산업용 필수첨가제이기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손실이 막대하다”며 “유니드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내 일부 화공약품 공급기업들은 유니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서 가성칼륨을 저가에 대량 매입한 후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잉여물량을 마진 없이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산을 대량 매입하던 곳과 잉여물량을 저렴하게 구입해 사용하던 곳 모두 저가에 소량을 구입해 쓸 수 있어 공동구매 개념의 윈윈구조가 형성됐었다”며 “유니드도 처음에는 방관했으나 몇몇 거래처가 등을 돌리는 등 거래규모가 점점 커지자 본사에서 거래처마다 방문하면서 회유했다”고 밝혔다.
유니드의 횡포에 따라 가성칼륨 수입은 2011년 1만888톤으로 158% 급증했으나 2012년 5350톤으로 50.9% 급감했고 2013년 3600톤, 2014년 3908톤으로 저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수요기업들은 독점시장보다는 과점시장이 더 낫다는 이유로 한화케미칼의 가성칼륨 생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유니드는 매출액 기준 수출과 내수판매 비중이 대략 80대20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수가 5만톤 이하에 그치는 등 국내시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성칼륨은 공급이 수요보다 4배 이상 과잉임에도 유니드가 유일한 공급기업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 가격이 크게 연동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화케미칼이 가성칼륨을 생산한다면 내수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화케미칼의 가성칼륨 시장 진입이 「오판」이라며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한화케미칼의 가성칼륨 사업은 수요가 미미한 국내시장보다 반도체 세정용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에서도 증설 경쟁이 치열해 시황이 좋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가격은 하락이 불가피하고 중국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화케미칼이 CA 사업을 수직계열화하고 있고 생산능력도 커 가성칼륨 생산을 본격화하면 유니드보다 경쟁력이 우수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
<화학저널 2016년 2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