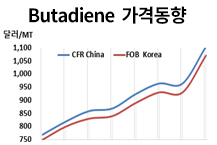DuPont과 도레이첨단소재가 아시아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사업에서 정반대 전략을 추진해 주목된다.
DuPont은 2000년부터 Teijin과 합작으로 DuPont Teijin Films을 설립하고 일본시장 공급을 확대해왔으나 2016년 8월 합작관계를 정리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합작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Tetoron」 브랜드는 Teijin이 가져갔고, DuPont은 「Mylar」, 「Melinex」 브랜드와 중국에서 생산해 가격경쟁력을 갖춘 「Hongji」를 확보했다.
Mylar 및 Melinex은 합작기업이 Tetoron과 함께 생산했으나 합작 정리 후 별도로 분리됨에 따라 신규용도 개척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유럽에만 있고 일본에서는 드문 용도를 개척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및 특수용도 개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Mylar가 오븐 가열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살려 조리용 실란트(Sealant) 필름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일본 조리용 필름 시장은 전자레인지 가열 대응제품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양념을 한 생고기를 필름으로 포장하고 오븐에서 조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빠른 조리가 가능하고 균일한 맛을 낼 수 있어 주로 외식체인점들이 Mylar를 채용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가정에서 빵을 오븐에 가열할 때 Mylar로 포장해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DuPont 본사가 응용제품들을 일본에 수출해왔으나 앞으로는 현지 진공포장 전문기업과 협업해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Melinex는 고내구 그레이드가 PC (Polycarbonate) 이상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PC카드를 제조할 때 필요한 전용설비들이 필요하지 않아 PVC(Polyvinyl Chloride), PVC/PET 카드를 제공할 때와 동일한 조건에서 라미네이트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시아 각국에서 신분증에 채용되고 있으며 일본시장에 대한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의료, 건축자재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의료용 시장에서는 수술 시 얼굴을 덮기 위해 사용하는 페이스 실드 용도로 공급을 타진하고 있으며, 건축자재 시장에서는 태풍, 테러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유리 비산방지용 윈도우 필름 등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도레이첨단소재가 Toray 그룹의 PET 필름 글로벌 공급거점으로 거듭남에 따라 DuPont과의 대결이 예상된다.
Toray는 글로벌 PET필름 최대 메이저로 6개 공장의 생산능력이 총 40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광학용, 컨덴서용, 포장소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액정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반사판용은 Toray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확산시트 및 프리즘시트용 베이스 필름 시장에서도 점유율 20% 상당을 확보하고 있다.
편광판 보호필름과 분리막용 난형필름 시장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사판용 역시 상업화 초기에는 차별성이 높아 독점했으나 최근 중국기업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며 범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거점을 도레이첨단소재로 집약시켜 코스트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그동안 국내 수요기업들에게만 주로 공급했으나 Toray 그룹 전체 생산량의 90%를 담당하도록 조정돼 글로벌 시장의 주요 공급처로 부상했다.
증설 및 이관 절차는 2018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본공장은 연구개발(R&D) 중심으로 변경하고 생산기능을 일부 남겨두어 고부가가치 반사판 생산에 특화시킬 방침이다.
Toray 관계자는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2000년대에는 규모화 전략이 통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시장이 성숙화돼 체질 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Toray는 일본공장을 중심으로 고기능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중국기업과의 격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스마트폰의 유리 커버 아래 부착하는 비산방지 필름에 주목하고 있다.
PET로 제조한 비산방지 필름은 투명성이 높고 화면이 번지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으며 수요처의 수율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토탈코스트 저감에 공헌하며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TV용은 재고 조정이 진행되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확대로 생산대수는 줄어들지만 액정화면의 대형화가 진전되며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