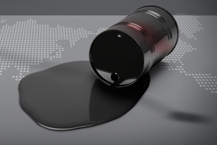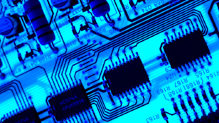인디아 석유화학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인구가 11억명을 넘어선 가운데 모디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액권 화폐를 폐지하는 등 경제를 개혁한 영향으로 자동차, 일상용품, 포장소재용 부품·소재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디아 화학·석유화학제조자협회(CPMA)에 따르면, 인디아는 석유화학 생산능력이 2018년 말 에틸렌(Ethylene) 740만톤, 프로필렌(Propylene) 520만톤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활용, 에틸렌계를 포함한 2차·3차 유도제품 생산 확대 등 특색 있는 투자를 강화함과 동시에 석유정제·석유화학 통합 컴플렉스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수요가 투자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 공급부족이 확대되고 있으며 여전히 대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인디아 정부는 2018년 가을 화학제품 가운데 처음으로 가성소다(Caustic Soda) 수입제품에 인디아 공업제품 표준규격인 BIS(Bureau of Indian Standard)를 적용하는 규제에 나섬으로써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가성소다는 2019년 4월 이후 수입을 재개토록 조치했으나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디아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산업 육성과 내수 확대 사이에서 균형잡힌 대응이 어려워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스프, C3 유도제품 투자 적극화
인디아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화학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글로벌 화학 메이저 바스프(BASF)는 2019년 1월 인디아 구자라트(Gujarat)에 PDH(Propane Dehydrogenation)를 중심으로 한 아크릴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인디아 아다니그룹(Adani Group)과 합작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약 20억유로를 투입할 방침이다.
말레이지아에서 페트로나스(Petronas)와 공동 운영하고 있는 C3 체인과 유사한 구조로 프로필렌(Propylene)을 중심으로 부탄올(Butanol), 2-EH(Ethylhexanol) 등 옥소알코올(Oxo-Alcohol), 아크릴산(Acrylic Acid), 부틸아크릴레이트(Butyl Acrylate) 등 에스테르(Ester)류를 생산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등 탄소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구자라트는 일조량이 많고 평탄하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태양광 및 풍력발전에 적합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아다니그룹은 인디아 전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구자라트에서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412MWh에 달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합작도 검토하고 있다.
바스프는 아다니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인디아 최대의 상업항구 문드라(Mundra) 항구에 아크릴 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드라 항구는 연평균 취급물량이 1억톤을 넘고 있으며 아다니그룹의 경제특구도 있어 원료 조달, 수출 접근성은 물론 전력 등 각종 유틸리티를 조달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아다니그룹은 오래전부터 화학 분야 진출을 추진했으며 타이완의 Chinese Petroleum(CPC) 등과 함께 기회를 모색한 바 있다.
바스프는 2025년 무렵까지 미국 및 중국이 에틸렌 유도제품 생산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강점인 프로필렌계 유도제품으로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바스프와 아다니그룹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인디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C3 유도제품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프로필렌·벤젠 유도제품 사업화도…
인디아 국영 정유기업 Bharat Petroleum(BPCL)은 2019년 말부터 남부 케랄라(Kerala)의 고치(Kochi) 소재 정유공장에서 아크릴산 및 아크릴산에스테르(Ester Acrylate), 옥소알코올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유공장은 유동접촉분해(FCC) 2기를 가동하고 있어 프로필렌부터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우레탄(Urethane) 원료인 폴리올(Polyol) 25만톤, 각종 용매에 사용되는 PG(Propylene Glycol) 10만톤, 합섬원료인 MEG(Monoethyene Glycol) 14만톤 플랜트도 2021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하기로 결정하는 등 유도제품 다양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디아 화학기업 Deepak Nitrile은 2018년 말 자회사를 통해 다히지(Dahej) 소재 페놀(Phenol) 20만톤 플랜트를 가동했으며 2019년 2월 가동률을 80%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디아 최초의 대규모 상업설비로 원료 큐멘(Cumene)부터 수직계열화하고 있으며 큐멘의 원료인 프로필렌과 벤젠(Benzene)을 수입하거나 생산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자체 항만설비를 건설하고 있다.
Deepak Nitrite에 따르면, 인디아는 페놀 수요가 약 36만톤으로 페놀수지(Phenolic Resin)용을 중심으로 호조를 계속하고 있다.
석유정제·석유화학 통합작업 박차
글로벌 정유기업들은 2030년부터 휘발유(Gasoline)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학제품 원료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케미칼 리파이너리(Chemical Refinery)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개질장치 등을 증설함으로써 화학제품 생산비율을 높이거나 대규모 화학 컴플렉스를 통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디아에서도 국영 가스공사(ONGC) 계열인 Hindustan Petroleum(HPCL)이 2018년 가을 파키스탄에 인접한 라자스탄(Rajasthan)에 석유정제·석유화학 컴플렉스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에틸렌 90만톤의 NCC(Naphtha Cracking Center)와 함께 FCC를 비롯해 PE(Polyethylene) 80만톤, PP(Polypropylene) 100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라자스탄에는 소규모 유전이 있어 중동산 원유와 조합해 원료로 투입할 방침이다.
아람코, 정유·석유화학 합작투자 추진
인디아 석유·석유화학 시장은 현지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해외기업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화학 시장에서 급속도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아람코(Saudi Aramco)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실상 사우디의 최고 권력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9년 2월 말 인디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수상과 회담을 열고 “총 10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프라·에너지 관련투자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람코는 2018년 4월 Indian Oil(IOC) 등 인디아 국영 3사가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석유정제·석유화학 컴플렉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영 3사가 440억달러를 투입해 마하라슈트라의 래니지리(Ratnagiri)에 일일 원유 처리능력 120만배럴의 정유공장, 생산능력 1800만톤의 석유화학 컴플렉스를 신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부지면적은 세계 최대 수준인 6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는 모디 수상이 이끄는 인민당(BJP)이 정권을 잡고 있어 중앙정부에게도 중요한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다.
2월 빈 살만 왕세자와 동행한 아람코 관계자는 국영 석유기업 뿐만 아니라 인디아 최대의 화학기업 릴라이언스(Reliance Industries) 간부와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릴라이언스는 2017년 말 ECC(Ethane Cracking Center)를 중심으로 아로마틱(Aromatics), 합섬원료 EG(Ethylene Glycol), 폴리올레핀(Polyolefin) 등을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컴플렉스 잠나가르(Jamnagar) 3을 완공했다.
차기 프로젝트인 잠나가르4도 추진하고 있으며 아람코는 공동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마하라슈트라 프로젝트는 실현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토지수용이 난항을 겪고 있어 시작한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국영 석유기업 통합도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러시아, 석유정제 시장 진출
미국 엑손모빌(ExxonMobil)도 인디아에서 정유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BPCL이 중부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에서 가동하고 있는 정유공장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원유 처리능력을 일일 약 16만배럴로 확대한 가운데 추가로 2배 늘리거나 에틸렌 100만톤 크래커가 포함된 석유화학 컴플렉스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기업 로스네프트(Rosneft)도 2017년 인디아 에사르그룹(Essar Group)으로부터 바디나르(Vadinar) 정유공장을 인수했다.
원유 처리능력은 일일 40만배럴로 인디아에서 2번째로 크며 항만시설, 발전소를 포함한 관련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다. 인수액은 130억달러로 외국인투자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스네프트는 2022년 가동을 목표로 바디나르 정유공장에 PP 45만톤 플랜트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
러시아기업이 아시아에서 가동하는 최초의 정유공장으로 앞으로 화학제품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레오케미칼 생산도 활성화
인디아는 자국산 카놀라유 및 피마자유 또는 팜유 수입제품을 원료로 올레오케미칼(Oleochemical)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현지 재벌계열 고드레지(Godrej Industries), 세계 각지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VVF, 글로벌 최대의 팜유 메이저 윌마(Wilmar)와 아다니그룹의 합작기업 아다니윌마 등이 각종 지방산(Fatty Acid), 지방족 알코올(Aliphatic Alcohol), 글리세린(Glycerin) 등을 생산하며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아시아 및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피마자유 메이저 Jayant Agro-Organics (JAO)는 세바스산(Sebacic Acid) 등 유도제품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인디아산 유지화학제품은 최근 최대 생산지인 중국공장 가동률 하락의 영향으로 일본 및 동아시아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일상용품 뿐만 아니라 윤활유, 화장품, 수지첨가제 등 공업용 원료 조달처로도 주목받고 있다.
고드레지는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에서 카놀라유, 팜유를 원료로 유지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구자라트 공장에서는 지방족 알코올 10만5000톤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마하라슈트라 공장에는 계면활성제, 지방산, 정제글리세린 등 6만톤 이상의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사용전력의 40% 이상을 조달하는 등 환경부하 저감 투자도 거듭하고 있다.
JAO는 프랑스 화학기업 아케마(Arkema)와 합작으로 생산하는 피마자유를 원료로 세바스산, 스테아르산(Stearic Acid) 등 유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 미쓰이케미칼(Mitsui Chemicals)과 SKC가 합작한 MCNS(Mitsui Chemicals & SKC) Polyurethane을 비롯해 이토추상사(Itochu)와는 바이오 폴리올(Polyol) 합작공장을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