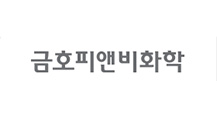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서 한발 물러섬으로써 3가지 화학소재 수출규제로 비롯된 일본과 한국의 마찰에서 한시름 놓게 됐으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일본이 8월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하면서도 당장은 대상품목을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경제보복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강제징용 배상판결, 위안부 문제 등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쌓여 있다는 점에서 마찰이 언제 본격화할지 짐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은 아마도 국제적 비난 여론을 잠재우면서도 한국 경제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숨기려 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한국을 압박하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용해 한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 확실하다.
화학소재를 비롯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1200가지에 달하는 소재·부품·장치 개발과 차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전용 우려를 이유로 제기하고 있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며 귀걸이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으면 된통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화학소재를 중심으로 1200가지 규제 대상품목의 국산화가 가능하다면 일본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막대할 것이고, 아베 수상의 강공전략을 실패로 몰고 갈 수 있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끌어올려 산업강국으로 재부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개발 현실을 고려하면 녹녹치 않아 종합적인 대책과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고, 화학소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개발해 대기업 수요처들과 협업해야 국산화가 가능하나 현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크고, 주 52시간 근로 규정에 묶여 연구개발을 진척시키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자세가 돼 있다면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중소 화학기업 CEO들은 대부분 막내 사원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주 52시간 규정에 묶여 연구원이나 개발직원들이 실험을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6시만 되면 퇴근해버려 CEO가 실험 결과를 체크하고 마무리한 후 퇴근해야 하는 실정이다.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의 중소 화학기업들은 화학소재를 개발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기도 버거워 축소 경영에 나서고 있고 일부는 문을 닫는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을 정도이다. 매출 2000억-3000억원대 중견 화학기업들도 엇비슷해 일본이 생산하는 특수 화학소재 개발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이 직접 화학소재를 개발할 수도 없다. 중소·중견 화학기업이 개발해 수요처들과 테스트하고 기능을 향상시켜야 하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이 1년 후, 5년 후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그치는 이유이다.
화학소재는 100% 국산화할 수도 없고 그러할 필요도 없으며 고기능성 특수 화학소재는 개발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