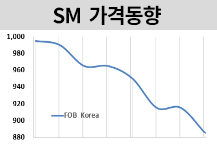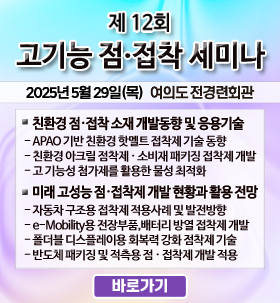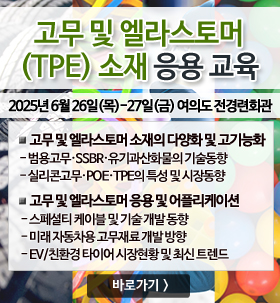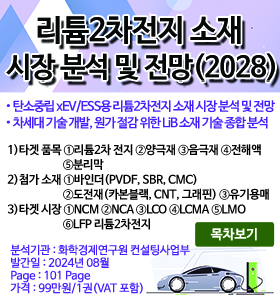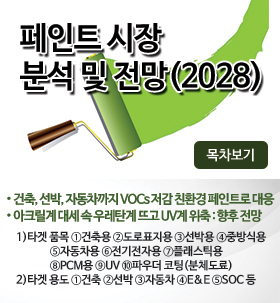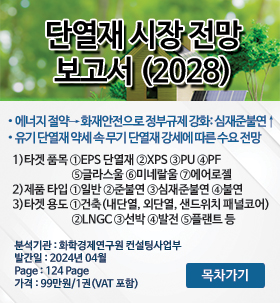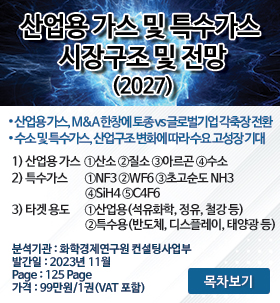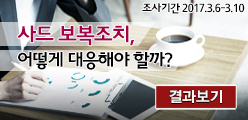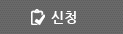|

PI첨단소재 인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합작투자에 나설 때까지 PI(폴리이미드)가 무엇인지도 몰랐으나 반도체 소재로 끝나지 않고 배터리용 수요까지 증가함으로써 몸값이 3조원을 웃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KCC 등이 군침을 삼킬 정도이면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시들해졌으나 석유화학기업들이 EP(엔지니어링 플래스틱) 사업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도 비슷할 것이다. PE, PP, PVC, PS가 톤당 1000-1300달러 수준에 거래되는 반면 ABS, PA, PBT, PPS가 2000달러를 훌쩍 넘긴다는 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원료 코스트를 고려해도 수익성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이다.
특히, 특수 EP로 분류되는 PI, LCP 등은 3000-4000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어 범용수지나 범용 EP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료 코스트가 아니라 기술력이 시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고 EP를 뛰어넘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화학기업들이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눈여겨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 미쓰이물산 전략연구소는 2022년 주목해야 할 기술로 6G, 분자기계(Molecular Machines), 자가성장 로봇, 케미칼 루핑(Chemical Looping), 식물센서를 선정했다. 2021년에도 프라임 편집(3세대 유전자 편집기술), 초정밀 시계, 차세대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Lithography), 침습형 BMI(뇌에 센서와 반도체 칩을 이식해 뇌와 기계를 연결)를 선정한 바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6G는 5G(5세대 이동통신)의 뒤를 잇는 무선통신 기술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도권 경쟁이 한창이며, 사물인터넷(IoT)이 지능형으로 발전하면서 6G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글로벌 특허 출원은 중국 57%, 미국 18%, 한국 8%, 일본 7%, 스웨덴 2%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분자기계는 회전, 직선운동 움직임을 극미세 수준에서 구현·제어할 수 있는 나노 분자 집합체로 의료·헬스케어, 화학, 로봇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2021년 특허 출원은 중국 59%, 미국 17%, 일본 6%, 독일 2%, 한국 2%로 역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자가성장 로봇은 프로그램·학습 없이도 자율적으로 판단해 행동할 수 있는 로봇으로 동식물 대상의 과학실험, 재해 등 복잡한 환경에서 활용이 기대된다. 중국이 글로벌 특허의 80%를 출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9%, 한국 5%, 일본 3%, 독일 3%로 뒤쫓고 있다.
케미칼 루핑은 별도 분리설비 없이 이산화탄소를 98% 이상 원천 분리배출하고 질소산화물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며, 배출가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회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발전, 수소의 탈탄소화 지원이 기대된다. 특허 출원은 중국 37%, 미국 21%, 일본 7%, 프랑스 6%, 한국 5%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식물센서는 AI(인공지능) 기술, 유전자 공학 등을 베이스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식물의 반응을 감지해 정보로 검출하는 기술이며 생물체인 식물의 특징을 센서로 활용함으로써 농작물 재배환경 제어 등 농업·환경·에너지 분야 활용이 기대된다. 특허 출원은 중국 45%, 미국 16%, 한국 7%, 일본 5%, 독일 4% 등이다.
화학기업들은 6G, 로봇까지는 몰라도 활용성이 큰 케미칼 루핑을 비롯해 식물센서, 분자기계 기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케미칼 루핑은 화학기업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화학저널 2022년 6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