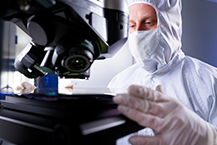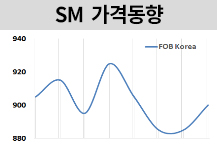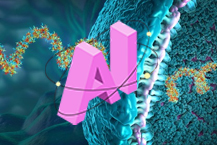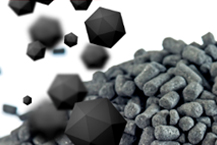|
중국정부 강제 감산조치 해소 영향 … 탄산리튬, 10달러 턱걸이
탄산바륨(Barium Carbonate)은 주요 생산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수급이 완화되고 있다.
탄산바륨은 주요 생산국인 중국이 정부 차원의 환경규제를 실시하면서 2017년부터 수급타이트가 이어졌으나 최근에는 환경규제에 따른 강제 감산조치가 해제되면서 수급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운스트림인 염화바륨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허베이(Hebei) 주변 지역에 대해 공장 배치 규제를 실시하며 일부 메이저들의 공장 이전 및 철수가 이어지면서 업스트림과 무관하게 여전히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산바륨은 2017년 초 중국 정부가 화학공장에 대한 감찰 및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기업 10사가 가동을 중단하고 이후 가을 들어 가동을 허가받은 메이저 3사만이 재가동함에 따라 기존 생산량 60만톤 가운데 20만-30만톤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가동 허가를 받은 메이저들도 친환경 설비 도입 등으로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어 수급타이트가 본격화됐으며 공급기업이 부르는 대로 가격이 형성되는 이례적인 사태도 이어졌다.
2018년에는 춘절 연휴가 끝난 후 중국 정부가 일부 공장의 재가동을 허가했으나 메이저는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불시단속이 계속되면서 감산체제를 끝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계속 타이트한 상태를 나타냈고 가격 역시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메이저를 중심으로 가동제한 조치가 한층 더 완화되면서 수급타이트가 해소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규제 기준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화학공장에 대한 가동제한 규제를 강행하던 중국 정부가 경제활동을 우선시하는 기조로 변화되며 환경기준을 달성한 곳을 중심으로 가동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급을 불안시하는 분위기가 해소되고 공급기업이 부르는 대로 가격이 형성되던 거래 풍조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염화바륨은 아직도 수급타이트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중국 공급기업이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MLCC용 수요가 2018년에 이어 2019년 초에도 호조를 나타내며 수급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화학공장 폐수와 관련된 단속이 강화되면서 염화바륨 등 염산을 대량 사용하는 공장들은 신규진출 및 생산능력 확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허베이를 중심으로 계속 시행되고 있는 화학공장 배치 규제도 염화바륨 수급타이트에 일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허베이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화학공장을 배제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염화바륨 생산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전당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한 곳은 아예 사업에서 철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산리튬(Lithium Carbonate)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이 전기자동차(EV) 배터리 관련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환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LiB(리튬이온전지)용 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산 광석으로 생산한 탄산리튬 공급이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최근에는 kg당 10달러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탄산리튬은 2014년부터 LiB를 탑재한 EV를 보급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온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격한 신장세를 나타냈다.
북미, 중남미의 3대 메이저가 공급을 장악한 가운데 중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16년 봄에는 중국 현물가격이 kg당 30달러로 5-6배 폭등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줄이면서 LiB 생산이 침체됐고, 2018년에는 보조금 지원 축소가 더욱 본격화된 가운데 화학공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로 양극재 생산기업들마저 강제로 감산하게 돼 수익성이 대폭 악화되고 있다.
2019년 초까지도 수요 신장 둔화가 이어지며 수익성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산 광석을 원료로 리튬을 대량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돼 탄산리튬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중국 현물가격이 1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함으로써 LiB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탄산리튬은 리튬 관련 신증설 프로젝트가 다수 예정돼 있어 탄산리튬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중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EV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하락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9년 3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