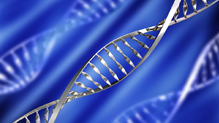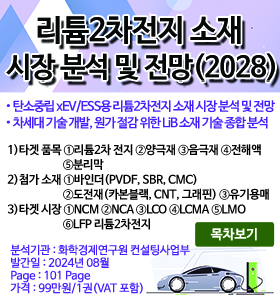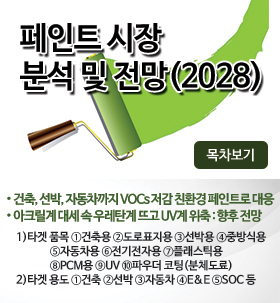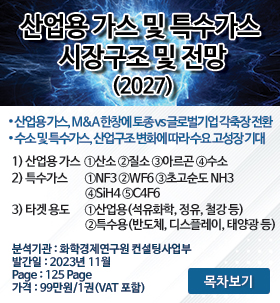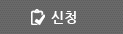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화학산업의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고 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월8일 열린 석유화학 신년인사회에서 2019년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중요성을 느낀 한해로 석유화학기업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화학산업이 미국-중국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 둔화와 글로벌 공급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민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고 자립화 등 성공사례가 석유화학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0대 핵심품목과 특화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예산을 2조1000억원으로 2.5배 확대하고 별도 세액공제를 신설해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함은 물론 환경·노동규제 개선을 통해 고부가제품 개발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수출규제를 통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고립화를 추진할 때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국내 화학산업이 범용제품 생산에 치중함으로써 일본산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고부가가치화·차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할 때도 반도체나 화학기업들이 할 일이지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했고, 4차 산업혁명을 타고 자동차·반도체·전자·전지 산업이 급격히 진보하고 있을 때도 수출만 강조했지 화학소재나 부품 국산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방도 내놓지 못했다. 대책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시대적 유물인 수출에 매달릴 동안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화학소재·부품의 고도화를 강화함으로써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을 장악했고, 미국·유럽도 일본산 화학소재를 수입할 정도로 성장했다.
중국이 일본과 다오위다오 섬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일 당시에도 자동차를 비롯해 일본산 불매운동을 벌여 상당한 타격을 입혔지만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다. 일본산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첨단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중국의 기술수준이 일정수준 올라갈 때까지는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의 종속관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전자·전지는 일본을 넘어섰다고 하나 세계 1위를 달리기 위해서는 일본산 화학소재·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한국이 세계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속은 일본이 챙기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까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중앙정부 관료들은 재벌 친화적이어서 자동차·반도체·전자산업 육성에는 관심이 크지만 화학소재·부품 국산화에는 관심이 없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해도 대기업 편을 들어 중소기업들이 분노에 치를 떤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한다.
석유화학산업도 마찬가지로, 화학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돈 자랑이 대단하지만 석유화학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고 범용제품 중심의 생산체제로는 효율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대기업 친화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석유화학 불황이 2019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2-2023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유도하기는커녕 에틸렌 신증설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 불황으로 이어졌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의 자립화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미국의 셰일혁명 바람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범용제품 신증설을 통한 규모화를 추진한 배경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뻔뻔스럽게 기술개발을 거론하며 대기업들을 유혹할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 불황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화학저널 2020년 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