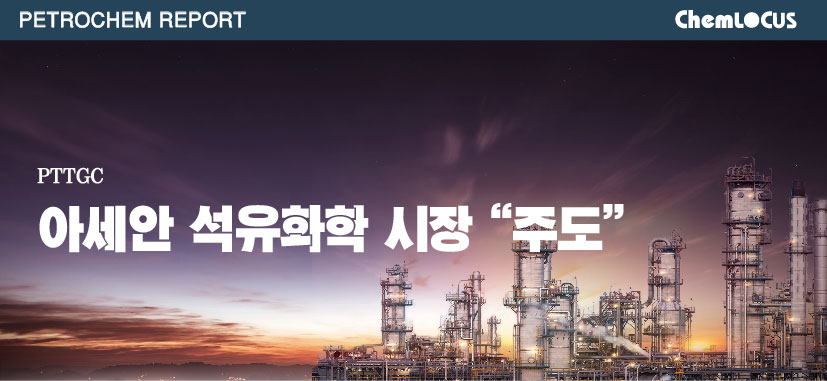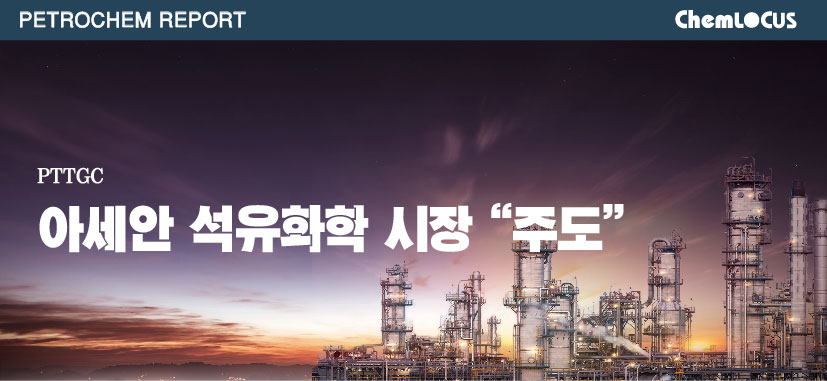
타이 PTT Global Chemical(PTTGC)이 급부상하고 있다.
PTTGC는 업스트림에 치중했던 석유화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도제품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어 동남아 시장 영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서비스에 나섬으로써 동남아 화학 메이저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PET 증설로 폴리에스터 체인 수직계열화
PTTGC는 타이에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생산능력을 2021년 상반기까지 약 30% 확대하고 PP(Polypropylene) 역시 2022년 하반기 상업가동을 목표로 25만톤 라인을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에는 PO(Propylene Oxide), 폴리올(Polyol) 플랜트도 신규 가동할 예정이다.
PO 20만톤 플랜트와 PO를 원료로 사용하는 폴리올 플랜트 공사 진척률은 85%로 2020년 3분기 상업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TTGC는 기존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 증설과 함께 신규 유도제품 확충을 통해 다운스트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PET는 Thai PET Resin(TPRC)을 통해 라용(Rayong)의 MTP(Map Ta Phut) 공장을 디보틀넥킹함으로써 생산능력을 15만톤에서 2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PET병 용도를 중심으로 시장이 꾸준한 성장하고 있어 생산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PTTGC는 미쓰이케미칼(Mitsui Chemicals) 및 SCG Chemicals과 합작한 TPRC,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판매기업에 대한 SCG Chemicals 지분 전량과 미쓰이케미칼 지분 일부를 2018년 12월 취득함으로써 원료 P-X(Para-Xylene), MEG(Monoethylene Glycol)를 시작으로 폴리에스터(Polyester) 체인의 일관생산체제를 확립했다.
PTA를 생산하고 있는 GC-M PTA는 2개 생산라인 총 97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기존 외부판매량을 TPRC 증설라인 공급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체 투입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PP, 106만톤으로 25만톤 증설해 동남아 선점
PP는 라이온델바젤(LyondellBasell) 등과 합작한 HMC Polymers Rayong을 통해 MTP 공장에서 3개 생산라인 총 81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자동차, 인프라 분야에서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25만톤을 추가할 계획이다.
동남아에서는 PP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설비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이데미츠코산(Idemitsu Kosan) 등이 출자한 응이손(Nghi Son) 정유공장이 2018년 11월 PP 37만톤 플랜트를 완공했고, 효성화학도 바리아붕따우(Baria-Vung tau)에서 30만톤을 상업 생산하고 있다.
말레이지아에서는 국영 페트로나스(Petronas)가 주도하는 대규모 석유정제‧석유화학 컴플렉스 프로젝트 RAPID가 가동을 시작했다.
PTTGC는 PP 시장점유율 1위인 라이온델바젤과 파트너라는 점을 활용해 우수한 기술을 앞세움으로써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해 경쟁에 대응할 계획이다.
PTTGC는 최근 성장전략 가운데 하나로 석유정제-석유화학 통합을 중시하고 있으며 스페셜티 케미칼 분야를 중심으로 다운스트림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도 산요케미칼(Sanyo Chemical), 도요타통상(Toyota Tsusho)과 폴리올을, 쿠라레(Kuraray) 및 스미토모(Sumitomo)상사와는 PA(Polyamide) 9T 등 EP(엔지니어링 플래스틱)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림산업과의 ECC 150만톤 합작투자는 “격렬”
PTTGC는 석유화학의 핵심설비인 NCC(Naphtha Cracking Center)도 건설하고 있다.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 50만톤에 프로필렌(Propylene) 26만1000톤 크래커를 건설하고 있으며 2020년 말 상업 가동할 계획이다.
PTTGC는 2019-2020년 성장전략으로 미국 오하이오 석유화학 프로젝트 구체화,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노력,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포함한 비즈니스 변혁 등 3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하이오 프로젝트는 셰일가스(Shale Gas)를 원료로 사용하는 에틸렌 생산능력 150만톤의 ECC(Ethane Cracking Center)와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150만톤, LLDPE(Linear Low-Density PE) 15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대림산업과 합작으로 투자했으며 투자액이 방대함에 따라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설계부터 건설, 시험가동, 보증 책임까지 대림산업이 풀 턴키로 일괄 수주해 EPC(설계‧조달‧건설)를 진행해왔다. 2019년에는 프리마케팅을 시작했으며 생산량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판매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대림산업은 ECC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철수하기로 결정했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PTTGC도 수익이 악화됨으로써 최종투자결정(FID) 시기가 2020년 중반에서 2021년 하반기로 늦추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PTTGC가 오하이오 프로젝트를 핵심 투자로 설정하고 있어 백지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PTTGC는 오아이오 ECC 건설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CVC(Cooperate Venture Capital)를 설립해 신기술 확보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해서는 기능제품을 확충하고 범용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출 계획이며 유도제품 상업화 프로젝트도 여러건 검토하고 있다.
기술지원 강화 통해 생산 중심에서 용도 개척으로 차별화
PTTGC는 동남아 기술서비스센터도 확충해 동남아 메이저 지위를 강화한다.
동남아에서 중간 소득층이 증가하면서 합성수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경쟁 심화가 우려되고 있어 단순한 판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시장별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동남아 각국에 판매기업을 설립하며 사업을 확대해왔으나 앞으로는 기술 지원과 용도 개발 기능을 활용해 차별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PTTGC는 타이와 잠재적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기대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중요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8년 미얀마와 베트남에, 2020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에 합성수지 판매기업을 설립했으며 보관, 물류기능 등 판매량 확대를 위한 기반을 정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말레이지아 국영 페트로나스(Petronas Chemical)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석유정제‧석유화학 컴플렉스 건설 프로젝트 RAPID가 상업가동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Siam Cement Group(SCG)이 대규모 석유화학 컴플렉스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PE는 북미산을 비롯한 역외물량 유입이 가속화되는 등 경쟁이 심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 차별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판매 외에 신제품 개발과 용도 개척 등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리사이클 강화에 외부환경 영향 최소화 노력
PTTGC는 Map Ta Phut(MTP) Integration 프로젝트를 통해 코스트 경감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산과 판매, 물류까지 모든 영역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과 배출 원단위를 KPI(중요업적 평가지표) 중 하나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사적으로 환경 부하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용역을 최적화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PET와 HDPE는 리사이클 공장을 건설해 2020년 상업 가동할 예정이며 바이오 플래스틱 생산도 검토하고 있다.
1회용 플래스틱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활동은 정부나 관련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해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비즈니스 변혁을 위해서는 판매 분야에서 타깃으로 설정한 주변국과 타이의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 밀착형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PTTGC가 사업전략을 바꾼 것은 외부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사업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9년 미국-중국 무역마찰 영향을 받아 수익성이 대폭 악화된 가운데 2020년 1월 양국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타이 국내의 공업용수 문제도 심각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타이는 공업용수가 당장 고갈될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저수량이 심각한 공업용수 부족 사태를 겪었던 200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유화학 플랜트가 밀집된 라용의 저수용량이 크게 줄어들어 PTTGC를 비롯한 화학기업들이 공업용수 사용량을 10% 줄이는 등 선제적으로 감산에 나선 바 있다.
또 폐수를 재이용하거나 해수담수화 설비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