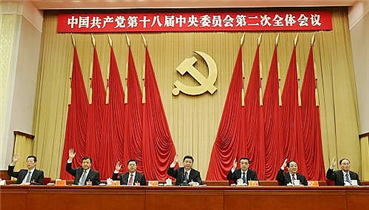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다.
2011년 3월11일 강진에 이어 밀어닥친 쓰나미로 일본 동북지방이 쑥대밭으로 망가지고 엄청난 인명 피해를 동반한 것도 모자라 원전까지 폭발하는 대참사를 겪었다. TV 화면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장면이 비춰질 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오염수 처리도 문제이지만 남은 핵연료와 녹아버린 핵연료를 처리하는 폐로 작업이 더 큰 문제로 지금까지 120조원을 투입한 것으로도 모자라 앞으로 840조원을 더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장 손을 쓸 수도 없으니 두고두고 골칫거리로 남을 것이 뻔하다.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의 후유증을 치유함은 물론 경제를 살리겠다고 유치한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개최하지 못했고 2021년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으나 해외관광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열 수밖에 없어 경제 살라기가 아니라 빚더미 올림픽으로 끝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이 좌절감, 열패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아시아를 호령하던 강대국 이미지는 온데간데없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한국-일본 관계를 고려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동정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본을 단순히 좌절하는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일본 자동차, 화학산업은 더욱 그러하다.
자동차는 동일본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장악력이 여전하고, 최근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중국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나 단숨에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수 없다는 계산 아래 하이브리드자동차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윈윈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화학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정유‧석유화학 중심의 범용 화학제품은 생산능력을 감축하고 일부는 설비를 동남아‧중국으로 이전한 끝에 에틸렌 생산능력이 800만톤 수준에서 600만톤대 초반으로 줄어들어 세계 7위로 떨어졌지만 스페셜티 케미칼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전자‧반도체는 경쟁력을 상실해 한국, 중국에 밀리고 있으나 전자소재, 반도체용 화학제품은 특수화‧차별화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고, 배터리도 한국‧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배터리용 화학소재는 일본의 점유율이 결코 밀리지 않고 있다. 자동차용 화학소재 역시 개발능력이 뛰어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껍데기는 한국과 중국이 장악하고 실속은 일본이 챙기고 있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전자‧반도체용 수출을 규제하는 우를 범하기는 했으나…
환경‧안전 면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해양 플래스틱 문제, 폐플래스틱 재활용‧리사이클은 주변 국가들이 따라가기 벅찬 상대로 평가되고 있다. ESG 경영도 앞서가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이어 다시 패망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으나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일본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한국이 일본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일본을 넘어설 능력과 자질은 있는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