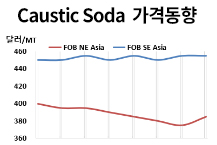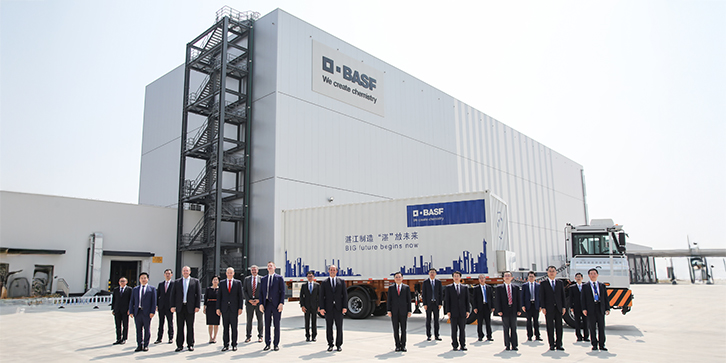배터리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성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리튬이온전지의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코스트·안전성이 향상된 나트륨이온전지,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과도기적으로 반고체전지도 떠오르고 있다.
KPMG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QuantumScape가 리튬 금속을 음극재로 사용하는 전고체전지를, Solid Power는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에너지밀도가 2배 높은 전고체전지를 개발하는 등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CATL이 전고체전지와 나트륨이온전지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도 리튬이온전지의 성능을 개선함은 물론 전고체전지를 중심으로 차세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기업들이 전고체전지를 중심으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화학기업들은 차세대 배터리용 소재 개발이 한창이다.
특히, 일본 자동차기업들은 2020년대 후반 전고체전지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는 등 실험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쟁기업들보다 한발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기업들은 배터리 소재 기술 혁신에서도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3사와 CATL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는 리튬·코발트를 중심으로 희소금속을 다량 투입함으로써 제조비용이 높고 전기자동차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리튬 확보 경쟁이 격화되며 코스트가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2년 5월 전기자동차용 원자재 코스트가 2021년 초에 비해 리튬은 7배 이상, 코발트는 2배 이상, 니켈은 2배 폭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글로벌 희소금속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튬 광산을 다수 보유함에 따라 한국·미국·EU·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해소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희소금속을 무기화한 전례가 있고 앞으로 무기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리튬이온전지는 전해질 용액에 유기용제를 사용하면서 발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리튬이온전지는 저출력으로 설계된 한계 때문에 전극이 전해액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고출력으로 사용하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발화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배터리 용량도 문제이다. 휘발유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항속거리가 일반적으로 1000km를 넘나드나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는 200-500km에 불과하다. 성능을 우선시해 고출력 배터리를 사용하면 고열 발생과 용제 연소를 막기 위한 냉각장치 설치 등으로 전체 코스트가 상승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중국의 대결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희소금속에 이어 생산 다원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배터리 개발·생산 주도권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우대책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2022년 8월 제정하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 사업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리튬이온전지는 태생부터 높은 원자재 코스트, 성능·안전성 양립, 용량(주행거리) 문제가 대두됐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코스트가 낮은 LFP로 전환된 후 나트륨이온전지, 전고체전지로 이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리튬이온전지의 코스트, 안전성, 성능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물론 나트륨이온전지, 전고체전지를 개발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리튬을 중심으로 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도 문제이고, 미국-중국 사이에서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