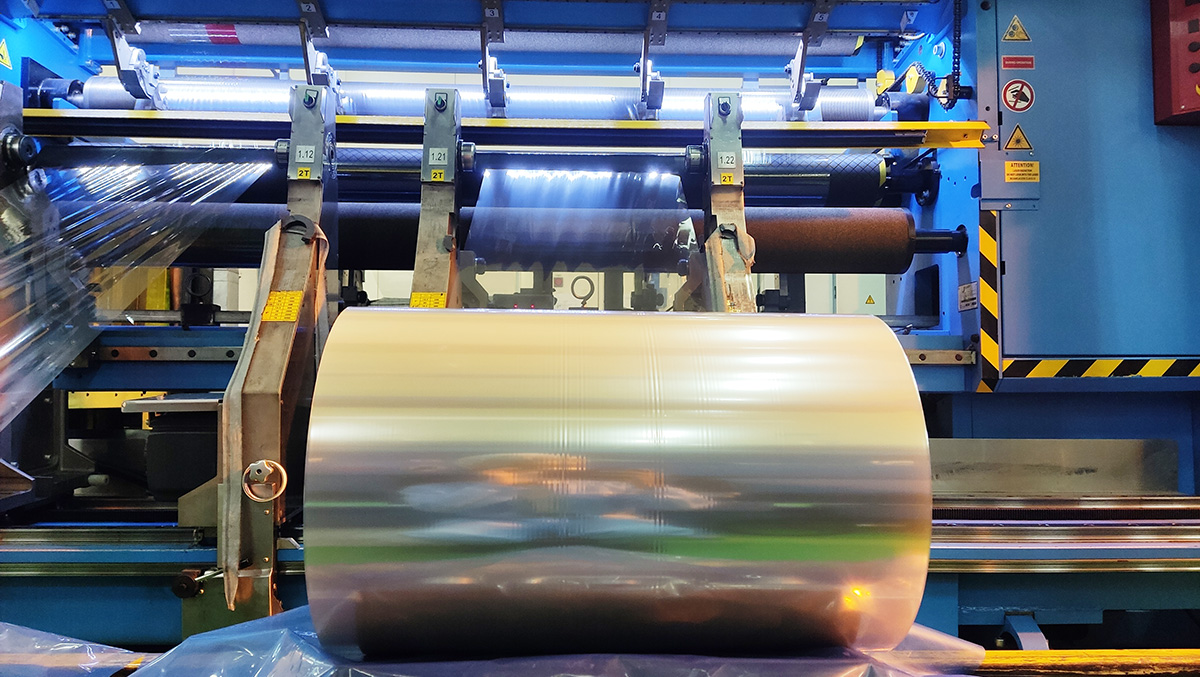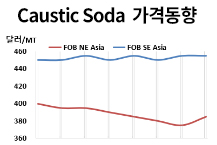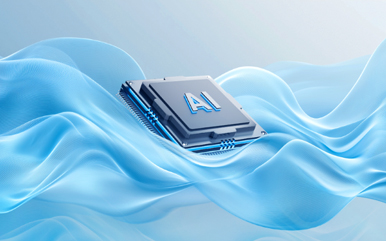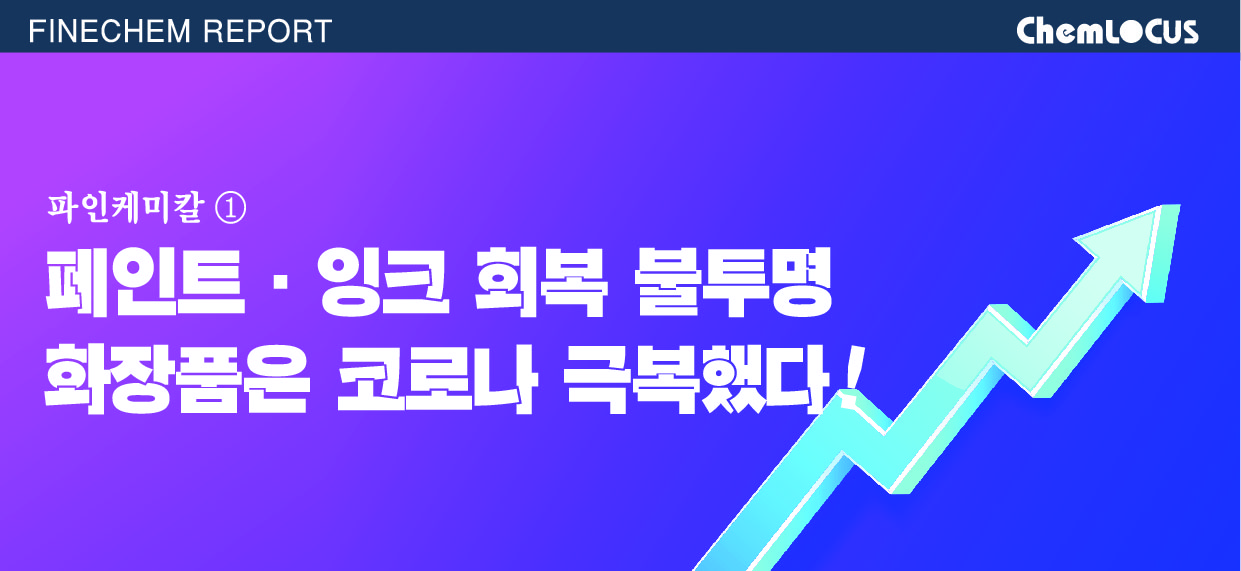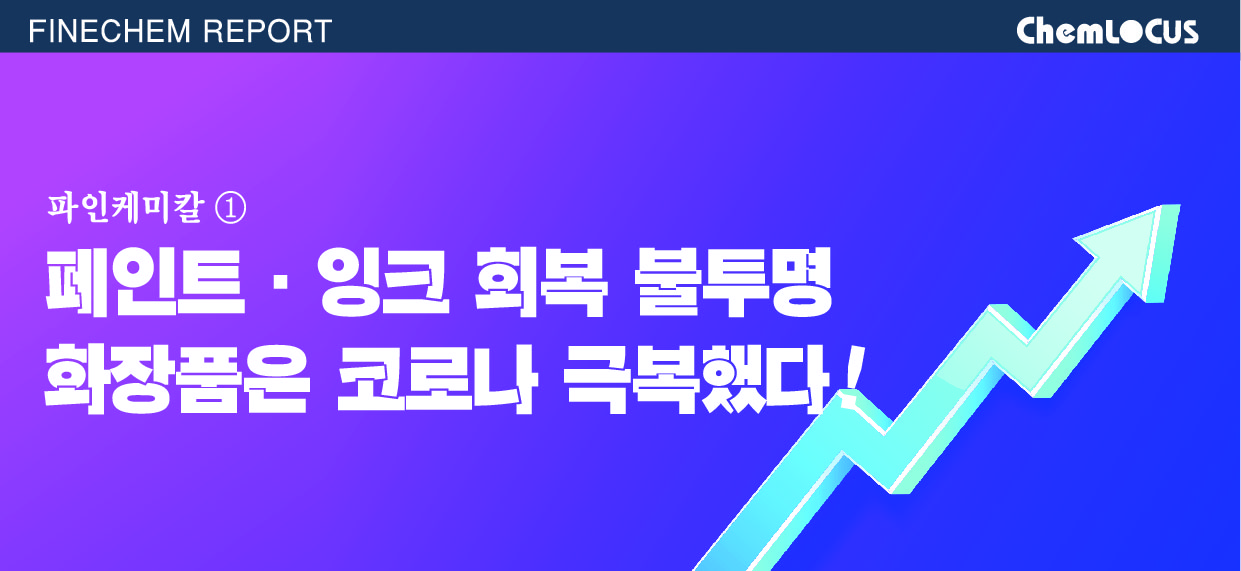
파인케미칼은 부가가치가 강점이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발 수요 변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혼란, 원료·연료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며 한동안 수요 호조로 호황을 누렸던 관련기업들은 수익 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체 사업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파인케미칼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찾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산업 기반을 지탱하는 동시에 첨단기술 발전에도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부가화 및 고기능화라는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일본 정밀화학기업들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등 협업을 강화하며 다음 성장을 기약하고 있다.
페인트, 잉크, 점·접착제, 촉매, 화장품, 농약, 계면활성제 등 일부 파인케미칼은 이미 기반산업의 지위를 확립했으나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환경부하 저감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있다.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바이오매스,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적합 원료 활용 등 생산 단계부터 공정 개선이 필요한 에너지 절감, 혹은 신재생에너지 도입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페인트, 자동차‧선박 수요 회복 효과 “미미”
페인트는 수익성을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022년 페인트 생산량이 147만8735톤으로 전년대비 3.2%, 판매량 역시 155만1907톤으로 3.5% 감소했으며 판매액은 6969억8600만엔(약 6조3217억원)으로 6.7% 증가했으나 원료가격 급등에 따른 결과로 파악된다.
래커와 아크릴(Acryl) 수지계 가열건조형을 제외한 19개 페인트는 판매액이 증가했고 판매량이 14.6% 급증한 선박 바닥용 페인트는 판매액도 40.6% 급증했다.
3월 출하량이 14만톤대로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나머지 달은 12만-13만톤 수준을 유지했고 분기별 출하량은 4분기 39만7237톤이 최대였다.
다만, 품목별 생산량은 증가한 페인트가 5종으로 16종 급감했다.
주요 전방산업 중 건축은 연기됐던 건물 공사가 재개되는 등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재 가격 급등 영향을 크게 받은 반면, 자동차는 반도체 부족 사태 종료로 생산대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자동차용 및 보수용 페인트 가격을 인상해 판매액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선박은 신조선 분야가 회복 기조를 나타내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 분야 역시 상하이(Shanghai) 봉쇄 영향이 수습된 것으로 파악된다.
도로용 페인트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요가 증가했으며 공공공사 관련 수요 역시 2021년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체로 호조를 나타냈다.
기계와 전자기기, 금속제품은 수출비중이 높은 건설·농업기계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분체 페인트 등 친환경제품 출하가 증가했으나 반도체 부족 영향이 이어지며 수치상으로는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목공제품은 원료가격 상승과 높은 목재 가격으로 가구 판매 자체가 줄었으며 가정용은 외출 감소에 물가 상승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잉크, 산업계 재편 본격화된다!
일본은 잉크산업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잉크 생산량이 27만5840톤으로 1.6%, 판매량은 31만8219톤으로 1.0% 감소했으며 판매액은 가격 인상 효과가 일정수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2633억엔(약 2조3865억원)으로 1.0% 증가에 그쳤다.
신문잉크는 생산량이 2만2873톤으로 8.4% 감소하며 6만톤으로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던 2006년의 3분의 1 수준까지 위축됐다.
주요 생산기업들이 이미 10년 이상에 걸쳐 디지털화에 대응한 생산 최적화에 나서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 영향이 가속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잉크 생산기업들은 포장재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보‧미디어계 시장 축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생존·물류 연계 재검토와 생산위탁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기업은 영업장을 재편해 고정비를 줄이고 있으며 개별기업 단위로 추진해온 구조개혁이 산업계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 페인트 1위 DIC와 3위 사카타잉크스(Sakata Inx)가 상업용 옵셋 및 신문 잉크 사업 연계를 합의했으며, 사카타잉크스는 2위 도요잉크(Toyo Ink)와도 생산·물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용제계 그라비아가 중심인 포장재용 잉크는 글로벌 시장이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 내수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견 생산기업 T&K Toka는 선택과 집중의 일환으로 그라비아·플렉소 잉크 사업 양도를 결정했으며, 옵셋을 주력사업을 영위해 온 도쿄잉크(Tokyo Ink)는 포장재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T&K Toka 사업을 인수하기로 했다.
화장품, 고가 브랜드와 남성용 앞세우며 성장 회복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화장품 내수 시장이 회복 궤도에 오르고 있다.
후지경제(Fuji Keizai)에 따르면, 2022년 일본 화장품 시장은 2조9134억엔(약 26조3744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마스크 착용이 줄어들고 매장 내 대면상담 판매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수요가 되살아난 것으로, 특히 고가격대 화장품 시장은 9532억엔(약 8조6295억원)으로 4.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동안 외국인 입국자의 인바운드 수요와 백화점 휴점 영향으로 부진했던 영역이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고 모임이 증가하며 화장품 사용 후 만족도가 높은 고가격대를 중심으로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중가격대 화장품 역시 마스크를 벗는 기회가 증가하며 베이스 메이크업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으며 선스크린 및 헤어케어 관련제품 역시 단가 상승을 통해 중가격대로 재설정하고 판매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가격대 화장품은 최근 생활필수제품 가격이 잇달아 인상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지출을 줄이는 소비자가 유입되며 매출 증가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UV(Ultra Violet) 케어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성장이 위축됐으나 596억엔(약 5397억원)으로 4.9% 증가했다.
선스크린은 피부톤을 밝게 해준다는 점이 호평을 받으며 베이스 메이크업 수요를 대체하면서 시장이 확대됐고 이동제한 완화로 사용 기회가 증가하며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용 화장품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부진을 겪었으나 활기를 되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두피·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가운데 신제품 투입, 프로모션을 통해 미사용자 수요를 개척함으로써 시장이 1583억엔(약 1조4330억원)으로 2.1% 증가했다.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