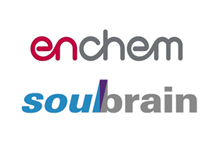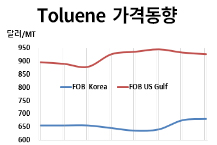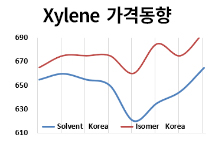중국발 공급과잉 대응해 축소 … 신사업 확대에 고부가 투자 집중
석유화학기업들이 매각으로 기사회생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2022년 하반기에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부정적 래깅 효과로 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했고, 2023년 역시 중국발 공급 부담과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가 지속되며 상반기 수출액이 23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했으며 NCC(Naphtha Cracking Center) 가동률은 71%로 16%포인트 하락했다. 에틸렌(Ethylene)과 나프타(Naphtha)의 스프레드는 18개월째 손익분기점 300달러를 밑돌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증가 등 기대했던 수급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고유가 기조로 NCC 원료 부담이 증가해 석유화학 분야에서 신용도 추가 하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영업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범용제품 설비를 매각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하는 등 사업 재편 강도를 높이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IT 소재용 필름 사업은 중국의 생산량 확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철수 및 매각이 잇따르고 있다.
효성화학은 나일론(Nylon) 필름을 생산하는 대전공장을 폐쇄해 철수했고, 국내 최초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을 개발한 SKC는 2022년 필름 사업부를 매각했으며, 국내 1위 석유화학기업 LG화학은 디스플레이용 필름을 생산하는 청주공장과 오창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은 친환경, 배터리 소재, 글로벌 신약 등 신사업으로 2030년 매출액 4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편광판과 편광판 생산에 필요한 소재 사업을 1조982억원을 받고 중국기업에게 매각했으며 여수 NO.2 NCC 역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국래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범용사업 가운데 한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 가동중단, 사업 철수, 지분 매각, 합작기업 설립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앞으로 태양광 소재인 POE(Polyolefin Elastomer)나 배터리 양극재용 CNT(Carbon Nano Tube) 등 고부가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SKC는 2022년 필름·가공 사업을 매각해 1조600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최근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원료 사업을 영위하는 SK피유코어를 매각하기로 했다.
SK피유코어는 2022년 영업이익이 325억원으로 전년대비 29.9% 감소했으며 SKC는 SK피유코어 지분 100%를 국내 사모펀드인 글랜우드PE에게 4100억원에 넘기기로 했다.
SKC는 매각자금을 배터리·반도체 소재 사업 등 신 성장동력 육성에 집중 투입하고, 특히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생산설비 신증설에 주력할 방침이다.
SKC의 2차전지용 동박 사업 투자기업 SK넥실리스는 2022년 정읍공장 동박 생산능력을 5만2000톤으로 확대했으며 말레이지아, 폴란드 생산기지 마련을 통해 2026년까지 25만톤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중국에서 범용제품 사업을 정리했다.
롯데케미칼은 2023년 6월 롯데삼강케미칼(Lotte Sanjiang Chemical) 보유 지분을 합작 파트너인 삼강화공유한공사(Sanjiang Chemical)게 매각한데 이어 9월 롯데케미칼자싱(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까지 현지 파트너에게 매각해 중국 범용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를 모두 정리했다.
롯데삼강케미칼은 계면활성제, 부동액, EO(Ethylene Oxide)를 생산하고 있으나 중국 화학기업의 생산설비 증설로 EO 판매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적자가 누적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2023년 1월 파키스탄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공장 역시 약 1900억원에 매각했으며 범용제품 매출 비중을 현재 60%에서 2030년 40%로 낮추고 배터리 분리막, 태양광 소재 등 고부가제품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