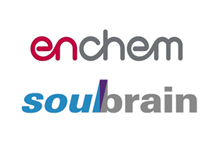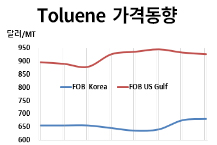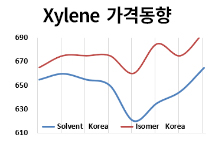니켈 투자 확대하며 관련 수요 급증 … 롯데, 말레이 진출 여부 주목
가성소다(Caustic Soda)는 인도네시아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PVC(Polyvinyl Chloride) 수요 증가율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비슷한 연평균 4-5% 수준으로 파악되며 가성소다는 더 높은 두자릿수대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성소다는 배터리나 반도체 등 정밀제품 제조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사용되며 전기자동차(EV)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는 전구체 톤당 가성소다 투입량이 최소 0.89톤이고 용량 1GWh당 가성소다 약 430톤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해 주요 산업 체인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미가공 중요 광석 수출을 금지하며 가성소다 수요 증가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가성소다는 광석의 습식제련 공정에 사용되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0년 니켈 광석, 2023년 6월 알루미늄 원료용 철반석(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한 이후 국영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자체 광석 공급 확대에 주력하면서 제련소 투자와 광산 프로젝트를 확대해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니켈 투자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가성소다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매장량 중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니켈 광산 개발 프로젝트 및 니켈 제련소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지분 60%를 취득하며 경영권을 확보했고, 에코프로는 2024년 글로벌 자원실을 신설하고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 침체로 니켈 가격이 급락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수요 증가가 확실하기 때문에 니켈 관련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가성소다 설비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AP(Chandra Asri Petrochemical)는 가성소다 생산능력 40만톤, EDC(Ethylene Dichloride) 50만톤의 신규 플랜트 건설을 위해 8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한다.
다만, CA(Chlor-Alkali) 체인은 보통 염소가 주요 생산제품이고 가성소다는 부산물로 취급되나 인도네시아는 일반적인 상황과 반대로 염소의 최대 용도인 PVC 수요 증가율이 가성소다에 비해 낮기 때문에 CAP의 투자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염소 판매망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가성소다 생산기업은 한화솔루션이 생산능력 84만톤으로 최대 메이저이며 LG화학 72만8000톤, 롯데정밀화학 35만톤, OCI 11만톤으로 뒤를 잇고 있다.
한국산 가성소다의 인도네시아 수출량은 액상 기준 2019년 0톤에서 2020년 1만505톤으로 폭증했고 2021년 4430톤, 2022년 6899톤에서 2023년 4만8106톤으로 폭증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곳은 없으나 롯데정밀화학이 말레이지아에서 가성소다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성사된다면 인도네시아 수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도네시아 포함 동남아 CA 시장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어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GC, 도소(Tosoh) 등 일본 CA(Chlor-Alkali) 메이저 2사는 동남아 신증설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GC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CA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AGC Chemicals Thailand, AGC Chemicals Vietnam 등을 통합해 설립한 신규기업 AGC Vinythai를 통해 타이에서 가성소다, VCM(Vinyl Chloride Monomer), PVC 생산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100억엔 이상을 투자해 가성소다 생산능력을 2025년까지 57만톤으로 22만톤, VCM과 PVC는 각각 80만톤 및 70만톤으로 40만톤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소는 민다나오(Mindanao) 섬에서 필리핀 유일의 전해설비이면서 가성소다 생산능력 3만2000톤의 Mabuhay Vinyl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인근 스팀 크래커로부터 에틸렌(Ethylene)을 조달해 EDC까지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