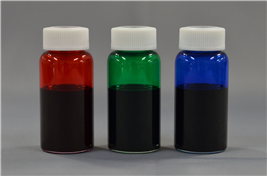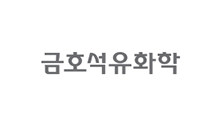1조원대의 제2차 ESS(에너지저장장치) 정부 수주 사업 공고가 국가정보자원 화재 여파로 지연되고 있다.
전력거래소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은 앞서 7월 진행된 1차 사업과 유사한 총 540MW, 1조원대로 추정되며 2027년 12월 공급 예정이어서 당초 2025년 10월 경쟁입찰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 화재로 마비된 국가 시스템이 아직 100% 회복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입찰이어서 비가격 지표 중 하나인 화재 안전성 항목 기준을 보강하거나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며 사업자 선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 화재에 따른 장애 시스템 복구율은 최근 95%를 넘어섰으며 정부는 11월20일까지 모든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9월 열린 사업자 간담회에서 전력거래소는 1차 사업 평가 배점에서 40%로 책정됐던 비가격 지표 비중을 2차 사업에서는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가격 지표는 산업·경제 기여도, 화재 및 설비안전성, 주민 수용성 및 사업 준비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국내 배터리 3사는 각각 배터리 기술력을 강조하며 ESS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1차 입찰에서 전체 물량의 76%를 수주한 삼성SDI는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SDI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ESS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공동 관리 등 신뢰할 수 있는 ESS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차 수주전에서 밀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국내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난징(Nanjing) 공장에서 생산하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오창공장의 ESS용 NCM 배터리 라인을 전환해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온은 서산공장 전기자동차(EV) 전용 라인을 ESS 라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2026년 LFP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를 미국 대규모 프로젝트에 공급하고 양산 노하우를 축적해 국내 생산 안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