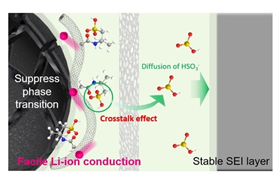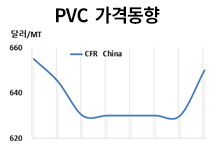일본 바이오산업은 의약에서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침투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한 반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다소 지연됐으나 2010년부터 일본 정부는 기술발전 및 성장촉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사령탑으로 설치해 산ㆍ관ㆍ학 협력을 통해 바이오분야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으로, 미국의 NIH나 영국의 OSCHR 등을 정책수행 시스템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지원 아직도 부족
일본은 바이오 벤처기업 수가 2006년 586사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9년 558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참여 감소 및 철수 증가, 벤처 캐피탈 투자액 축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약품을 제외한 의료ㆍ건강 관련기업이 137사로 가장 많았고 연구지원 117사, 의약품 68사가 뒤를 이었으며, 평균 자본금은 5000만엔으로 조사됐다.
창업자 보유율은 80%로 높고 40-50%는 친족이나 지인, 30%는 벤처 캐피탈, 기업투자는 10-40% 수준으로 미국에 비해 아직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스템 및 환경정책 마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NIH 시행에만 322억달러를 투입해 벤처기업이나 바이오클러스터를 지원함으로써 신 성장동력 기반을 강화한 일본은 생명과학 관련 국가예산이 총 4600억엔으로 경쟁력 강화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 클러스터 형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산ㆍ관ㆍ학 연계 효과를 누리고 있는 Osaka 소재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헤드쿼터체제인 Osaka 바이오전략추진회의와 바이오응원단의 협력으로 2010년 바이오의약품 개발 중심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2018년 세계 5위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ㆍ의료기기, 금융 분야에 투자하는 미국형 바이오펀드를 조성해 2010년 7월 제1호 투자기업을 선정한 이후 관련산업을 Osaka 지역에 집중시키는 등 사업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Hokkaido 지역도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및 소재 산업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