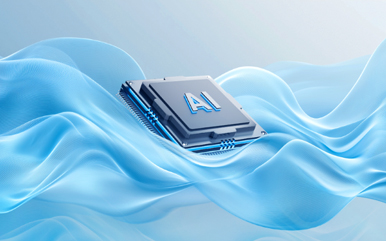삼성SDI(대표 조남성)는 영업실적 악화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삼성SDI는 부진한 영업실적과 더불어 중국 전기자동차(EV) 배터리 4차 인증 탈락,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등 예상치 못한 악재가 이어지며 9월 둘째주 초 조남성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열고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2015년 케미칼 부문을 롯데에게 매각한 후 배터리 사업을 적극 강화하고 있으나 2016년 1/4분기 7038억원, 2/4분기 541억65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3/4분기에도 400억원 가량의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폭발원인이 2015년 새롭게 도입한 파우치형 배터리의 결함으로 밝혀지면서 전체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임원회의에서 접대나 회식을 자제하고 비용을 아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미 잡혀있던 회식과 행사가 모두 취소되는 등 비용과 관련된 결제가 까다로워졌다”고 밝혔다.
파우치형과 각형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은 동일제품을 사용하지만 공정에 차이가 있으며 갤럭시노트7 발열사고는 삼성SDI가 파우치형 배터리의 공정 기술력을 완벽히 확보하지 못해 결함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도 기자회견에서 “배터리의 공정상 문제”라며 “배터리 셀 내부에 극판, 음극과 양극이 눌린다거나 절연테이프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축되는 등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삼성SDI는 갤럭시노트7 물량에 대해 배터리 공급을 잠정 중단했으며,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리콜에 나선 후 중국 ATL의 주문을 늘리고 추가적으로 중국과 일본 배터리 생산기업에게 납품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등 신규 배터리 공급기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공급기업 후보에서 LG화학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파우치형 배터리에서 최고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양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갤럭시노트7 배터리 추가 공급은 일본 혹은 중국기업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