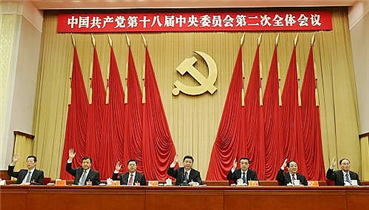건축용 도료는 2017년부터 6가크롬(Hexavalent Chrome: Cr6+) 화합물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015년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2017년부터 건축용 페인트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6가크롬 화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유해인자 노출 감시대상에 건축용 페인트를 추가하는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일부 수정한 가운데 관련산업계의 의견을 2016년 7월까지 수렴한 후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6가크롬은 납, 수은(Hg), 카드뮴, PBB (Polybrominated Biphenyl), 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등과 6가지 특정유해물질로 취급됨에 따라 유럽에서는 RoHS(특정위험물질 사용제한 지침)로 규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화학산업에서는 촉매로 널리 활용하고 있으나 산화력이 강한 특성이 있어 세포의 조직을 손상시키고 DNA 변이까지 야기할 수 있어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염·안료, 스테인리스 강 등을 생산하는 금속제조업, 단열재, 목재 보존제 제조 등에 사용되며 제철, 합금·도금, 주물, 건축·자동차 폐기물, 시멘트·레미콘, 용접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폐기물로 방출되고 있다.
인체에 노출되면 피부염을 일으키고 체내에 흡수되면 복통, 빈혈을 동반하며 장기간 흡입하면 연골부에 천공이 생기는 비중격천공 및 기관지암·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가크롬 화합물의 한 종류인 크롬 피그먼트 옐로34(C.I. Pigment Green13)는 발암성 및 생식독성을 지녀 상당히 위험한 물질로 취급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페인트는 6가크롬, 페놀(Phenol) 등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용 페인트는 인체와 밀접하기 때문에 중금속인 납, 6가크롬, 카드뮴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6가크롬은 페인트의 원료로 금속 소지면의 녹·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청안료에 첨가되고 있으며 방청안료는 자동차용, 건축용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페인트기업들은 방청안료를 대체할 수 있는 안료도 일부 구매하고 있으나 대체제 가격이 방청안료보다 5-10배까지 높게 형성되고 물성도 떨어져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잇따른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성을 갖추면서도 기능성이 높은 페인트를 개발하기 위해 R&D(연구개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6가크롬이 첨가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지고 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인 규제가 없으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6가크롬 화합물은 0.1% 이하 함유제품에 한해 지방청의 허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전국 페인트 판매업체 허가현황」에 따르면, 허가대상 판매대리점 6670곳 가운데 55.2%인 3685곳만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2985곳에 달하는 44.8%는 무허가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준치 초과제품은 중량이 1만6524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6가크롬은 피부과민성, 발암성 등 인체유해성이 높은 물질로 최대 60%까지 함유된 페인트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달리 일본 페인트기업들은 6가크롬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무허가 페인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6가크롬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페인트를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내 페인트기업들과 2016년 1월 업무협약을 맺고 6가크롬 화합물 사용을 줄이도록 조치했으나 소비자들이 이미 구매한 기준치 초과제품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페인트 관련기업들만 유해물질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인지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정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