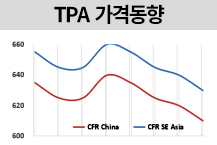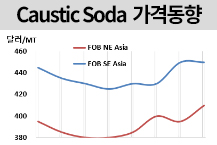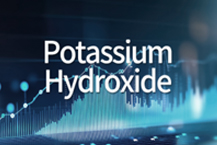동남아시아 석유화학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동남아 석유화학 기초원료 및 폴리올레핀(Polyolefin) 생산기업들은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에 걸쳐 일제히 높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아에서도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인디아 화학기업의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타이 PTT Global Chemical(PTTGC)은 방향족(Aromatics) 및 페놀(Phenol) 증설투자를 통해 석유화학 생산능력을 약 10% 확대했다.
PTTGC는 2016년 5월 Map Ta Phut 소재 No.2 아로마틱 컴플렉스 건설을 완료해 P-X(Para-Xylene) 생산능력을 77만톤으로 20%, 벤젠(Benzene)은 39만톤으로 10% 확대했고 O-X(Ortho- Xylene)도 2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증설물량은 대부분 외부 판매하며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놀도 No.2 플랜트를 건설해 생산능력을 25만톤에서 50만톤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시아 최대 메이저로 부상했다.
PTTGC 산하의 IRPC는 6월 말 프로필렌(Propylene) 생산능력 32만톤의 심도접촉분해장치(DCC)를 가동했다.
PTTGC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 50만톤의 NCC(Naphtha Cracking Center)를 신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료는 Siam Cement 그룹에게 공급하고 있는 경질 나프타를 사용하고 유도제품으로 아크릴산(Acrylic Acid) 및 SAP(Super-Absorbent Polymer), SSBR(Solution-Polymerized Styrene Butadiene Rubber)을 생산할 계획이다.
베트남 Petrolimex는 2016년 4월 일본 JX에너지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자사 지분 8%를 양도하기로 결정했으며 정유공장을 신규 건설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Petrolimex는 석유·가스 도매 및 충전 서비스 등이 주력 사업으로 정유 사업은 처음이나 정부 승인을 취득했으며 원유 공급처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PTTGC도 베트남 투자를 적극 추진했으나 2016년 6월 중부 Binh Dinh에 건설하는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일일 정제능력 40만배럴의 정유공장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컴플렉스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아람코(Saudi Aramco)의 참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투자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 JG Summit은 NCC 증설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5억-6억달러를 투입해 에틸렌 생산능력을 5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폴리올레핀 및 부타디엔(Butadiene), 방향족 증설도 검토하고 있다.
JG Summit은 2014년 필리핀 최초로 NCC를 가동했으며 생산능력은 에틸렌 32만톤, 프로필렌 19만톤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 들어 폴리올레핀 플랜트의 가동률이 높아져 NCC도 조만간 풀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화학 관련 해외자본 유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 한국 등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트는 투자 회수 및 일정을 의문시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6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과 총 4억달러의 투자협정을 체결해 Java섬 서부에 NCC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컴플렉스를 건설할 계획이다.
LDPE(Low-Density Polyethylene)를 생산하고 있으며 영업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원료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합성수지 생산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영 에너지기업 Pertamina는 6월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Rosneft와 Java섬 동부에 정유공장과 석유화학 컴플렉스를 신규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정제능력은 30만배럴로 Pertamina와 Rosneft가 55대45으로 합작해 2022년 가동을 목표로 최대 14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Pertamina는 정유공장의 고도화 및 신규공장 건설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JX Holdings는 Kalimantan섬 동부 Balikpapan 소재 정유공장 증설계획을 2016년 1월 철회했고, 아람코도 복수의 정유공장 투자에 합의했으나 사우디 정부가 경제개혁에 착수해 프로젝트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Chandra Asri Petrochemical은 2015년 12월 Cilegon 컴플렉스를 증설해 2016년 풀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ell은 2015년 말 설비 트러블로 싱가폴 NCC의 가동을 중단한 끝에 2016년 7월 말 가동을 재개해 8월 초 70% 정도의 가동률을 유지했으나 2개월 만에 또다시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네덜란드 물류 메이저 Vopak은 2016년 초 Jurong섬에서 LPG(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8만평방미터의 독립형 수입터미널을 건설해 석유화학 원료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Jurong Aromatics은 7월 컨덴세이트(Condensate) 스플리터를 재가동했다.
말레이지아 Petronas는 정유공장과 에틸렌 크래커 건설에 착수했으나 합성고무는 사업환경 악화로 계획을 철회했다.
Petronas는 2016년 봄 Pengerang에서 대규모 컴비나트 프로젝트 「RAPID」의 핵심인 정유공장과 에틸렌 크래커의 건설에 착수했으며 2019-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Versalis와 합작으로 SSBR 생산설비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사업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단념한 것으로 알려졌다.
Shell은 Shell Overseas Holdings 보유한 말레이 SRC(Shell Refining)의 지분 51%를 중국 국영기업인 Shandong Hengyuan Petrochemical(SHP)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정유공장은 노후화 등으로 적자경영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HP은 정유공장의 고도화와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아 석유가스공사(ONGC)는 2016년 봄 Gujarat에 에틸렌 생산능력 110만톤의 석유화학 컴비나트를 건설했으며 조만간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Reliance도 2016년 말 가동을 목표로 에틸렌 140만톤 크래커를 건설하고 있어 인디아는 에틸렌 생산능력이 약 700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파악된다.
ONGC Petro Additions Limited (OPaL)는 4월 Dahej에서 대규모 컴비나트를 완공했으며 201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탄(Ethane)과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110만톤, 프로필렌 4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Dual Feed 분해로를 중심으로 부타디엔 추출설비 및 벤젠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유도제품은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34만톤, LLDPE(Linear LDPE) 34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LLDPE/HDPE 병산설비 2개 라인을 건설한다.
RIL도 Gujarat에서 140만톤 대형 에틸렌 크래커를 건설해 생산능력을 3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2016년 말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완공을 2017년 이후로 미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P-X 대형투자도 실시해 생산능력을 420만톤으로 2배 가량 확대한다.
인디아 정부는 2016년 2월 동북부 8주를 대상으로 석유·석유화학, 천연가스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Hydroncarbon Vison 2030」을 시작했다.
총 1조3000억루피를 투입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북동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근 국가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투자액 가운데 8000억루피 가량은 가스·유전 개발 등 업스트림 부문에, 나머지 5000억루피는 정유공장 및 가스 공급체제 정비 등 다운스트림 부문에 투입할 계획이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GALI가 2015년 11월 자회사를 통해 Assam 정유공장에서 Dual Feed 분해로를 가동했다. 에틸렌 생산능력은 22만톤으로 소규모이나 북동부에서는 최초의 에틸렌 크래커이다.
IOC는 해당지역에서 프로필렌 및 LPG를 고수율로 생산하는 FCC(Fluid Catalytic Cracking)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