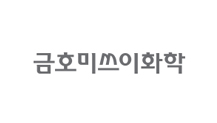태광산업(대표 심재혁·홍현민)은 신사업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태광산업은 신규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AN(Acrylonitrile),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등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은 2016년 수급타이트로 상승세를 지속해 호조를 나타냈으며, PTA도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AN 및 PTA는 중국의 자급률 확대로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PTA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돼 생산능력 축소가 요구되고 있다.
PTA는 공급과잉으로 생산라인 통합, 합작, 제3자 공개매각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나 태광산업은 감산 없이 생산을 지속할 계획이다.
태광산업은 2016년 1월 PTA 100만톤을 90만톤으로 10만톤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한 이후 추가적인 스크랩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2017년에도 신규투자 및 구조조정 계획이 없으며 AN, PTA 등 석유화학제품의 해외영업을 강화해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광산업은 신규투자 부진으로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해외영업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까지 강화되고 있어 고전이 예상된다.
중국은 2016년 7월 중순 태광산업의 아크릴섬유에 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EU(유럽연합)도 한국산 PTA의 반덤핑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수익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아크릴섬유는 태광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7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나 국내수요가 3000-3500톤에 불과해 대부분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중국산과 품질 차이가 없고 저렴한 폴리에스터(Polyester)로 대체되는 등 열악한 영업조건이 지속돼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스판덱스(Spandex) 및 산업용 섬유 사업에는 추가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스판덱스는 수익성이 비교적 높지만 효성이 글로벌 신증설을 확대해 공급과잉을 유발함에 따라 마진이 악화되고 있으며, 태광산업은 설비투자를 추진하지 않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태광산업은 효성, TK케미칼보다 스판덱스 사업에 선발 진입했음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하지 못하면서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효성이 중국·터키에서, TK케미칼이 이란·국내에서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태광산업은 추가 투자 없이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다.
효성은 베트남·중국 증설에 이어 터키 Istanbul 소재 스판덱스 2만톤 공장을 5000톤 증설하고, 중국 Quzhou에는 1만6000톤 공장을 신규 건설해 2017년 상반기 상업화할 예정이다.
TK케미칼은 2019년 이란에 스판덱스 3000-4000톤을 신규건설할 계획이며 7월에는 구미 공장을 1만톤 증설하는 등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최대 수요국인 중국에 2만9200톤 플랜트를 건설하며 선제적으로 진출했으나 추가 증설이 없어 현상유지에 급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태광산업은 고강도 산업용 섬유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탄소섬유는 기술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신규 진출한 파라아라미드(Para-Aramid)도 경쟁이 과열돼 기대만큼 선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 도레이첨단소재가 4700톤을 가동하는 가운데 2021년까지 추가적인 신증설을 발표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국내기업들이 탄소섬유 사업을 사실상 포기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탄소섬유 생산능력은 효성 2000톤, 태광산업 1500톤에 불과하고 채용사례도 미미해 사실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태광산업은 2016년 산업용 파라아라미드 공급을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방탄용 공급도 시작했으나 흑자생산을 위해서는 추가 설비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파라아라미드는 1000톤 생산설비를 갖추고 시험생산 후 상업가동하고 있으나 공정 특성상 최소 3000톤 이상을 생산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