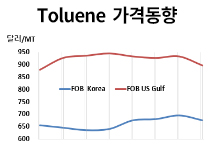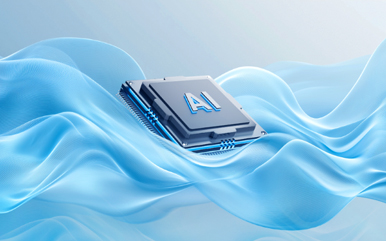정부가 뒤늦게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과학기술 분야 국산화 R&D 로드랩에 마련에 착수했다.
일본의 전방위적인 수출규제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는 최근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중국의 추격으로 가성비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소재·부품 수출액은 세계 5위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소재만 떼놓고 보면 무역수지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국내 소재산업 자립화 비율은 66% 수준에 그치며 많은 소재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에도 조립·가공 완제품 생산에 치중돼 발전한 국내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재·부품산업 국산화를 지원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반도체 R&D 지원예산이 0원으로 급감했고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대신 미래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반도체 소재와 부품 등 국산화 작업이 사실상 단계적으로 폐기된 바 있다.
결국 핵심 부품 및 소재의 대외 의존이 심화됐고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건 감광액은 국산화율이 0%에 그친 반면 일본산 의존도가 9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과거와 달리 더욱 정밀하게 전략을 세웠다.
우선 R&D 로드맵이 특성상 단기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 아래 1단계와 2단계 투트랙(Two-track)으로 나누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과기정통부 1차관실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소재·부품 관련 10여개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동시에 과기정통부 3차관실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소재 혁신개발 분야 신규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시장 경쟁력이 부족한 소재들은 정부의 R&D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지원으로 서둘러 기술개발에 착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강성원 ETRI ICT창의연구소 소장은 “고순도(99.9%) 불화수소는 소수기업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국내 소재산업 R&D는 가격경쟁력 위주로 구성돼 있어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조차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출연연 관계자도 “소재부품 R&D에 비용을 투입한다고 금세 국산화가 이뤄지지는 않는다”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수요기업이 적극 나서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과 공동 개발하고, 정부 연구기관은 장기적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