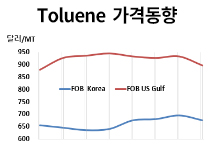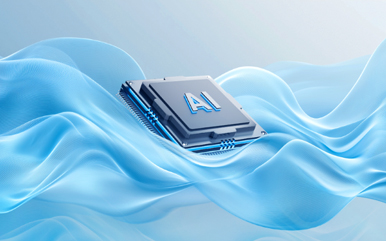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화학소재 생산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R&D) 투자액이 국내기업에 비해 무려 40.9배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균 R&D 투자 뿐만 아니라 평균 매출액(17.9배), 평균 당기순이익(23.3배), 평균 자산(20.5배) 등 주요 재무 항목 모두 일본기업이 큰 폭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 생산기업 1만117개(한국 2787개에 일본 7330개)를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들은 평균 R&D 투자액이 70만달러로 일본 2860만달러의 40분의1 수준에 그쳤다. 전체 평균으로도 한국은 2억990만달러에 불과해 일본 33억7510만달러의 1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일본기업의 평균 R&D 투자액은 소재 5개 품목 중 3개, 부품 6개 품목 중 3개에서 한국기업보다 높았다. 소재 부문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투자액은 한국기업의 1.6배에 달했다. 1차금속제품이 5.3배, 섬유가 5.1배,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 3.1배 순이었다.
부품 부문에서는 일본기업의 평균 R&D 투자액은 한국의 40%에 불과했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에서 한국기업의 평균 R&D 투자액이 일본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전자부품에서 한국기업의 평균 R&D 투자액은 일본기업의 8.2배에 달했다.
정밀기기부품은 일본기업의 평균 R&D 투자액이 한국기업의 7.0배, 수송기계부품은 2.3배, 전기장비부품은 2.0배 컸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부품 부문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투자가 한국기업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국내 전자부품 생산기업의 평균 R&D 투자가 97%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포함하면 일본 전자부품 생산기업의 R&D 투자가 한국기업에 비해 낮았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일본의 R&D 투자가 3.7배 높았다.
전자부품 부문에서 반도체 착시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 정밀기기부품 등 핵심 부품·소재 부문에서 한국기업의 평균 R&D 투자액이 일본기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