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래스틱 문제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2021년 5월13일 주최한 폴리머교육(Ⅰ) - 범용 폴리머의 이해 및 활용 교육에서 한국화학연구원 황성연 센터장은 바이오 플래스틱의 이해 및 활용 발표를 통해 “1990년-2019년 평균 이산화탄소(CO2) 방출량은 미국이 0.03%, EU(유럽연합) 0.8%, 일본은 0.04% 등 소폭이나마 감소한 반면 한국은 3.3%, 중국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학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화학산업은 201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억2000만톤으로 전세계 총 배출량의 14.3%를 차지함으로써 시멘트(26.4%), 철강(25.1%)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화학산업은 201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억2000만톤으로 전세계 총 배출량의 14.3%를 차지함으로써 시멘트(26.4%), 철강(25.1%)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1994년에 재활용 촉진법을 발의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해졌고 제조 및 생산단계에서 분리가 어려운 라벨이나 다른 재질, 화려한 색상으로 제조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세계 각국은 선형경제의 단순한 효율 상승으로는 자원 고갈 및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순환경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EU는 재사용‧회수‧수리를 위한 순환형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제품 정책을 설계하고 플래스틱 재활용제품의 품질 및 경제성 향상, 순환경제를 위한 혁신 및 투자 유도, 플래스틱 폐기물 감축, 글로벌 차원의 협력 등 4대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의 순환경제 정책을 반영 및 연구해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기업 간 전략적 제휴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지원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바이오 플래스틱은 옥수수, 사탕수수, 나무 등 식물 베이스 자원을 원료로 한 바이오 기반 플래스틱과 사용 후 폐기했을 때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 작용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래스틱을 통칭하고 있다.
미래 고성장이 전망되나 아직 석유계 플래스틱에 비해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PLA(Polylactic Acid)는 네이처웍스(NatureWorks)와 토탈-코비온(Total-Corbion)이 생산하고 있으나 신규 진출을 위해서는 미생물 공장과 화학공장을 함께 건설해야 하는 가운데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기업들은 아직 투자를 못하고 있다.
PHA(Polyhydroxyl Alkanoate)는 CJ제일제당이 5000톤 상업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PBAT(Polybutylene Adipate-co-Terephthalate)도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종합화학이 생산에 도전하고 있다.
PBAT는 중국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으로 수요가 증가해 kg당 2달러 초반이었던 시세가 최근 5달러 이상으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생분해성 마스크 필터를 연구개발(R&D)해 28일만에 분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한솔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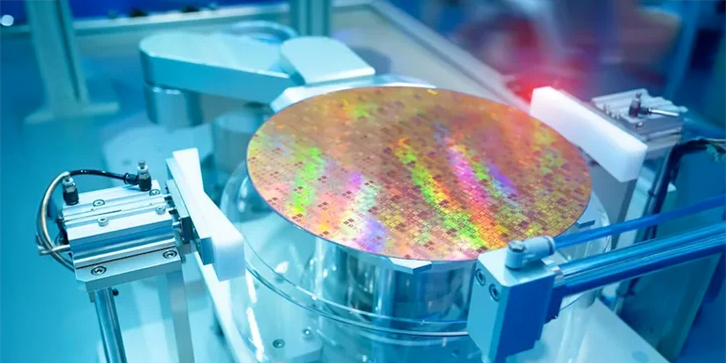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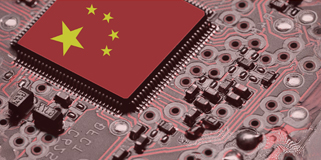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화학산업은 201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억2000만톤으로 전세계 총 배출량의 14.3%를 차지함으로써 시멘트(26.4%), 철강(25.1%)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화학산업은 201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억2000만톤으로 전세계 총 배출량의 14.3%를 차지함으로써 시멘트(26.4%), 철강(25.1%)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