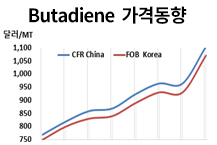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움직임이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EV)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은 2020년 전기자동차 판매대수가 2.4배 급증했고, 중국은 2035년 신규 자동차 판매대수에서 환경 대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10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도 중국처럼 2035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감축하는 경량화와 구동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전동화가 필요하나 전동자동차(xEV)는 배터리가 무거워 배터리 용량을 줄이기 위한 경량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 차체 경량화 소재로는 고장력 강판, 비철금속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부품은 수지화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구조부품 수지화에는 주로 CFRP(탄소섬유 강화 플래스틱)가 채용돼 부품 모듈화가 진척되고 있으며, 복합소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 접착‧접합 기술도 부상하고 있다.
고분자 소재는 전동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동차량 열관리가 선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플래스틱은 전동화가 이루어져도 근본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강도, 강성에 이어 전기적, 열적 특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전동화는 열관리가 중요해 PBT(Polybutylene Terephthalate), PPS(Polyphenylene Sulfide) 등 내열성이 우수한 EP(엔지니어링 플래스틱)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플래스틱은 자동차용 비중이 약 10%로 경량성, 성형가공성, 저코스트, 리사이클성 특징을 바탕으로 내‧외장부품은 물론 엔진룸 내부의 기능부품, 전자시스템, 연료시스템, 에어백, 안전벨트를 포함한 안전시스템, 구동‧섀시계 등에 다양하게 투입되고 있다.
유럽,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km당 95g 이하 강제
자동차는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21년부터 자동차기업별로 신규 자동차(승용차)의 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km당 95g 이하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맞추지 못하면 1g 초과할 때마다 95유로(12만5000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 유럽 21개국에서 판매된 신규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주행거리 km당 118.5g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2g보다는 줄었으나 배출량 감축목표를 맞추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의 2021년 배출가스 기준인 신규 자동차 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g은 국내 신규 자동차 평균 배출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은 연비가 좋지 않은 대형 세단,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럽의 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자동차를 1대 판매할 때마다 187만5000원의 벌금을 내야 해 2021년 유럽에서 100만대를 판매한다면 벌금만 1조875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2019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의 신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6.5g, 기아자동차는 121.8g으로 2021년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미국은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7년형 기준 132g에서 2025년 89g까지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고 유럽은 2021년까지 95g, 일본은 2020년 114g, 중국은 2025년 93g으로 강화했다.
미국도 2025년까지 자동차 평균 연비를 리터당 23.2km까지 높이도록 압박하고 있고 평균 연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LCA, 자동차 라이프사이클 전반 배출량 평가
도요타(Toyota Motor)는 2021년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요타는 2019년 유럽에서 판매한 신규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5g으로 가장 낮아 전기자동차만 생산하는 테슬라(Tesla)를 제외하면 2021년 유럽 기준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요타는 유럽의 엄격한 기준을 맞추면서도 전기자동차를 거의 팔지 않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자동차(HV)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9년 도요타는 유럽에서 판매한 자동차 가운데 전동자동차 비율이 63%에 달하고 있으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를 일부 판매한 것을 제외하면 전동자동차 대부분이 하이브리드자동차이다.
도요타는 전기자동차를 내세우지 않고도 LCA(Life Cycle Assessment) 개념을 도입해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고 있다.
LCA는 자동차의 생산과 에너지 생성, 주행, 폐기, 재활용 등 라이프사이클 전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하며,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가 2019년 검토를 시작했고 2025년까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이후 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축 경쟁의 축이 자동차기업별 평균 연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에서 LCA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CAFE 기준으로는 주행 중 상황만 평가하는 현행 규제로는 전기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이지만, LCA에서는 제조·발전 등 배출량이 더해져 전기자동차도 배출량을 줄이려면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해 자동차를 조립하고 배터리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테슬라가 LG화학의 배터리 제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확인하고,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때 나오는 배터리를 태양광과 결부된 ESS(에너지저장시스템)로 재활용하는 것도 전부 LCA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자동차를 제작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2배에 가깝고 대부분 배터리 생산에서 발생해 대폭 감축을 위해서는 배터리를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비철금속, 차체 경량화 소재로 부상
자동차기업들은 차체나 부품 무게를 낮추기 위해 소재를 전환하고 있다.
자동차 무게 10kg를 줄이면 연비는 2.8% 향상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5% 감소하며, 질소산화물(NOx)도 8.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포드(Ford)는 100% 알루미늄 차체를 적용한 트럭 F-150을 출시했으며 차체 무게가 350kg 가벼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알루미늄은 휠이나 엔진 실린더블록 등 주조부품에 투입됐으나 최근에는 차체를 구성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 미국은 앞 덮개(후드), 바퀴덮개(펜더), 자동차 문 등에 알루미늄 합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혼다(Honda)도 슈퍼카 NSX에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했다. 2세대 NSX 뼈대(화이트 보디)는 무게를 216kg 줄여 1세대보다 16kg 추가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그네슘도 비중이 철의 25%, 알루미늄의 67% 수준으로 가벼워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포스코가 차체용 마그네슘 판재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기업들은 경량화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60-70%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철강·화학 노하우가 오래돼 집중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효성그룹은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의 자동차용 개발을 적극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년간 4800억원을 투자해 티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탄소섬유 등 4대 경량 소재를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원하고 있다.
범용수지,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 강화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안전장비가 증가해 차체가 무거워짐에 따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경량화할 수 있는 PP(Polypropylene), PE(Polyethylene), PVC(Polyvinyl Chloride),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등 범용수지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용 범용수지 가운데 사용량이 가장 많은 PP는 승용차 대당 약 60kg이 탑재돼 전체 범용수지 사용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필러 등을 첨가해 컴파운드화함으로써 강성을 높일 수 있고 리사이클성이 뛰어나 계기판, 도어패널 등 내장부품 뿐만 아니라 범퍼, 라디에이터 등 대형부품에도 채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리섬유로 강화한 PP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흡기다기관에는 주로 EP가 채용되고 있으나 더욱 경량화할 수 있는 소재로 유리섬유 강화 PP가 주목받고 있으며 열가소성 CFRP 매트릭스 수지용으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SUV의 백도어에도 채용되고 있다. 유리섬유 강화 PP를 비롯한 플래스틱제 백도어는 자동차 경량화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PP 생산기업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생산설비 재구축(S&B: Scrap & Buil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동, 아시아 신증설의 영향으로 해외 범용제품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적 장벽이 높은 자동차 분야에서 고품질 차별제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후화된 설비를 폐기하고 차별화된 프로세스로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HDPE(High-Density PE)는 중공성형에 따라 연료탱크에 채용되며 경량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배리어층은 EVOH(Ethylene Vinyl Alcohol Copolymer)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ABS는 PP에 비해 외관성, 도장성이 뛰어나 콘솔박스 등 내장부품 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를 비롯한 외장부품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장식성형용 필름 관련용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VC는 품질 및 성능, 가격우위성 등이 재평가됨에 따라 와이어하니스, 내장재 등에 채용되고 있으나 신규용도 개척이 요구되고 있다.
EP, 경량화 이어 고기능화 전략 강화
EP는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필수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EP는 PA(Polyamide)를 중심으로 PC(Polycarbonate), POM(Polyacetal), PBT, 변성 PPE(Polyplenylene Ether) 등이 채용되고 있으며 슈퍼 EP는 PPS, LCP(Liquid Crystal Polymer) 등이 투입되고 있다.
EP 생산기업들은 자동차의 CASE(연결‧자율주행‧공유‧전동화) 트렌드에 대응한 전동자동차를 실현하기 위해 경량화 플러스알파 제안을 강화하고 있다.
기계적 특성, 성형가공성 등 전체적으로 우수한 물성을 조화롭게 갖춘 PBT는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관련부품에 대한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끄럼 방지, 전자파 흡수 타입 등 차별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내열성, 내약품성, 기계적 강도 등을 갖춘 PPS는 히트사이클, 내전압 등이 뛰어난 그레이드가 개발됨에 따라 PCU(파워 컨트롤 유닛), 냉각부품, 회전센서, 콘덴서케이스 등에 채용되고 있다.
접동성이 우수한 POM(Polyacetal)은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그레이드를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PC는 수지창(글레이징) 등 신규용도 개척을 가속화하고 있다.
저유전 등 전기특성이 뛰어난 LCP도 전동자동차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로 통신용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자동차의 파워반도체용 적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연료전지자동차(FCV) 분야에서는 PA 생산기업이 수소탱크용 제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PBT, PPS, 변성 PPE 생산기업들이 고용량 LiB(라튬이온전지) 주변부품용 수요 개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경량화, 각종 기능 부여 뿐만 아니라 여러 부품을 용접해 모듈화하기 위해서도 수지를 채용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성형방법을 포함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점유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용 EP 가운데 사용량이 가장 많은 PA는 내열성, 강도, 내유성, 성형성, 코스트 특성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 흡기다기관, 엔진커버, 라디에이터탱크 등 엔진 주변과 안전벨트, 팔걸이 등 내장부품에 투입되고 있다. 고내열 그레이드는 터보엔진 소형화, 차세대 파워트레인용 등으로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사이드미러 스테이, 후방카메라 등 외장부품용 수요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어백 섬유용도 증가하고 있다.
PBT, 전자파 차단 소재로 부상
전동자동차에 탑재하는 모터, 프린트기판, 케이블 등 고주파 기기는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소형화, 경량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EP가 많이 투입되고 있다.
자동차부품은 전동자동차 이전부터 금속을 EP 등 플래스틱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전동자동차는 EMI(전자방해) 대응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파수대는 100Ghz에서 10Ghz로 광범위하며 전동자동차는 더욱 넓은 범위에 대한 제어가 요구된다.
전자파는 자동차 제어기능에 영향을 미쳐 차단 기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화학기업들은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방지하기 위한 수지 및 솔루션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파를 흡수하는 PBT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
치수안정성, 강도 등 종합적인 성능 밸런스가 뛰어나고 우수한 성형가공성을 바탕으로 자동차부품에 많이 채용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파를 흡수하는 소재가 개발됨에 따라 금속을 이용한 전자파 차단이 불필요해져 경량화, 코스트 감축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C, 뛰어난 경량화 효과로 창유리 대체
자동차 창유리는 코스트 문제로 수지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저코스트화가 가능한 신규 프로세스가 개발됨에 따라 채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용 창유리는 규소가 주성분으로 강화유리 또는 중간막을 사용하는 겹유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볍고 형상자유도가 우수한 유기유리도 사용되고 있다.
유기유리는 유리와 같이 단단하고 투명한 플래스틱으로 유기유리를 채용한 창은 내후성, 내흠집성을 부여하기 위해 PC 창에 파워코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안전상 리어쿼터, 리어루프 등에만 투입되고 있다.
강화유리 등에 비해 높은 코스트도 채용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요타공업(Toyota Industries)은 코스트를 약 40% 절감함과 동시에 약 2배로 대형화할 수 있는 신규 PC 창 제조공법을 개발해 자동차 창의 수지화가 급진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범용인 압출성형 PC 평판을 신규 하드코팅제로 자외선(UV) 경화하는 방식이며, 신규 하드코팅제는 자동차용 창유리 법규 UN R43(Class M)에 적합한 내후성, 내흠집성 뿐만 아니라 내굴곡성 등도 보유하고 있어 PC 평판에 낮은 코스트로 하드코팅을 실시한 후 열성형‧가공해 투입하고 있다.
창유리는 앞으로 차체 경량화에 따라 부품이 감소하면서 대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창유리는 경량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공성이 우수해 경량화 강화유리, 겹유리와의 코스트 차이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도요타공업은 수율 개선, 리사이클 등 추가적인 코스트 절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는 수지화가 한정되고 있으나 일본은 유기유리 보급에 대응해 2021년 4월 자동차 창문용 안전유리 기술기준 JIS 마크를 개정함으로써 앞유리에 대한 유기유리 적용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유리는 중량이 장당 평균 10kg 이상이어서 경량화 효과가 매우 크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도 경량화가 필수적임에 따라 수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PE, 고무 대체소재로 수요 확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TPE(Thermoplastic Elastomer)는 고무와 플래스틱의 특징을 겸비한 기능성 소재로 가황공정이 불필요해 플래스틱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열안정성이 높아 가공범위가 넓고 소재를 조합한 복합소재를 만들 수 있는 특징도 있으며 경량화가 가능해 고무 대체소재로 런채널, 표피소재, 엔진 주변부품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TPE인 올레핀(Olefin)계 엘라스토머 TPO(Thermoplastic Olefin)는 단순혼합 타입과 고무성분을 부분‧완전가교 처리한 TPV(Thermoplastic Vulcanization)로 분류된다.
TPO는 비중이 가벼우며 가황고무에 비해 생산성, 경량화 효과가 뛰어나 도어, 창문 주변의 몰딩류, 에어백커버에 필수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에어백 장착률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미츠비시케미칼(Mitsubishi Chemical)을 비롯해 미쓰이케미칼(Mitsui Chemicals), 스미토모케미칼(Sumitomo Chemical) 등 일본 화학기업들은 해외생산 확대, 라인업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내장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 대시보드, 계기판을 TPO 소재로 덮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고급승용차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차에도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슬러시 성형에 대응하는 PVC 파우더, 진공성형에 대응하는 가교형 올레핀계 엘라스토머 등 수요처가 요구하는 다양한 사양에 대응하고 있다.
에어백 커버는 도장하지 않아도 외관 품질이 뛰어난 비가교 타입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폴리에스터(Polyester)계 엘라스토머 TPC(Thermoplastic Copolyester)는 내열성, 내유성, 기계적 강도 등을 겸비한 EP계 엘라스토머로 자동차 분야에서는 등속조인트(CVJ) 부츠, 에어덕트, 연료튜브 등에 투입되고 있다.
자율주행 보급으로 쾌적한 내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소음재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카메라, 밀리파레이더 방수‧방진용 등에 대한 채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스타이렌(Styrene)계 엘라스토머 TPS(Thermoplastic Styrene)는 컴파운드로 기어노브 커버, 에어백 커버 등 내장표피용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드럽고 성형가공성이 양호하며 내후성, 내열‧내한성 균형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느낌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P에 첨가하면 수지부품 제진성을 향상시켜 흡음효과를 얻을 수 있어 흡음용으로도 제안되고 있다.
열경화성수지, 엔진 주변부품 중심 금속 대체
열경화성 수지는 열을 가함으로써 3차원으로 가교한 분자구조를 생성하는 플래스틱으로 한번 가교하면 열을 다시 가해도 용해되지 않고 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내열성이 뛰어난 특징이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페놀수지(Phenolic Resin), 에폭시수지(Epoxy Resin), UPR(Unsaturated Polyester Resin),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엔진 주변을 시작으로 다양한 부위에서 금속을 대체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조합해 전동구동 시스템으로 제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페놀수지는 규사를 수지로 코팅하는 RCS(Resin Coated Sand)에 따라 고품질 주물을 생산할 수 있어 주물부품에도 투입되고 있다.
복합소재도 금속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화소재에 탄소섬유나 유리섬유를 이용해 수지를 함침시킨 CFRP는 주로 에폭시수지를 사용하나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서는 UPR 등 다른 열경화성 수지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MC(Sheet Molding Compound)는 자동차 외판과 난연성 시험을 통과해 배터리 박스에 채용되고 있으며 복잡한 형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탄소섬유, 제조코스트 감축이 적용 좌우
뛰어난 강도를 보유한 탄소섬유는 일본이 최초로 개발했으며 도레이(Toray), 테이진(Teijin), 미츠비시케미칼 등 일본 화학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탄소섬유를 이용한 CFRP는 일반적인 금속, 플래스틱 등 등방성을 보유한 소재와 달리 강도, 강성 등이 이방성을 나타냄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필요로 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 자동차부품을 대폭 경량화할 수 있어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대책을 추진하면서 탄소섬유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격이 높고 일반적인 금속, 플래스틱과는 다른 이방성 소재라는 점이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경주용 자동차를 비롯한 고급 차종에 채용되며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탄소섬유 생산기업들은 코스트 감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형 코스트가 보급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인 프리프레그를 이용하는 오토클레이브 성형, RTM(Resin Transfer Molding), SMC, 프리프레그를 프레스 성형하는 PCM(Prepreg Compression Molding) 등 다양한 성형방법을 실용화하고 있다.
열경화성 수지보다 성형 사이클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열가소성 수지인 CFRTP(Carbon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 활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열가소성 수지는 일반적으로 점도가 높아 탄소섬유에 깨끗하게 함침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혼합, 현장중합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해결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100% CFRP를 도입하기보다 금속, 플래스틱 등을 적절하게 조합해 사용하는 설계를 선호하고 있다.
다만, 온난화 대책에 따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저연비화 측면에서도 차체 경량화가 필수적임에 따라 CFRP를 활용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CFRP는 무게가 강판의 25% 수준으로 알루미늄 60%, 마그네슘은 50%보다 가벼우나 생산단가가 높아 적용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부직포, 차음‧흡음재로 채용 확대
부직포는 자동차산업이 발전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용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용은 천정표피용이 편물과 경쟁함에 따라 성장성이 둔화됐으나 경량화, 정숙성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펜더라이너, 언더커버에 차음‧흡음재로 투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LCP 멜트브로운(Meltblown) 부직포를 베이스로 생산된 도전성 부직포가 주목받고 있다.
구리, 니켈 등 금속으로 도금함으로써 전자파 차단 특성을 부여한 소재로 얇음에도 불구하고 차단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벨트 생산기업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교류발전기, 파워스티어링 등에 전달하는 구동벨트, 엔진의 흡기와 배기 타이밍을 조절하는 타이밍벨트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수용 벨트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전자식 파워스티어링(EPS),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파워 슬라이딩도어용 벨트 등을 신규 수요로 주목하고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 kyh@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