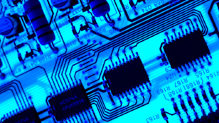암모니아‧SAF 프로젝트 급증 추세 … 정유‧화학 설비투자는 감소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본기업들이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엔지니어링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2030년 도입 목표를 정한 암모니아(Ammonia) 연료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3-2024년까지 사업타당성 조사(FS) 및 기본설계(FEED)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소 서플라이체인 구축, 메타네이션(Methanation) 등도 실용화 관련 움직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1년 지구온난화 계획을 개정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기 위해서는 수소‧암모니아, SAF, 메타네이션 실용화가 요구되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실증 후 실제 사업화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암모니아 연료와 SAF는 여러 탄소중립 수단 가운데 실용화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JERA와 IHI는 헤키난(Hekinan)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화력에 암모니아를 20% 혼소시키는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IHI와 미츠비시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ies)은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암모니아 혼소 발전 실증에 나서고 있다.
암모니아 연료 수요 확보가 천연가스 자원국의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다수 검토되고 있어 일본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2030년 300만톤 도입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SAF는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항공연료 중 10%, 170만킬로리터 상당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제트연료를 공급하는 정유기업들이 양산화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프로젝트가 기본설계 단계까지 진행됐고 2025년부터 EPC(설계‧조달‧시공)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료 확보가 과제이다.
바이오 자원을 사용하는 ATJ(Alcohol to Jet) 분야는 이미 국제적인 원료 쟁탈전이 확실시되고 있고, SAF 관련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며 엔지니어링기업의 수행능력이 저하되거나 석유정제 프로세스에 정통한 기술자 확보에 고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 엔지니어링기업들은 수소 서플라이체인 구축을 위해 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주로 싱가폴이나 네덜란드에서 MCH(Methyl Cyclohexane)를 활용해 역외 생산 수소를 도입하고 저장‧이용하는 내용이며 일본 주부(Chubu) 지역에서 도입‧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타네이션은 일본이 주도하는 기술이며 경제성이 우수한 이산화탄소(CO2) 순환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도시가스 생산기업들이 도시가스 혼입 목표를 설정하고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JFE Steel은 탄소중립형 고로 실현을 위한 유력 기술로 메타네이션을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 해상풍력발전 건설이 본격화되며 건설기업, 상사, 철강계 엔지니어링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다만, 주로 홋카이도(Hokkaido), 도호쿠(Tohoku) 등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송전선 정비 등 대규모 축전 시스템 정비가 요구된다.
엔지니어링기업들은 수요기업들의 탄소중립 기술 투자가 본격화될수록 기존 가스 & 오일 분야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신흥국은 석유‧가스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관련 투자 증가가 기대되나 일본과 같이 이미 성숙된 시장은 석유제품 수요 감소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유기업들은 석유정제 사업을 확대하는 대신 수소‧암모니아 수입과 SAF 생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대폭 전환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 역시 경쟁력 강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존 범용수지 사업을 축소하고 고기능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반도체, 전기자동차(EV) 관련 소재나 의약품 원제 등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화학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투자가 필수적이며 의약품 분야는 백신, 바이오 의약품, 재생의료 등 난도가 높은 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