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산업은 물류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화학물류는 화학 시장의 니즈 변화에 따라 온도 관리 및 BCP(사업계속계획),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대응 등 지금까지 이상으로 고도화된 선진적 서비스를 요구받고 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물류의 중요성은 혼란한 글로벌 정세와 경제 상황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다.
일본, 탱크터미널 공급부족 장기화
일본은 최근 몇년 동안 탱크터미널 가동률이 약 100%에 달해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설여력이 부족하며 소방법 규제로 나지 확보 및 막대한 초기투자가 필요해 신규 입지 확보가 어려워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탱크터미널 운영기업은 유조선과 ISO 탱크 컨테이너 등을 통해 해상으로부터 원유, 윤활유, 액체 화학제품 등을 수용해 탱크에 보관하고 탱크로리와 탱크컨테이너 등을 활용해 육상으로 출하하거나 역으로 육상에서 해상으로 수출하며 추가로 본선하역, 드럼 충진 등 부대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탱크설비 뿐만 아니라 잔교, 창고, 이액, 가온, 충진에 필요한 설비를 탱크 야드에 건설한다.
저장탱크에 대한 고품질 니즈로 설비 갱신 시 유지보수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SUS)제로 교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화 탱크를 폐기·대체하거나 버스 개조, 창고 증설 등 중장기 기반 정비를 위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으나 재료비 급등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화학제품 다품종 소량 생산화되고 유조선이 대형화됨에 따라 착안 가능한 잔교가 제한돼 탱크 컨테이너를 활용한 운송이 증가했고 탱크 컨테이너의 화학제품을 탱크로리 및 IBC(중형용기), 드럼통 등으로 옮겨 넣을 수 있는 MWS(멀티 워크 스테이션)를 갖추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운송품목이 고부가가치화되면서 분석 업무 빈도가 증가해 자체 또는 외부위탁을 통해 탱크야드 내부에 분석실을 도입하는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 현장 분석으로 효율화를 꾀하고 운송업자의 대기시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평가된다.
CTT(Central Tank Terminal)는 2023년 2월 소지츠(Sojitz)의 100% 자회사 Tokyo Yuso를 인수해 총 보관능력을 Tokyo Yuso가 보유한 67기의 저장탱크(6만1809킬로리터) 포함 38만7583킬로리터로 확대했으며 가와사키(Kawasaki) 지구에만 14만킬로리터를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위험물 육상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Chemicals Transport도 탱크터미널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치바현(Chiba) 가토리(Katori) 사업장의 주차장 및 유휴 공간 약 3300평방미터에 SUS 탱크 7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200킬로리터 3기, 100킬로리터 4기를 도입하고 가온 및 세정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ISO 탱크 컨테이너, 글로벌 유통량 80만기 돌파
ISO 탱크 컨테이너는 글로벌 물류 스탠다드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ISO 탱크 컨테이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을 준수하는 액체운송용 탱크 컨테이너로 해상, 트럭, 철도 등 다양한 운송 수단에 대응하고 있다.
일반 화물은 물론 위험물도 운송 가능하며 화학제품, 음료 등 액체 화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 스탠다드로 빠르게 보급이 확대돼 전세계 유통량이 80만기를 돌파했고 다른 운송 수단들이 ISO 탱크 컨테이너로 교체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ISO 탱크 컨테이너는 경제성과 편리성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액체 화물 글로벌 표준용기이며 안전성까지 겸비해 품질 유지 성능도 우수한 편이다.
내부 세정을 통해 장기간 반복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기에 내용물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컨테이너선, 트럭, 철도 등 운송 수단과 조합해 도어투도어(Door to Door)로 목적지에 복합 일관운송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20-26킬로리터 컨테이너가 주력이며 대량 운송용 유조선, 탱크로리, 드럼통을 비롯한 다른 운송용기와 역할을 분담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서로 다른 액체를 동시에 운송 가능한 2층 타입, 자동세정 타입, 라이닝 타입, 내면 특수 페인트 타입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특수 타입도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심냉액화가스 운송용도 투입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탱크 컨테이너를 활용한 운송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운송물을 탑재한 탱크를 보관, 가온하거나 드럼통 및 탱크로리로 화물을 옮기거나 세정, 유지보수 등을 위한 부대설비를 정비·확충하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어 탱크로리 대체 등 추가적인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글로벌 탱크컨테이너협회(ITCO)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 기준 전세계 유통량은 80만1800기로 전년대비 8.7% 늘어 11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탱크 컨테이너 메이저는 China International Marine Containers(CIMC), Nantong Tank Container(NT Tank) 등 중국기업이 1, 2위로 평가되며 2022년 상반기에 생산이 주문을 따라가지 못해 범용 타입은 6개월 이상, 특수 타입은 1년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현재는 지연이 해소된 상태이다.
IBC, 다양한 운송 니즈 흡수해 수요 증가
IBC(중형용기)는 다양화되는 운송 니즈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IBC는 액체화학제품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드럼통보다 대용량이면서 탱크로리, ISO 탱크 컨테이너 대비 소량을 원하는 운송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또 핸들링이 용이하다는 특성이 호평받아 식품, 의약품, 화장품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IBC 시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수입 화학제품용 보관용기, 탱크로리 하역변경, 안전면을 고려한 포터블 탱크 대체 등 화주기업의 BCP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IBC는 액체·분말을 3000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일본은 드럼통 5개분, ISO 탱크 컨테이너의 약 20분의 1인 1000리터 타입이 주류를 이루어 중용량 운송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소방령 개정에 따라 1995년부터 IBC를 도입했으며 드럼통 및 탱크로리로부터 용량에 맞추어 하역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을 살려 시장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소방령 개정에 따라 1995년부터 IBC를 도입했으며 드럼통 및 탱크로리로부터 용량에 맞추어 하역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을 살려 시장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MWS에서 IBC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컴플렉스 정기보수 기간 동안 내용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IBC는 SUS제 금속과 HDPE(High-Density Polyethylene)제 중공성형 타입이 있다. 금속 타입은 내수용으로 공장을 왕복하는 용기 등으로 유통되고, HDPE 타입은 수출 중심으로 편도용으로 사용되나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한 IBC를 수거해 리사이클하는 노력도 정착되고 있다.
니즈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량·저배 타입 및 가온·보온·가압, 교반기 등 기능을 부여한 특수 그레이드 및 내부를 연마한 타입이 속속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부하 저감을 고려한 내부세정이 필요 없는 왕복 용기 수요가 증가하거나 드럼통을 IBC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럼통, 코로나19 무관하게 출하량 감소…
드럼통은 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원유·윤활유, 페인트, 식료품 등 광범위한 산업계에서 정석적인 물류용기로 정착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화학제품 운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200리터 신규 드럼통 출하량이 1400만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영향을 미쳐 감소했다. 2021년 들어 일시적으로 회복했으나 내수 물동량이 감소한 2022년에는 2020년 수준으로 다시 감소했다.
일본드럼통공업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신규 200리터 드럼통 출하량은 601만5282개로 전년동기대비12.7% 감소했으며 2022년부터 이어진 반도체 부족 사태가 제조업 회복을 저해해 화학 용도 포함 10%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중량 기준 생산량은 15만5148톤으로 12.5% 감소했으며 판매량도 15만5144톤으로 소폭 줄었다.
화학용은 전체 출하량 가운데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466만4021개로 12.6%, 원유용은 89만6007개로 12.5%, 페인트용은 29만3979개로 14.7%, 식료품용은 9만1738개로 17.3%, 기타 6만9678개로 6.8% 감소했다.
판두께 1.2밀리미터 타입이 369만8000톤으로 15.6%, 1.2×1.0밀리미터 타입이 213만9244개로 7.1%, 1.0밀리미터 타입이 9만4150개로 5.0%, 1.0×0.9밀리미터 타입이 5만3369개로 23.4%, 1.6밀리미터 타입이 3만660개로 19.1% 줄었다.
2022년 강철 드럼통 생산량은 984만개로 6.1% 감소했다
강철 드럼통은 사용한 신제품을 수거해 내부 세척과 재생처리를 거쳐 재이용하는 재생 드럼통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사용률은 58.4%로 집계됐으나 환경보호용 드럼캔을 제외하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비율은 실질 100%에 달해 3R(Reduce·Reuse·Recylce) 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평가된다.
플렉서블 컨테이너는 화학공업용 생산 증가
플렉서블(Flexible) 컨테이너는 유연한 소재로 만드는 자루형 물류자재로 과립형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하는데 적합하며, 특히 합성수지 및 화학공업제품 분야에서 탄탄한 수요를 자랑한다.
플렉서블 컨테이너는 1회 또는 수회, 최대 1년 사용 가능한 크로스용과 반복 사용하는 러닝용으로 구분되며 러닝용은 반복해서 사용하기 위한 매듭부 및 주입·배출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돼 있다.
일본은 대부분 크로스용 플렉서블 컨테이너를 수입하며 아시아 각국에서 생산된 것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크로스용은 PP(Polypropylene), PE(Polyethylene)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플렉서블 컨테이너 수입량은 3044만3601개로 3.8% 감소했다. 중국산이 2193만8920개로 850만개 감소했고 인도네시아산, 타이산 등도 줄었으며 중국에 이어 점유율 2위인 베트남은 730만3923개로 소폭 증가했다.
수입액은 224억8571만엔으로 3.8% 감소했고, 평균가격은 738.6엔으로 1엔 하락해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본 플렉서블공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내수 생산량은 러닝용이 27만5886개로 1.0% 감소했고 크로스용은 304만5698개로 9.0% 증가헀다.
러닝용 가운데 주력인 EVA(Ethylene Vinyl Acetate), PVC(Polyvinyl Chloride) 등 플래스틱제가 26만8750개로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고무제는 7136개로 32.0% 급감했다.
러닝용 판매액은 주력 용도인 플래스틱용이 증가했으나 화학공업, 세라믹·토석, 사료, 식품, 제염용 등이 감소한 결과 58억6133만엔으로 5.0% 증가했으며, 크로스용은 모든 용도에서 확대돼 81억4802만9000엔으로 16.0% 급증했다. (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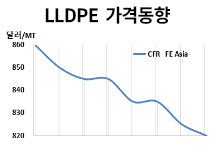


















 일본은 소방령 개정에 따라 1995년부터 IBC를 도입했으며 드럼통 및 탱크로리로부터 용량에 맞추어 하역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을 살려 시장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소방령 개정에 따라 1995년부터 IBC를 도입했으며 드럼통 및 탱크로리로부터 용량에 맞추어 하역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을 살려 시장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