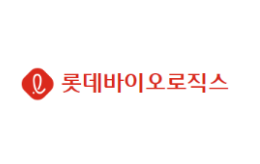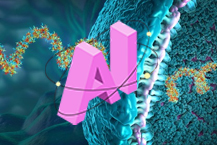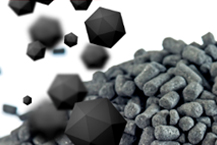|
필름용 LLDPE 과잉생산으로 수익성 하락 … 특수용 진입 필요
국내 메탈로센(Metallocene) 시장은 고부가화가 요구되고 있다.
LG화학은 1999년 독자적으로 메탈로센 촉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2008년 고무와 플래스틱의 특성을 겸비한 엘라스토머(Elastomer)를 생산하는데 성공했으며 대산 소재 메탈로센계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6만톤 플랜트를 가동했다.
대림산업도 메탈로센계 LLDPE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화케미칼 역시 2015년 하반기에 여수 LLDPE 35만5000톤 플랜트 3개 라인 중 1개를 메탈로센 병산용으로 전환했다.
SK종합화학은 2014년 12월 메탈로센 촉매를 기반으로 전 과정을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기능성 PE 「넥슬렌」 23만톤을 상업화했다.
PE에 이어 PP(Polypropylene)도 폴리미래가 2010년 1월 메탈로센 제조공법을 채용해 상업화하는데 성공했다.
LG화학도 2015년 11월 메탈로센계 PP를 섬유용에 본격적으로 적용해 보온성과 속건성이 뛰어난 기능성 의류용 적용에 주력할 방침이다.
폴리미래는 고급마스크, 공업용 필터, 투명용기, 유아용 젖병 용도로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메탈로센 폴리머는 생산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고급 그레이드에서 범용 그레이드로 전락하고 있어 고부가화 전환이 시급해지고 있다.
메탈로센 촉매기술은 Dow Chemical, ExxonMobil이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특허가 2011년 만료돼 기술 진입장벽이 낮아짐으로써 범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메탈로센계 LLDPE는 대부분 식품포장용으로 저가제품에만 공급되고 있어 기존 LLDPE와의 가격 차이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메탈로센계는 기존 폴리머에 비해 톤당 200-300달러 높은 가격에 거래돼 수익성이 보장됐으나 범용화 추세에 따라 스프레드가 100-150달러 수준으로 좁혀졌다.
국내기업들은 식품포장용 등 주로 필름용에 적용 가능한 메탈로센계 LLDPE 생산에 집중함으로써 고부가제품으로 평가되는 점·접착제 등 저분자 활용 분야에는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ow Chemical, ExxonMobil 등 메탈로센 촉매를 개발한 메이저들은 다양한 메탈로센계 폴리올레핀(Polyolefin)을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응용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메탈로센계 폴리올레핀은 접착력, 무취, 저온저항성, 색상 등이 우수해 기저귀, 생리대 등 위생용 핫멜트(Hot Melt) 점·접착제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생용 핫멜트 접착제의 원료로는 EVA(Ethylene Vinyl Acetate), PAO (Polyalphaolefin), EEA(Ethylene Ethyl Acetate)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점착제는 SIS(Styrene Isoprene Styrene), SBS(Styrene Butadiene Styrene), SEBS(Styrene Ethylene Butadiene Styrene) 등 엘라스토머를 주로 채용하고 있다.
Dow Chemical은 에틸렌(Ethylene)과 옥텐(Octene)을 혼합해 상업화했으며, ExxonMonil과 Clariant는 에틸렌과 프로필렌(Propylene)을 혼합했고, Idemitsu Kosan은 프로필렌으로만 핫멜트 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다.
LG화학, 대림산업 등 국내기업들도 점·접착제용 개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기술이 부족해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LG화학, 대림산업 등도 충분히 메탈로센계 올레핀 연구에 집중해 특수용 그레이드를 상업화할 수 있으나 시장이 작고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연구개발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점·접착제용 등 특수용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가격 차이가 기존 메탈로센과 10-15% 수준에 그치고 시장규모도 작아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다.
메탈로센계 폴리올레핀은 PE에 이어 PP까지도 중국, 일본, 중동 등이 생산이 확대되면서 희소성을 상실해 고부가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6년 4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