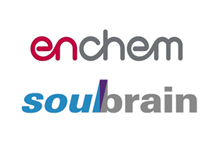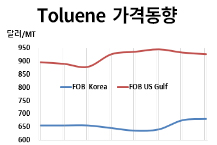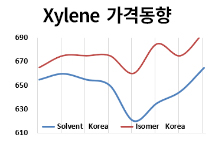일본은 사망사고 원인 중 1위가 교통사고, 2위가 화재사고로 동북지방 대지진을 제외하면 연평균 약 2000명이 화재로 사망하고 있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로, 희생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와 유아로 가연물을 난연화함으로써 화재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플래스틱은 열을 가하면 녹으면서 타고 연소(延燒) 면적이 늘어나면서 화재가 퍼지기 때문에 난연화를 통해 연소면적 확대 및 화제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난연화는 소재, 장치 등을 잘 타지 않게 억제함으로써 착화한 소재 자체의 연소를 지연시켜 대피할 시간을 벌게 하고 다른 소재로 번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어 기술적 보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난연화, 연소 연쇄반응 단절기술이 중요
가연물질은 목재부터 난연화가 이루어졌으며 기원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대 들어서는 난연화와 섬유가 동일한 역사를 걸어왔으며 섬유는 1786년 프랑스 극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난연화되기 시작했다.
18세기에는 프랑스 화학자인 루이 조제프 게뤼사크가 극장 무대막을 난연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면서 황산암모늄(Ammonium Sulfate)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발견했으며, 20세기에는 미국 공군이 안티몬(Antimony)과 염소화파라핀(Chlorinated Paraffin)의 조합을 발견해 나일론(Nylon)에 응용했다.
나일론의 난연화는 난연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브롬계 난연제와 산화안티몬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이어졌다.
가연물질의 연소 메커니즘은 연소 장소를 중심으로 연쇄반응이 발생함으로써 형성된다.
폴리머에 접근한 불은 주위의 산소를 소비함과 동시에 폴리머 표면에 복사열을 전달하고 내부까지 열을 보내 폴리머를 분해한다. 이후 폴리머 분해물이 기상 속으로 분산해 폴리머에 접근한 불에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연소 장소가 형성되고 연쇄반응이 지속돼 연소가 확산된다.
이에 따라 연쇄반응을 단절함으로써 연소 유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화재예방 조치로 필수적인 폴리머 난연화는 래디컬 트랩(Radical Trap), 탄소층 형성, 흡열·희석에 따른 난연 구조가 대표적이며 각각 연쇄반응을 단절하는 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난연 효과가 가장 뛰어난 브롬계 난연제와 산화안티몬의 병용은 래디컬 트랩과 흡열·희석에 따른 난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난연성 소재 관련 규격 속속 등장
난연성 소재는 CCM(Cone Calorimeter), LOI(Limiting Oxygen Index), UL-94 등으로 난연성 시험을 실시한 후 규격을 실현하는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선케이블은 전력 송·배전을 목적으로 건축물, Utility Corridor 등 밀폐공간에 주로 채용됨에 따라 비 할로겐화(Non-Halogen)가 가속화되고 있다.
할로겐계 난연제는 연기 발생량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비 할로겐계 난연제는 연기 발생량이 적기 때문이다.
아울러 ISO는 건축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유기소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ISO5660 Part1을 규정하고 있다.
ISO5660 Part1은 CCM을 이용한 발열량 시험을 통해 불연, 준불연, 난연소재로 분류하며 연소시험 시간에 따라 연소하지 않는 것, 변형·용융·균열이 없는 것, 유해한 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능평가기관은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을 명시해야 하며, 일본은 일본건축센터, 건자재시험센터, Better Living(츠쿠바건축시험센터), 도쿄 소방청 소방과학연구소, 홋카이도 한랭지주택도시연구소 등을 방화소재시험이 가능한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은 1956년 전기철도에서 발생한 열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철도차량에 대한 화재를 규정하기 시작했으며, 1968년 지하철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하자 1969년 현행 규제의 골격인 「열차 화재사고 대책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난연성 규격과 시험방법은 차량 내에 연료 등의 화재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소재의 자기진화성, 연소방지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철도차량은 객실 천장의 외판·내장, 객실 외판, 바닥재, 차양·장막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난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은 철도차량용 비금속 소재를 대상으로 연소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도차량용 소재의 연소성 규격」에 따라 불연성, 극난연성, 난연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동차용 소재는 미국의 FMVSS302와 JISD1201을 참고해 마련한 「내장소재의 난연성 기술 기준」이 있다.
화재 발생 시 운전자 등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소재에 착화한 후 화재가 전파되는 속도를 평가하는 섬유소재 시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SOLAS)」 조약의 Ⅱ-2장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객선과 500톤 이상의 화물선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SOLAS 조약을 감안한 선박방화행동규칙, 선박소화설비규칙 등을 적용하고 있다.

난연제, 안전성에 상응하게 규제해야…
난연성 수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WEEE)로 대표되는 유럽연합(EU) 지령, 환경라벨인증기관인 블루엔젤(Blue-Angel), 노르딕 스완(Nordic Swan)을 통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규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 브롬계 난연소재 뿐만 아니라 할로겐계 난연제도 안전성 확인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난연 효과, 리사이클 시의 물성 유지성 등이 뛰어남에 따라 환경성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환경마크인 에코라벨(Eco Label)은 PC, 노트북에 TBBPA(Tetrabromobisphenol-A)를 포함한 브롬계 난연제를 대부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브롬계 난연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등 특정 브롬계 난연제에 대한 법, 라벨 규제는 유럽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바젤 협약에 따른 각국의 할로겐계 난연제에 관한 취급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으며, 브롬계 난연제는 대부분 발암성 우려가 있는 산화안티몬과 병용되고 있는 등 마이너스 요인도 두드러지고 있다.
인계 난연제는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GHS(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기준) 등이 안전성을 확인해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용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미국은 전자제품 환경성 평가 시스템(EPEAT) 제도를 발령해 연방정부기관에게 EPEAT 등록제품 구입비율을 95%로 향상시킬 것을 대통령령으로 요구하고 있다.
필수항목과 옵션항목으로 분류되며, 옵션항목은 리사이클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채용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자기기는 수지 난연화가 필요한 부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스트림 대상으로 환경 안전성 강조해야…
일본은 난연성 소재도 화학산업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난연제 소재인 브롬과 인은 수입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생산하는 등 외부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브롬은 함수호에서 채취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함수호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브롬과 함께 사용하는 안티몬도 채취장소가 한정적이고 채취국가에 따른 관세 리스크가 있으며, 인은 채취장소가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난연제용보다 비료용으로 전략적이면서 거대한 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 수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난연제 생산기업은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관세, 생산량 제한, 기술 유출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첨단기업이 실행하고 있는 「물건(物)→사실(事)」 개념으로, 「물건을 만드는 공정」과 「사실로 매우는 공간」의 융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D프린터는 「사실」인 도면을 토대로 「물건」인 Article을 만드는 것으로, Article보다는 도면의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D프린터는 「물건」과 「사실」을 융합하는 수단이며 「사실」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건」인 난연성 소재도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위해 「사실」에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난연성 소재에서 「물건」은 난연제와 난연화한 소재, 「사실」은 규격, 난연제 설계, 제조 노하우 등이며, 융합은 서비스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는 기존과 같은 코스트 대비 효율성, 기술·안전정보가 아니라 기술 메커니즘에 따라 난연제 설계지침, 자원을 포함한 안전지침, 브랜드화된 품질과 가격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브랜드화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난연제에 대한 정보는 원래 난연제 A를 수지 B에 C% 첨가함으로써 UL-94 규격의 V-0를 획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새로운 서비스는 최종제품, 즉 다운스트림산업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동성, 금형 전사성 등 해당제품 제조공정 상의 물성과 환경 안전성, 외관 등 부대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난연소재, 고부가화로 우위성 확립해야…
일본은 뛰어난 난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난연성 수지 시장에서 우위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발연성과 안전성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전선케이블 분야에서 저발연화에 착수해 상품화하고 있다.
저발연화는 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 상황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가스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밀폐공간인 차량, 선박 및 내부기기에 확대 이용함으로써 많은 인명을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화재사고에서는 시야 불량, 흡인가스에 따른 사망이 무려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발연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코스트 양립이 필요하며, 소재와 설계 양면을 고려한 접근, 효율적인 공간 설계를 통해 전체 코스트를 억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여러 국가의 안전기준을 망라하고 있어 난연성 소재의 환경 안전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출이 중심이어서 EU, 미국 등의 규격과 라벨, 국가간 협약 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화할 수 있는 설계 및 제조기술을 개발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난연성 소재 시장과 기술 우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난연은 상세한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연소, 화학반응 등 과학적 지식을 집적해 이론을 구축하고 메커니즘을 해석해 브랜드화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난연성 소재는 화재학에 대한 효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품구조 내부의 소재 간 공간연소 거리 등은 규격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제품의 배치 공간, 연소 거동 해석을 통해 부여되는 난연성 종류 등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부적인 공간 설계를 통해 적절한 난연성을 제안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 기반을 구축해 공유화함으로써 난연성 소재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료 공급은 물론 규격·규제도 주도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 전기, 전자, 자동차를 공급하고 있으나 규격과 규제는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규격과 규제는 무역장벽이자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탄소섬유 생산량이 세계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탄소섬유를 이용한 항공기용 소재의 난연성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원료 생산국이 아니라 소재의 특성을 파악한 후 관련성 있는 규격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단순히 기술 수출에서 벗어나 라벨, 규격, 규제를 구축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표, 그래프 : <전선케이블의 난연 규격><ISO5660 part1><비 할로겐 및 저발연성 난연 케이블의 규격><전자제품의 난연성 소재 규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