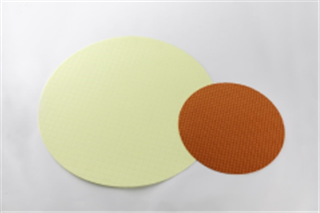LG화학(대표 박진수)이 LG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하면서 바이오 사업 투자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LG생명과학은 백신을 상업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미래 사업으로 바이오시밀러(Biosimilar)에 투자하고 있다.
LG화학은 2017년 레드바이오 R&D(연구개발)에 LG생명과학이 투자했던 약 800억-900억원보다 많은 2000억원, 2021년에는 3000억원, 2025년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LG생명과학은 2012년 일본 Mochida와 제휴해 「휴미라」,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등의 상업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 임상3상을 시행하고 있어 2018-2019년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R&D가 진척되면 2017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기술 수출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휴미라, 엔브렐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6-2017년 상업화하면 시장진입이 늦어 선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oehringer Ingelheim, Novartis, Amgen 등 글로벌 메이저들도 허가 및 승인을 신청하고 있어 가장 뒤늦게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G생명과학은 경쟁이 치열한 미국 및 유럽시장보다는 국내 및 일본시장을 선점할 계획이지만 국내시장이 미미하고 일본시장도 Amgen이 Daiichi Sankyo와 휴미라 등 바이오시밀러 상업화 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태이다.
LG화학은 LG생명과학을 인수함과 동시에 바이오시밀러 투자를 계속한다고 밝혔으며 휴미라 국내 임상 및 시설투자에만 200억원 수준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수백억원을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2017-2018년 상업화가 집중됨에 따라 공급과잉이 심각해지거나 후발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LG화학은 바이오시밀러 투자 여부를 고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생산까지 수직계열화하면 수조원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으로 삼성은 규모화를 위해 바이오리액터(Bio-Reactor) 3만리터 1공장, 15만리터 2공장 등 총 18만리터를 가동함으로써 세계 3위의 생산능력을 확보했으며, 2020년까지 제3공장 15만리터, 제4공장 15만리터를 추가 증설할 예정이다. 셀트리온도 자체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반면, LG생명과학은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위탁생산에 의존함에 따라 코스트 경쟁력에서 뒤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결국 코스트 경쟁력이 시장을 선점하는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장이 형성돼 안착되면 원료의약품 위탁생산을 장악하고 있는 인디아, 중국이 진입해 치킨게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LG생명과학은 레드바이오 사업으로 백신 사업에 주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G생명과학은 백신 사업에서 유니세프 918억원의 수주 입찰에 성공하며 5가 액상혼합백신 「유펜타」를 공급하고 있으며 B형 간염백신 「유박스」는 UN기구 입찰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다.
LG생명과학은 B형간염, 뇌수막염 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니세프에 연간 수요의 50% 이상을 공급해왔으며 6가 혼합백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매출비중은 미용필러 등 미용성형 소재 사업이 11%를 차지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뇨치료제, 성장호르몬제가 뒤를 잇고 있다.
LG생명과학은 백신, 바이오의약,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바이오시밀러 R&D에만 주력해 기존 R&D가 지연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LG화학, LG생활건강 등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미용성형제품, 화장품 원료, 농화학 관련제품 등 연구를 선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허웅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