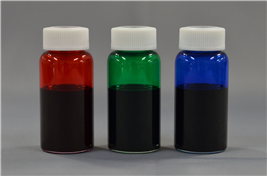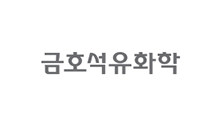글로벌 희토류 시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마찰 심화에 따라 희토류를 통상보복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잠재적 파괴력이 주목된다.
중국은 5월21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중국의 미국 무역협상단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함께 희토류 시설을 시찰함으로써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의 희토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동중국해에서 일본명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두고 일본과 갈등이 심화됐을 때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희토류는 전자제품, 하이브리드자동차(HV),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광물로 첨단기술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이며 미국은 전체 희토류 수입의 67% 정도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희토류 의존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0%에 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중국은 2018년 희토류 12만톤을 채굴해 세계 생산량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전체 희토류 수출 가운데 30%를 차지했다.
희토류는 상호의존도가 높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비껴간 품목이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필요에 따라 중국산 희토류에는 25%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희토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량의 9%를 차지해 3위에 올라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2018년 희토류 생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가 2만톤으로 글로벌 생산량의 12%, 미국은 1만5000톤으로 9%, 미얀마가 5000톤으로 3%, 인디아가 1800톤으로 1.1%를 차지했다.
매장량도 중국이 4400만톤으로 세계 전체의 37.9%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과 베트남이 각각 2200만톤으로 18.9%를 점유하며 뒤를 이었고 러시아가 1200만톤으로 10.3%, 인디아가 690만톤으로 5.9%, 오스트레일리아가 340만톤으로 2.9%, 미국이 140만톤으로 1.2%에 달했다.
선진국들은 환경문제 때문에 희토류 생산을 꺼려하고 있다.
다른 광물과 뒤섞여 채굴 후 별도의 추출과 가공 비용이 필요하고 광산에 대한 환경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중국의 주요 희토류 생산기업들은 미국과의 거래가 제한되더라도 매출의 90%가 자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EV) 시장 성장을 타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희토류는 한때 중국이 세계 각국과 자원전쟁을 벌일 정도로 공급이 부족했으며 현재도 생산 및 공급 면에서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나 수요비중이 크게 변화하며 시장 성장세 자체는 안정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자원시장 조사기관 Argus는 글로벌 희토류 시장의 변화에 EV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EV 투입 용도를 중심으로 자석용 희토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rgus에 따르면, 글로벌 희토류 수요는 2018년 약 16만5000톤으로 수요증가율이 연평균 3%에 달했다.
매장량은 중국이 세계의 40% 정도를 차지해 시장점유율 10%대의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등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중국의 생산이 세계시장을 좌우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은 희토류 생산이 최근 3년 동안 거의 정체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여러 희토류 생산기업들의 불법조업과 환경대응을 문제시하며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특정 메이저 중심의 생산체제가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생산량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메이저들이 2021년까지 생산량을 수만톤 감축할 예정이어서 총 14만톤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달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은 신규 프로젝트를 여러 건 준비하고 있다.
희토류는 현재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비량과 시장가치가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에는 유리 연마 등에 사용하는 세륨(Cerium)과 란타넘(Lanthanum) 2종이 전체 소비량의 각각 35%, 30%를 차지했으나 시장가치는 4%, 6%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구자석에 사용하는 네오디뮴(Neodymium)과 디스프로슘(Dysprosium)은 소비량이 18%, 1%로 소량이지만 시장가치는 49%, 1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석용 희토류의 시장가치가 높기 때문으로, 소비량이 4%라면 시장가치는 약 65%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의 흐름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자석용 희토류를 목적생산하는 기술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태로, 가볍고 가치가 낮은 세륨과 란타넘을 병산할 수밖에 없어 생산량이 한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자석용 희토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기술혁신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요타자동차(Toyota Motor)는 고가의 네오디뮴을 저렴한 세륨, 란타넘으로 대체하며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네오디뮴 절약형 내열자석을 개발해 실용화되면 희토류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