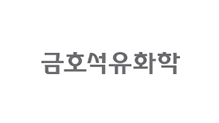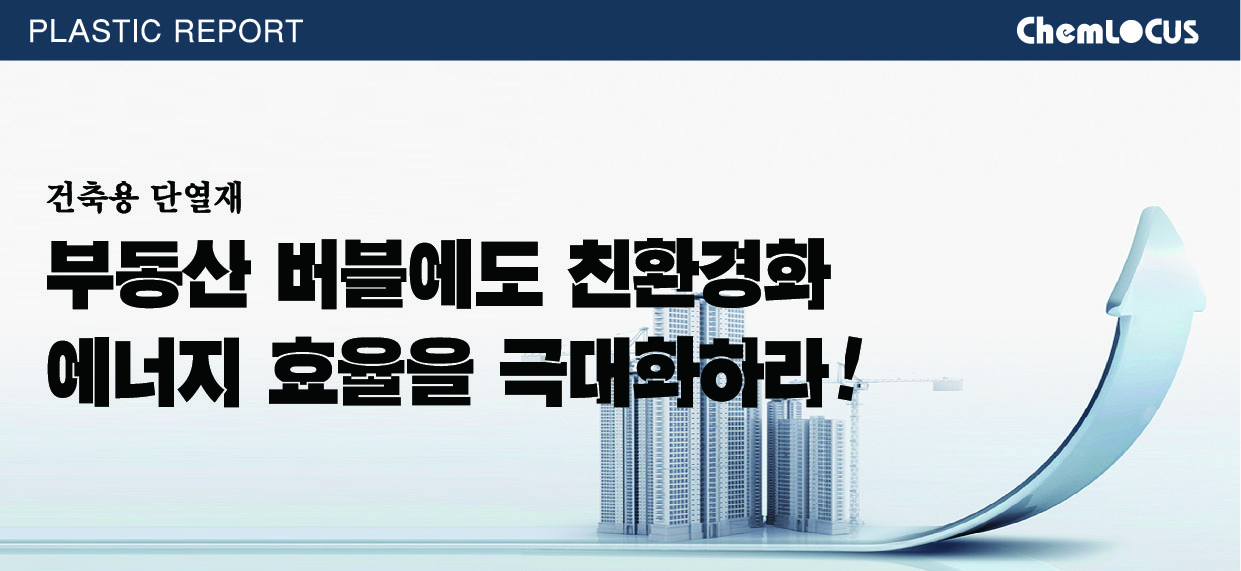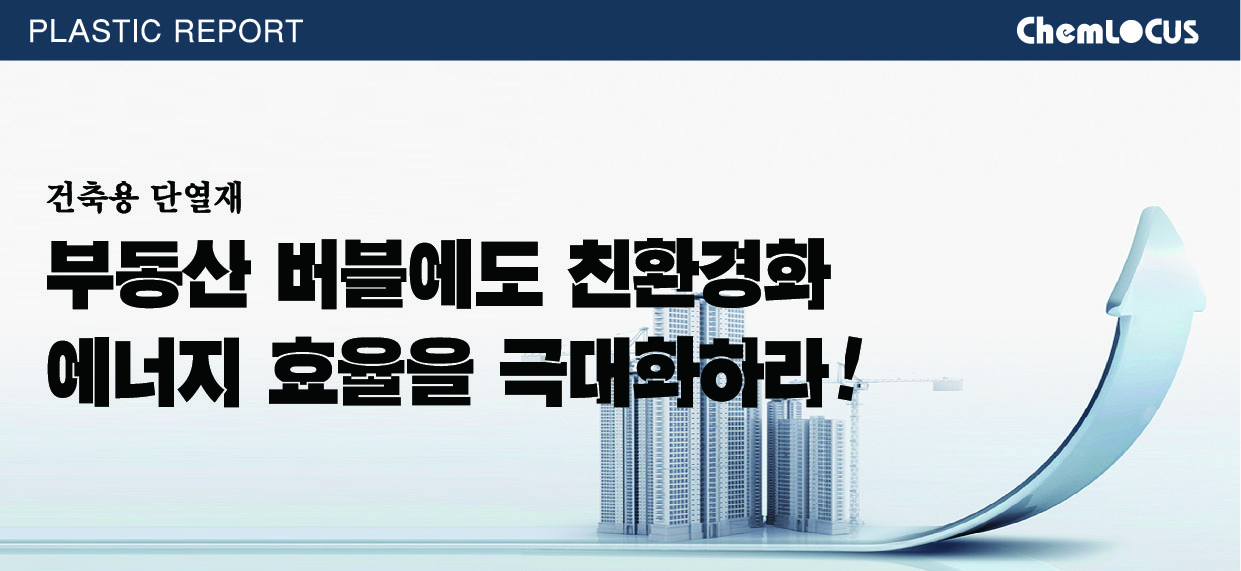
한국과 일본 모두 주택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국은 부동산 버블이 가라앉으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축경기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본은 신축 주택 착공건수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감소하고 있다.
특히, 건축 관련 서플라이체인 혼란이 심화되고 건축자재 가격이 급등해 건설공사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신축 주택 착공건수가 2020년 크게 위축됐고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경제활동 회복과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1년 회복 징후를 나타냈으나 2022년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으로 폭등하면서 건축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ZEH, 지구온난화 해결 수단으로 부상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SDGs(지속가능개발 목표)에 따라 주택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SDGs의 목표인 지구온난화나 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ZEH(Net Zero Energy House) 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2022년 지구온난화의 최대 원인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제로로 감축하는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건축물에너지절약법을 개정했다.
사무실 건물 등 비주택 신축 건물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단열성 등 에너지 절약기준을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부터 신축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로 확대하며 2030년 ZEH 및 ZEB(Net Zero Energy Building)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ZEH 주택은 단열‧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태양광발전 등을 도입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1차 소비 에너지를 차감했을 때 제로 이하가 되어야 하며 앞으로 표준주택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건설기업은 ZEH 기준에 적합한 주택 공급체제를 마련해야 하고, 공공기관도 ZEH 보급에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단열재 등의 소재 조합에 따라 설계상으로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ZEH 기준에 적합한 문, 창문, 단열재, 설비 조합 등 종합적인 공법이 중요해지고 있다.
리폼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노후‧파손된 부분 교체 외에도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공법 수요가 늘었으며 ZEH에 적합한 단열재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주택시장 위축에 대응해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수준 상향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건축자재‧주택설비산업협회는 에너지 절약, 자원형 건축자재 절약, 주택설비(그린 건축자재) 보급을 위해 경제산업성의 위탁사업으로 단열 페인트의 햇빛 흡수량 측정법이나 온수 비데의 성능 평가방법 등에 대해 ISO나 IEC 등 국제표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단열재,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성 순풍
단열재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가 건물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고 주거 쾌적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6월 에너지 절약 관련법안 성립에 따라 2025년 이후 건설하는 주택‧비주택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성이 의무화돼 단열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성능 표시제도의 단열을 포함한 성능 등급은 기존 최고등급이 4등급이었으나 2022년 4월 5등급, 10월에는 6과 7등급이 추가되고 주택 건설기업에서 고단열 주택을 제안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단열재는 주거 공간의 쾌적성 유지와 함께 냉난방 설비 가동 부하 경감에 따른 에너지 절약 효과나 절전 효과는 물론 거주자의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히트 쇼크 사망 리스크를 줄이고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단열재는 글라스울(Glass Wool), 미네랄울(Mineral Wool) 등 무기섬유계를 중심으로 경질 우레탄(Urethane)이나 XPS(Extruded Polystyrene), 발포 페놀(Phenol), 비드법 발포 PS(Polystyrene) 등 발포수지계와 셀룰로스(Cellulose)계, 양모계가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6-7등급의 고단열 대응을 위해 추가 단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단열재 생산기업들의 협업체제가 활발해지고 있다.
Asahi Fiber Glass, Asahi Kasei Construction Materials, Paramount Glass 등 아킬레스와 셀룰로스 단열재, XPS 생산기업 등이 고단열 사용 사례를 내세우는 등 연계를 통해 기존 주택을 포함 주택 전체의 고단열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건축법 개정으로 심재도 준불연화
국내에서는 국토부의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심재 준불연 관련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3년 2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고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함께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단열재 등 건축물 마감 소재는 외부 표면 뿐만 아니라 내부에 해당하는 심재 소재까지 준불연 이상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폴리텍은 친환경 심재 준불연 PIR(Polyisocyanurate) 단열재 NF Board Plus에 주력하고 있다.
NF Board Plus는 표면재를 특허 소재인 NF FELT로 처리해 기존 우레탄(Urethane)의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난연성을 높이고 유독가스 발생량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상온 액상형 고함량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베이스 폴리에스터 폴리올(Polyester Polyol)을 도입한 NF Board 원료 합성 기술로 무수프탈산(Phathalic Anhydride) 베이스 폴리올(Polyol) 대비 난연성능이 뛰어나고 삼량화 비율이 매우 높아 PIR화에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OCI, 진공단열재 VIP로 에너지 효율 제고
OCI는 진공단열재(Vacuum Insulation Panel: VIP)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VIP는 외피재와 심재로 구성되며, 심재가 단열재의 핵심으로 섭씨 1000도 열을 가해도 타지 않고 그을음만 새기며 유독가스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는 1200도 이상에도 견뎌낼 수 있어 화재에 안전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다.
OCI가 생산하는 진공단열재는 단열재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OCI는 2006년 진공단열재 연구개발을 시작해 2009년 7월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2010년 10월 양산을 시작했다. 전북 익산 공장은 생산능력이 400만개로 총면적이 5만평방미터에 달한다.
OCI가 진공단열재 사업에 나선 것은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생산과정에서 실란(STC) 소재가 부생하기 때문이다. 실란으로 흄드실리카를 만들고 흄드실리카를 진공단열재의 소재로 투입한다. 흄드실리카는 하얀 가루 형태로 화재에 강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소재로 평가된다.
진공단열재는 흄드실리카를 고압에서 압축한 후 건조·절단·진공 공정을 거쳐 생산하며 기존 단열재와 달리 생산과 검수 공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진공단열재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단열재를 둘러싸고 있는 필름은 연소되나 심재는 1200도 열에서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화재 인명사고는 유독가스 때문에 발생한다.
단열재는 △스티로폼과 경질 우레탄 등을 사용하는 유기단열재 △글라스울(유리섬유)을 소재로 쓰는 무기단열재 △흄드실리카로 만드는 진공단열재로 구분된다.
현재 건축에서는 유기단열재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면서 단열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반면, 진공단열재는 유기단열재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싸 불리한 입장이다.
건축자재, 화재안전 검증 강화하라!
건축자재는 화재 안전성능 검증제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2023년 3월31일 주최한 제10회 건축용 단열재 정책 및 기술 세미나에서 테라코코리아 엄욱용 상무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외부 마감재에 대한 법규가 있으나 최근 많은 변화로 관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각종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며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능 검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1년 12월23일 건축물 화재 안전과 관련된 품질 인정제도를 확대 도입했다.
건축물 마감 소재의 난연성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 차단막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통폐합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관리기준을 새롭게 제정했고 건축자재의 성능을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받도록 하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취지에 비해 세부 지침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재까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시험기관 부족과 막대한 시험비 부담 가중으로 중소기업은 법 준수가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PVC, 단열화로 창틀 수요 호조
PVC(Polyvinyl Chloride)는 건축에서 내장부터 외장까지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경질 PVC는 파이프, 조인트, 창틀, 홈통(물받이), 사이딩으로, 연질 PVC는 벽지나 소파용 합성가죽 제조에 투입된다.
기계적 안전성, 내크리프성, 내약품성, 접착성, 인쇄성 등이 뛰어나며 투명하고 가소제 첨가로 유연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등 다양한 특성을 겸비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투명성, 내알코올성, 자기소화성 특성을 통해 비말 방지 차폐판용으로 활발하게 사용됐다.
창틀용은 최근 단열 요구가 높아지며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PVC를 중심으로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소재가 사용되고 있으나, 일본은 2021년 창틀 출하량이 3만1708톤으로 15% 증가하면서 최대치를 갱신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 PVC환경협회(VEC)에 따르면, 2022년에는 1%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PVC는 알루미늄에 비해 열전도율이 낮아 외부 기온으로부터 실내를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단독주택 창문의 수지 채용비율이 25.9%에 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5.6%에 불과하고 알루미늄 수지제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지 창문 보급 촉진에는 방화성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VEC는 방화인정시험 간소화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했다. 비교적 간편한 연소 시험으로 방화성능을 추정하고 방화인정을 위한 공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VEC는 수지 창문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 효과와 수지 셔터, 수지 블라인드 등의 여름철 에너지 절약 효과, 수지 소재와 단열 창틀을 사용한 건축물의 종합적인 탄소중립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강윤화 책임기자: kyh@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