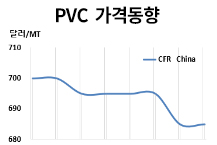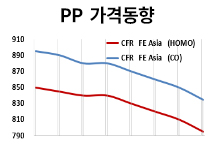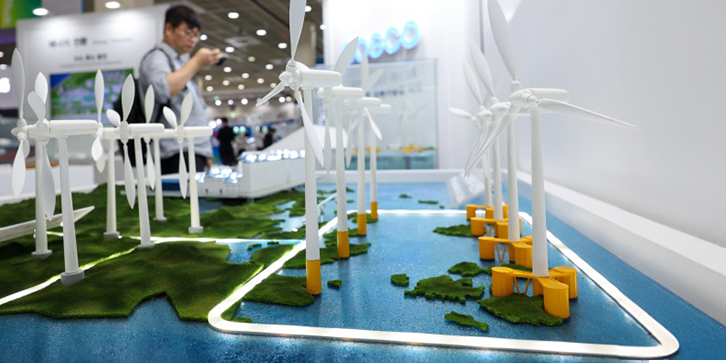카텍에이치, 연속섬유 회수기술 공개 … 모빌리티 경량화 대응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소재는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 기술 개발이 관건이 되고 있다.
FRP는 일반적으로 유리섬유를 강화재로 채용해 UPR(Unsaturated Polyester Resin)의 매트릭스를 강화한 복합소재를 의미하며 비중이 약 2.0 정도로 철강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가볍다.
플래스틱의 성형성‧내식성을 갖추면서도 강도는 철보다 10배 우수하고 원가가 저렴해 헬멧‧욕조‧보트 등에 폭넓게 사용되며 탄소‧아라미드‧보론섬유 등 신소재를 강화재로 사용해 고급 수지를 매트릭스로 활용한 FRP는 항공기 부품, 우주 소재, 골프 클럽, 테니스 라켓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 다른 공업용 소재와 달리 여러 성형법이 실용화돼 있기 때문에 생산량에 적합한 성형법을 선택할 수 있고 대형제품 일체성형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특히, CFRP(Carbon FRP)는 비중이 약 1.5 정도로 일반 FRP에 비해 더 가벼워 최근 모빌리티 경량화 트렌드를 타고 자동차 소재에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윤만석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은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 변화에 따라 경량화를 위한 복합재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차체 복합재는 원가 및 그린앤캡(Green NCAP) 자동차 LCA(Life Cycle Assessment) 대응을 위해 대체섬유 적용 부품 개발 및 재활용 기술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린앤캡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실내 공기질 등 자동차 친환경성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며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했다.
모빌리티 소재는 기존에 철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원가, 강도, 강성, 경량화, 내부식성 등 다양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모빌리티별 중량 저감 가치는 내연기관이 kg당 2달러, 전기자동차(EV)는 4-7달러로 전기자동차의 경량화 소재 사용 가능성이 내연기관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재 경량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FRP는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상당해 자동차 LCA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항공우주공업협회에 따르면, 탄소섬유 함유량이 질량 대비 50% 정도인 CFRP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kg로 대표적인 자동차 경량화 소재인 알루미늄 11kg에 비해 36.4%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CFRP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도레이(Toray), 미츠비시케미칼(Mitsubishi Chemical), 테이진(Teijin) 등 대표적인 탄소섬유 생산기업들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온난화가스(GHG) 배출량을 20-30%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활용 기술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으며 재활용한 탄소섬유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분의 1에서 최대 10분의 1 절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FRP 등 복합소재 매트릭스로 사용하는 열경화성 수지는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오염, 자원 낭비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이 2008년 CFRP 폐기물 매립 금지와 재활용 의무화,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 범위 확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재활용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고문주 교수 연구팀은 자원순환 재활용(Closed Loop Recycling)이 가능한 고강도 신규 바이오 베이스 트리머 고분자 복합소재를 개발했다.
바이오 베이스 복합소재는 기존 복합소재에 응용되는 수지와 비슷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상온‧상압 조건에서 친환경 용매인 물과 에탄올(Ethanol)을 사용해 쉽게 분해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활용 및 재가공 후에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해 CFRP에 효과적으로 재적용할 수 있다.
카텍에이치는 연속섬유를 회수할 수 있는 CFRP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가족기업인 카텍에이치는 2017년 KIST로부터 CFRP 재활용 기술을 이전받아 CR(Chemical Recycle) 상용화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갖추었고 자체 연구와 장비 개발로 연속섬유 회수 공정기술을 확보해 파일럿 장비 시운전을 완료했다.
연속섬유 회수 공정기술을 활용하면 뽑아낸 연속섬유원사를 다시 감고 경화해 CFRP를 생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원사 절단 과정을 생략해 공정 비용을 줄임으로써 가격경쟁력에서 앞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텍에이치는 매년 500톤의 재활용 탄소섬유를 회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국내 3위의 탄소섬유 생산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카텍에이치는 도레이와 함께 BMW그룹이 주관하는 미래 지속가능 자동차 소재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해 탄소 복합재 수소 압력용기 재활용 부분에 자체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며 유럽 에폭시(Epoxy) 메이저와 2025년까지 유럽에 CFRP 재활용 라인을 건설할 방침이다.
CFRP는 웨어러블(Wearable) 로봇 시장에서도 경량 구조재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베노티앤알은 생체모방 기술을 바탕으로 유연성·경량성을 개선한 CFRP 베이스 웨어러블 로봇을 상업화해 2024년 척추 손상,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재활 로봇 엑소모션-R, 2026년 첨단소재 베이스 가정‧일상용 다관절 웨어러블 로봇 엑소모션-P를 출시할 계획이다.
베노티앤알은 2023년 캐나다 웨어러블 로봇 생산기업인 휴먼인모션로보틱스(Human in Motion Robotics)의 지분 45%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웨어러블 로봇 사업에 진출했다. 휴먼인모션로보틱스는 2016년 이동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목표로 설립됐다.
박정욱 휴먼인모션로보틱스 COO(최고운영책임자)는 “앞으로 개발될 엑소모션 기술은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고 휴머노이드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보틱스 기술은 산업 자동화 분야 발전에 따라 연구개발(R&D)이 가속화하고 있다.
BIS(Business Intelligence & Strategy Partner)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2022년 12억4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에서 2030년 132억달러(약 18조원)로 연평균 30.0% 수준의 급성장이 전망된다.
정부는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을 목표로 2009년부터 5년마다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해 로봇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