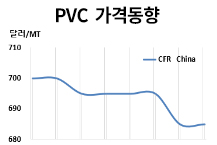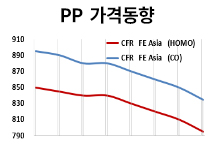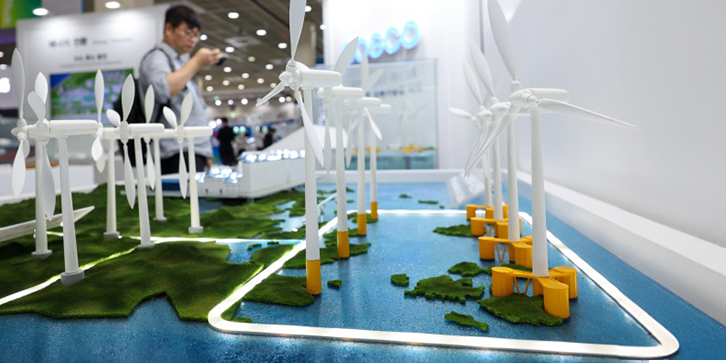탈탄소화 타고 석유제품 수요 급감 불가피 … 올레핀 중심 투자 확대
정유기업들의 석유화학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석유정제 분야는 전기자동차(EV) 보급으로 대표되는 탄소중립 트렌드 확대를 타고 연료유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주력 사업인 석유정제 설비 및 기술을 응용할 수 있으면서 비교적 빠른 기간에 전환이 가능한 석유화학에 진출하는 정유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정유 4사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석유화학 사업 확대에 주력하며 일정수준 자리를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정유 메이저가 석유화학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 동북아 석유정제 시장은 최근 일체화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정유 4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연료유 수요가 급감하며 2020년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최근 수년 동안 추진한 석유화학 비중 확대가 효과를 거두며 2022-2022년 대부분 대규모 흑자를 냈다.
2021년 SK이노베이션이 영업이익 1조7656억원, GS칼텍스는 2조189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에쓰오일은 2조364억원, 현대오일뱅크는 1조142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대부분 석유화학 사업에서 호조를 누리면서 수익성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에도 영업이익이 SK이노베이션 3조9989억원, GS칼텍스 3조9795억원, 현대오일뱅크 2조7898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고 에쓰오일 역시 3조481억원으로 호조를 유지하며 일부에서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됐으나 석유화학 사업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며 석유정제 사업에서 수익을 개선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에는 2022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재고평가손실이 확대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경쟁이 심화되며 수익이 악화됐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자회사 SK온의 호조에도 정유 사업 영업이익이 8109억원으로 급감함에 따라 전체 영업이익이 1조9034억원으로 51.4%, 순이익은 5463억원으로 71.2% 급감했다. 에쓰오일은 영업이익이 1조4186억원으로 58.3% 급감했으며 HD현대오일뱅크는 6167억원으로 77.9%, GS칼텍스 역시 1조6838억원으로 58.0% 급감했다.
그러나 정유 4사는 외부환경에 따른 변동성이 석유정제 사업보다 석유화학에서 작고 석유제품은 친환경 트렌드와 함께 수요 급감이 불가피해 석유화학을 포함한 비정유 사업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쓰오일은 2018년 말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울산에서 PP(Polypropylene) 40만톤과 PO(Propylene Oxide) 30만톤을 포함한 RUC(Residue Upgrading Complex) 및 ODC(Olefin Downstream Complex) 프로젝트를 완공함으로써 프로필렌(Propylene)과 PP, PO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구축했다.
온산단지에서는 9조2580억원을 투자해 스팀 크래커를 비롯한 대단위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 180만톤의 스팀 크래커와 아람코(Saudi Aramco)의 신기술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s)가 적용된 설비, 고부가가치 폴리머 플랜트, 저장탱크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TC2C는 기존 정유공장의 저부가가치 중유제품을 분해해 스팀 크래커 원료로 전환하는 공정이며, 에틸렌 이외에는 프로필렌 77만톤, 벤젠(Benzene) 28만톤, 부타디엔(Butadiene) 20만톤,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88만톤, HDPE(High-Density PE) 44만톤을 완공해 전체 생산능력 중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2%에서 2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롯데케미칼과 합작한 현대케미칼을 통해 에틸렌 생산능력 75만톤의 HPC(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를 완공했으며, 비정유 영업이익 비중이 54.4%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칼텍스 역시 2022년 에틸렌 75만톤, 프로필렌 41만톤, PE 50만톤, 혼합 C4 유분 24만톤, 열분해 가솔린 41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여수 MFC(Mixed Feed Cracker)를 완공하고 석유화학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에네오스(Eneos)가 가와사키(Kasawaki)에서 NCC(Naphtha Cracking Center) 2기를 가동하고 있으나 최근 저가의 에탄(Ethane) 베이스로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미국산 에틸렌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미래 수익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석유정제-석유화학 사업을 연계하거나 다른 석유화학기업과 합작투자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기존 석유화학기업들은 에틸렌 공급과잉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NCC 재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게이요(Keiyo) 지역에서는 스미토모케미칼(Sumitomo Chemical), 미쓰이케미칼(Mitsui Chemicals), 마루젠석유화학(Maruzen Petrochemical)이 NCC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데미츠코산(Idemitsu Kosan) 역시 석유화학 재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데미츠코산은 기초화학제품 및 기능성 소재 분야에서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석유수지는 2023년 3월 생산을 중단했으며 BPA(Bisphenol-A) 사업은 2024년 10월 철수할 예정이다.
반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 공급하기 위해 도요타자동차(Toyota Motor)와 협력하는 등 소재 분야에서 탄소중립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