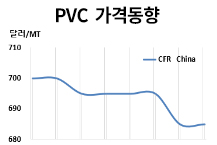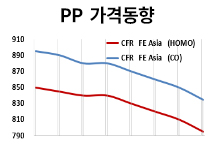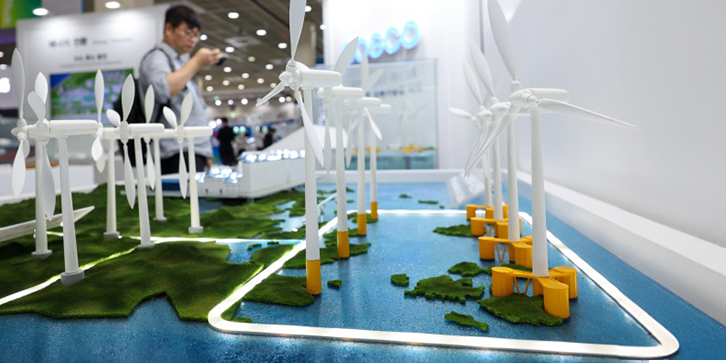EU, 배터리 이어 2026년부터 순차적 도입 … 중국‧일본 대응 가속화
유럽연합(EU)이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디지털 생산제품 여권) 도입에 나서며 글로벌 공급망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EU는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 발표 및 2019년 그린딜 정책 발표 이후 2020년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을 통해 배터리, 전자기기, 섬유에 대한 기존 지침을 규정으로 확대했으며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기존 규정을 개정하며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있다.
2010년대에는 생산제품의 환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와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2020년대 들어 모든 이력 정보를 디지털화한 후 공유하는 DPP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2020년 배터리 규제안을 통해 EU에 유통되는 2kWh 이상의 전기자동차(EV), 산업용 배터리의 모든 생애주기 정보를 QR코드로 실시간 확인하는 DBP(Digital Battery Passport) 도입을 제시했으며 2027년 2월17일 이후 모든 EU 회원국은 배터리 여권 제도를 강제 시행하게 된다.
특히, DBP는 BatteryPass, GBA, MOBI 등 관련 기관 및 연맹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EU가 배터리법을 발효시키면서 구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22년에는 에코디자인 규제안을 통해 DPP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아직 법제화 중이어서 2026년부터 집행위원회가 정한 산업별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일본도 EU DPP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IT기업 Nanjing Fuchuang이 DBP 제작 관련 무료 컨설팅 및 PoC(Proof of Concept) 검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Nanjing Fuchuang의 플랫폼은 △DBP 신청 △데이터 수집 △데이터 검증 △데이터 식별 △3자 인증 △DBP발행 △추적성 △블록체인 인증서 제공 기능으로 구성됐으며, 여권의 QR코드를 SNS 위챗(WeChat)으로 스캔해 탄소발자국 추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 중국은 개별기업 단위 탄소배출 관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전자기기, 섬유 등 품목별로도 공급망 단계별 탄소발자국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자동차탄소(베이징)디지털기술센터는 자동차 공급망의 탄소발자국 데이터를 집계하고 공개하는 세계 최초의 플랫폼인 중국 자동차산업 공급망 탄소공시 플랫폼을 개발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5000개 이상의 승용차, 부품 및 자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입차종과 상용차, 오토바이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계·전자기기 수출입상회(CCCMB)는 Carbon Newture와 협력하며 기계 및 전자기기 부문의 탄소발자국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중국 기계 및 전자기기 탄소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했고, 방직 수출입상회(CCCT) 역시 Carbon Newture와 협력 아래 국제 섬유 및 의류 탄소정보 공개 플랫폼(ICDP)을 공개했다.
2개 플랫폼 모두 생산기업이 부품 생산기업에게 일일이 연락해 정보를 수집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했으며 산업 단계별 탄소 배출 현황을 한번에 수집‧계산할 수 있다.
일본은 배터리 및 부품 생산기업 30여곳이 BASC(Battery Association for Supply Chain)를 결성해 자체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 대학,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순환경제 파트너십 J-CEP(Japan-Circular Economy Partnership)는 2023년 3월 플래스틱 DPP 개발을 위한 연구조직을 결성하고 네덜란드 IT기업 Circularise와의 협력 아래 DPP 구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래스틱 병 뚜껑이 재활용 플래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수명주기를 추적하고 있다. 디지털 상에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 뚜껑을 회수해 광학선별하고 리펠릿화 및 성형을 거쳐 완충재 혹은 잡화 등 최종제품으로 리사이클하는 서플라이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이 시스템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도록 해 원자재, 제조 장소, 리사이클 관련 정보 및 이력을 QR코드로 가시화할 예정이다.
현재 AMITA 그룹의 메구루 스테이션(Meguru Station)에서 수집된 플래스틱 병 뚜껑을 회수하고, 마루베니(Marubeni)를 통해 공급망 주체 및 이해관계자의 규정 준수, 품질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DPP는 EU가 추진하는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DPP에 포함될 정보 가운데 탄소발자국은 EU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항목이며 관련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노력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DPP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EU 진출에 제한이 생기고 EU에 직접 수출하는 곳 뿐만 아니라 동일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관련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DPP 추진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공급망 정보의 축적 및 디지털 기술 도입 △탄소발자국 감축, 인권·노동 문제 해결 등 ESG 항목 개선 노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정부 및 유관기관에게 △배터리, 섬유 등 주요 품목의 파일럿 DPP 제작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DPP 지원 인프라 구축 △산업별 탄소배출 관리 플랫폼 구축 △DPP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