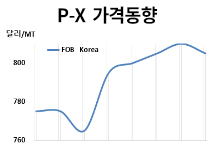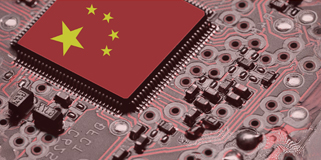국내 화학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은 적자가 커지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이 석유화학 자급화를 서두르면서 신증설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서 아시아 전역으로 공급과잉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시아 공급과잉이 중국 탓이라며 스스로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중국의 신증설을 탓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중국이 산업화에 필수적인 중간 소재를 자급화하기 위해 석유화학 신증설을 적극화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 충돌하면서 불경기가 겹쳐 신증설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면서 아시아 전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이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중국 경기 호전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이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오히려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 공급과잉이 해소됨은 물론 중국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적자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이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확대하면 일시적으로는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장기간에 걸쳐 수출을 줄일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이고, 석유화학을 비롯한 화학제품도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화학 시장에서 정밀화학이나 무기화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석유화학도 머지않아 시장을 장악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끊임없이 신증설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소재의 자급화를 벗어나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배터리가 대표적이다. 배터리는 초창기에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고 일본이 소재 공급망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중국이 5년도 되지 않아 배터리 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재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일본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한국처럼 맥없이 주저앉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배터리 부흥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 화학기업들은 지금도 반도체 및 배터리 소재 신증설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한국과 다른 점은 공급물량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일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중국, 동남아로 설비를 이전하거나 철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2000년대 이전부터 그러했고 앞으로 더 강화할 것이 확실하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중국이라는 공룡을 간과한 채 신증설에 매달릴 때 일본은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능력을 감축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이 생산능력을 감축하면 한국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적자로 고전하고 있을 때 일본 화학기업들은 중국 수요가 줄어들고 중국산이 아시아 시장에 폭풍을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흑자를 유지했고 앞으로 흑자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화학소재는 중국에 이어 인디아, 동남아가 참여함으로써 범용으로 경쟁할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 차별화, 고부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