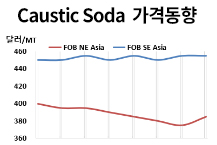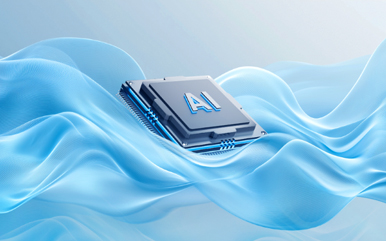국내 화학기업들이 고전에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일본 화학기업들은 선방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국발 공급과잉을 이겨내지 못해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반면,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은 석유화학 부문이 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화학기업 관계자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국내 화학기업들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범용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반면, 일본 화학기업들은 고부가가치·차별화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불황에도 끄떡없는 사업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과 중국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으나 일본이 초강수를 둘 수 있는 것도 고부가·차별화 소재를 무기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일본이 전기·전자는 물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통신용 화학소재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중국 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도 희토류를 중심으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일본을 대상으로 함부로 휘두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도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소재 공급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희토류에 막혔을 때 일본이 계산하지 않고 타이완 문제를 거론했을 리 만무하다.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좌우하면서 반도체 강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나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일본과의 분쟁으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이후 국산화를 서둘렀으나 아직도 주요 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에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 소재도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배터리 소재는 일본산 의존도가 낮아지는가 싶더니 중국산이 일본산을 대체하고 있다. 통신도 5G를 넘어 6G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국산화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 100을 기준으로 중국이 93 수준까지 올라섰고 2030년에는 중국이 107로 한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반도체 소재까지 국산화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만 글로벌 시장의 70%를 좌우하고 있을 뿐 시스템 반도체는 타이완에 크게 밀리고 있다. 생산 구조의 취약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소재·부품을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부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을 이유로 제기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개발 역량이 크게 떨어지고 산·관·학 연계·협력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반도체 소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따라 고부가·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어 현재의 연구개발 역량으로는 국산화가 요원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연구개발 체제의 대혁신을 통해 기술 초격차를 극복할 것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5년 7000억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매킨지는 AI, 바이오,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과 융합하면 2040년 1조7000억-2조400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가 석유화학을 대체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화학기업들은 연구개발 체제 혁신을 통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전자, 배터리, 통신용 화학소재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