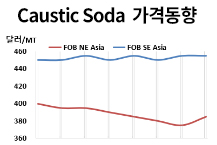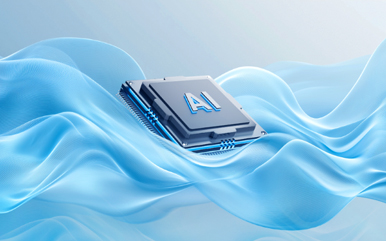다이오제지, 화학제품 원료로 바이오 에탄올 공급
다이오제지는 CNF(Cellulose Nano Fiber)에 이어 바이오 리파이너리를 구상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가스화 등 독자적인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NEDO 프로젝트 주제를 중심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다이오제지는 바이오 에탄올을 SAF와 휘발유 첨가제로 공급함은 물론 화학기업 활용도 적극화할 방침이다. 석유화학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에탄올 베이스 PE(Polyethylene)‧PP(Polypropylene) 공동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이오제지는 선진국의 리사이클 중시 트렌드를 고려해 매스밸런스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화학제품을 반복적으로 재활용한 다음 신규 생산 원료는 에탄올 베이스로 충당하는 구조가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다이오제지는 펄프 베이스 아스파라긴산(Aspartic Acid), 호박산(Succinic Acid) 사업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화학기업과 수직 연계를 구상하면서 최종 용도로 다이오제지가 생산하고 있는 기저귀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퇴비화 대응과 생분해성이며 아스파라긴산은 SAP(Super Absorbent Polymer), 호박산은 PLA(Polylactic Acid), PBS(Polybutylene Succinate)의 주요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캐즘으로 연료용 수요도 재부상
다이오제지는 2세대 바이오 에탄올을 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연료용으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항공유용 공급 부족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EV)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의 영향으로 자동차용으로도 공급이 요구되면서 바이오 에탄올을 두고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ANRE)이 2028년부터 에탄올 10% 혼합(E10) 가솔린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2025년 5월 발표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이오제지는 에탄올 생산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며 2세대 바이오 에탄올의 수십퍼센트는 자국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이오제지는 화학제품용 바이오 에탄올 생산 역시 고려하고 있다. 목재 체인의 최대 강점은 리스크 분산 구조이며 그룹 기준 자체 조림면적이 제한적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목질 원료를 수입하고 일본에서도 조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지 펄프, 제지 슬러지를 남김없이 이용해 코스트도 절감하고 있다.

다이오제지는 일본 제지기업 중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다이오제지가 보유한 크래프트 펄프 생산기지인 미시마(Mishima) 공장과 가니(Kani) 공장 가운데 미시마 공장은 생산능력이 200만톤으로 일본에서 가장 크며 희소한 임해형 펄프‧제지 공장이어서 화학제품 파일럿‧양산설비가 건설되면 석유‧화학기업에게 공급함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다.
다양한 기술‧원료로 사업성 확보 노력
바이오 화학은 출발 원료가 다양한 편이나 제지기업들은 목재가 비식용 원료라는 점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경제안보가 새로운 관점으로 부상하면서 석유화학‧식용 원료와 차별되는 공급망이 목재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목재 칩 조달망은 글로벌로 다극화 분산돼 있으며 다이오제지와 오지는 글로벌 공급망을 중시하고, 일본제지는 일본산 목재를 활용한 지역 순환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일본 제지기업 3사가 NEDO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하는 바이오 에탄올 및 화학제품 설비는 모두 당화‧발효 프로세스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증해설비 구조와 생산 펄프 종류 차이로 당화‧발효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는 편으로 파악된다.
일본제지, 다이오제지는 각각 NEDO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나 발효용 균주 개발 프로세스는 바이오 벤처 GEI가 공통으로 관여하고 있다.
다이오제지는 사업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GEI가 보유한 기존 균주를 개량해 이용하고 동시에 당화‧발효 프로세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동시 당화‧발효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셀룰라아제(Cellulase)를 이용한 분해‧단당화와 균주에 의한 발효 과정으로 구분된다. 셀룰로스는 단당인 글루코스(C6당)가 사슬 형태로 연결되는 분자구조를 지니고 헤미셀룰오스는 자일로스(C5당) 등 다양한 단당으로 구성된다. 각각 전용 균주와 발효조를 별도로 사용하는 2단계 처리가 필요한 기존 발표 프로세스와 달리 동시 당화‧발효 프로세스는 1단계로 집약이 가능하다.
다이오제지는 헤미셀룰로스를 단독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율‧원가 절감 양면에서 동시 당화‧발효 프로세스를 선택했다.
반면, 오지는 요나고 공장에서 용해 펄프를 주원료로 당액, 바이오 에탄올, 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요나고 공장에는 용해 펄프 특유의 전 가수분해 공정이 있어 증해보다 먼저 헤미셀룰로오스를 제거한 다음 크래프트 증해설비로 셀룰로스‧리그닌을 분리하기 때문에 헤미셀룰로스를 별도 활용할 수 있고 오지는 항응고제나 푸르푸랄(Furfural)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목질 원료로 생산한 바이오 화학제품은 대부분 식용 원료로 생산한 바이오 화학제품보다 코스트가 높은 편이다.
제지기업들은 신규 설비와 감가상각이 종료된 설비를 조합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펄프를 주요 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화학기업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살린 연계‧협업을 기대하고 있다. (윤우성 선임기자: yys@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