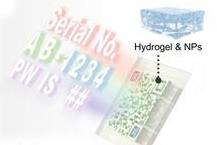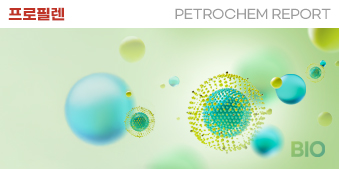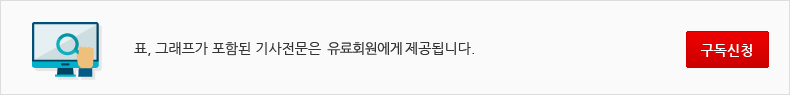바이오산업의 나아갈 방향
|
한국의 BT(Bio Technology) 산업이 아직 태동기를 벗어나지 못했고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55%에 불과하다는 뉴스를 접하는 순간 바이오산업 종사자나 화학산업계 인사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바이오산업의 최근동향> 보고서에서 국내 바이오산업이 태동기에서 도입기로 변천하는 단계로 성장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국내 바이오 시장이 산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연구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장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바이오산업을 부르짖고 바이오벤처를 육성하겠다고 나선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바이오벤처 중 살아남아 있는 벤처 중의 벤처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가뜩이나 기초과학 수준이 뒤떨어지고 연구개발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갑자기 IT와 함께 바이오벤처를 육성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문제투성이였음은 말할 나위가 없고, 감나무 아래 배 깔고 누워 떨어지는 홍시를 낙아채기 바쁜 시절이 상당했으니 바이오산업이 태동기를 지나 도입기로 들어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바이오산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1976년 처음으로 바이오기업이 탄생한 이후 약 10년을 주기로 바이오신약 부문에서 변곡점이 발생해 1990년대 초부터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진정한 의미의 바이오벤처가 부지기수로 탄생해 대부분이 사멸해갔지만 상당수가 살아남아 바이오산업의 중추로 성장했고, 글로벌 제약 메이저들이 바이오벤처기업과 연합하면서 바이오신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은 유럽을 제치고 세계 바이오 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즉, 미국은 벤처정신으로 무장한 바이오벤처들이 기술개발로 승부한 반면, 한국은 벤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여들어 바이오벤처를 만들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꿀꺽하기 바쁜 세월을 보냈으니 진정한 의미의 바이오산업이 태동하기조차 힘들었다고 평가해도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바이오산업이 오래 전부터 전래되고 있는 한방적 처방을 사업화하고 일부 생물의약을 개발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며, 바이오산업 중 하이테크 부문의 비중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 바이오 시장이 2003년 기준으로 약 630억달러에 달하고 바이오신약이 380억달러로 전체의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시장은 고작 1조2000억원(12억달러)에 그치고 있는 것도 당연지사일 것이다. 2010년 세계 바이오신약 및 치료제 시장 1700억달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으로 뒷받침된 바이오벤처가 탄생해야 하나 200여개 바이오기업의 평균 연령이 5년에 불과하고, 매출이 15억원에 불과한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할 수박에 없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성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의 바이오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한국의 바이오산업이 일대 부흥기를 맞이할 것처럼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식자들이 「별로」라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는 대단한 작품으로 평가해도 부족할 만큼 기록적 업적이나, 줄기세포 연구결과만을 가지고 한국의 바이오산업이 대대적으로 성장할 만한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인정하지 많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연개소문,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에 박정희로 이어지는 전략가와 맹장들이 있었지만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일본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항복하는 수모를 꺾었을 만큼 사회 근간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바이오산업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한명의 세계적인 연구업적도 중요하지만 혼탁한 바이오 시장의 풍토부터 고쳐 기초를 뜬뜬히 하는 수순이 절실한 시점이다. <화학저널 2005/9/26>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백송칼럼] 화학산업이 나아갈 방향 | 202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