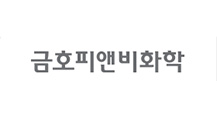국내 경제·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말 고민스러운 질문이나 반드시 찾고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특히, 산업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날밤을 새서라도 고민해야 하는 정책과제이다.
하지만, 산업부 어느 구석을 둘러보아도 관료들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조선을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이 경쟁력을 완전 상실했거나 잃어가고 있는 판국이지만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껏 내놓는 답이라면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누구도 내놓을 수 있는 기초적인 답이 전부이다.
조선은 세계 최대의 도크를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휩쓸었건만 최근에는 일본에도 밀리는 형국이다. 컨테이너선에 그치지 않고 LNG 운반선을 건조함으로써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것이 엊그제이나 불과 몇년만에 선두자리를 내주고 중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고임금에 강경노조가 판을 치는 것도 모자라 덤핑수주 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에 여념이 없었던 후유증으로 판단된다.
철강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했지만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서 공급과잉이 극심해졌고 포스코마저 적자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물론,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호황을 누릴 수 있겠지만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자급률 제고에 중동의 세력 확장, 미국의 셰일가스 베이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3각으로 협공을 받는 위기에 처해 있다. 수출을 확대한답시고 생산능력을 확장했지만 수출을 확대하기는커녕 수출부진 행진이 이어지고 머지않아 중국산, 중동산에 이어 미국산까지 국내시장을 넘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모두 생존이 불투명한 상태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 수출이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상도 이하도 아닌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원화 환율이 달러당 1200원에 육박했음에도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형환 산업장관이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과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 발언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전기강판,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심의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아세톤, BPA는 재심을 통해 반덤핑을 완화하도록 요구한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전기버스용 2차전지 보조금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산업이 장기적으로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협력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상호 역할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등등 난제가 첩첩산중이건만 한 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영업사원도 아닌 판에 반덤핑을 완화하거나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LG화학이나 삼성SDI의 대변인도 아닌 마당에 삼원계 2차전지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머리를 조아렸다고 한다.
주무장관으로서 상대국에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큰 틀에서 경제적 산업적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을 유도한 연후에 크게 부각되지 않을 정도로 유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그러했다면 할 말은 없다.
박근혜 정부가 3년째 접어들면서 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하소연이나 푸념이 괜히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