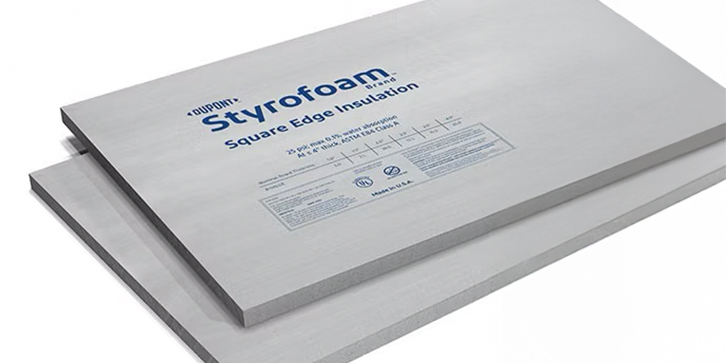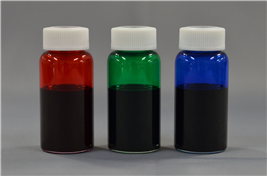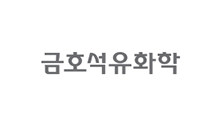BASF는 화학사업의 고부가화를 위해 농화학, 전기·전자, 제약, 퍼스널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최근 수익성이 저조한 전자소재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BASF는 미래 예상 수익률에 따라 모든 사업을 Green(집중 육성), Yellow(경쟁력 유지), Brown(투자 제한), RED (사업 철수)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사업전략을 차별화하고 있다.
2001년 BASF New Business를 설립하고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핵심 성장분야를 선정한 후 육성이 필요한 중점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조달할 수 없는 역량은 BASF Ventures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Brown 등급에는 기존 석유화학 범용제품이, RED 등급에는 주로 디스플레이 소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ASF는 사업부를 화학, 퍼포먼스 원료, 기능성 소재, 농화학, 에너지 등 5개로 구분하고 전자소재는 화학 및 기능성 소재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매출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유화학 사업은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은 글로벌 수익률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기업이 독점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 매출 확대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BASF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소재 관련 R&D(연구개발)를 2015년 말 중단하고 500여개에 달하는 특허를 2016년 6월 말 UDC(Universal Display)에게 매각했다.
글로벌 광개시제 사업부도 매각했으나 전자소재에 사용되는 고성능 광개시제는 매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독일 본사의 전자소재 사업부, R&D센터 등을 한국으로 이전한 것도 OLED 소재 투자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었으나 OLED 인광소재 개발에 실패했고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의 진입장벽이 높아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ASF는 부정하고 있으나 성균관대학교 수원 자연과학 캠퍼스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자소재 R&D 센터를 설립한 것도 삼성그룹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특히, 2017년까지 OLED 연구에 320억원, 디스플레이 소재 연구에 49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성과가 뚜렷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ASF는 화학제품을 고부가화하기 위해 고부가화 안료, 농화학, 헬스케어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에서는 전자소재에 비해 자동차소재에 집중하고 있다.
BASF는 2016년 2월 AkzoNobel에게 산업용 코팅 사업부를 매각하고 자동차 코팅 및 고부가 안료사업에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에 안료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바스프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BASF Colors & Effects Korea)로 국내 전담법인을 신설했다.
아울러 2016년 7월 금속표면처리 전문기업 Chemetall을 32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우수한 금속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자사만의 판매 네트워크, 연구개발 기능, 화학 사업 노하우를 조합해 코팅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국에서도 Shanghai Huayi과 합작한 BASF Shanghai Coatings이 2017년 4/4분기 상업가동을 목표로 Shanghai 화학공업단지(SCIP)에 도료공장을 신규건설할 계획이다.
BASF는 2014년 7월 SCIP에 구축한 자동차용 도료 생산라인과 2015년 8월 건설한 도료용 수지 및 양이온 전착도료 생산설비와 시너지를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P(Engineering Plastic), 슈퍼EP 등도 국내 증설을 계속하고 있고 코오롱플라스틱과 합작으로 POM(Polyacetal) 플랜트도 증설함에 따라 자동차용 소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 소재에서는 주도권을 잡지 못해 일부 전자 및 반도체 소재에 주력할 방침이나 미국, 일본 등에게 밀려 시장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 디스플레이 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수익성 악화가 지속돼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선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