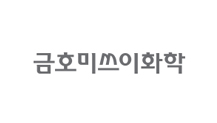전고체전지가 웨어러블(Wearable) 기기에 본격 채용된다.
LiB(리튬이온전지)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고체전지는 안전성과 고용량을 겸비한 배터리로 자동차 채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우선 웨어러블기기용으로 샘플 공급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FDK는 2018년 말 고전위 양극소재 PLC(Pyrophosphate Lithium Cobalt)를 적용한 산화물계 전고체전지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전압은 3.0볼트, 용량은 140마이크로암페어시로 SMD(표면실장부품) 타입이기 때문에 전자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기 소형화 및 실장 코스트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어러블, IoT(사물인터넷) 기기용을 중심으로 제안할 계획이며 2019년 대용량 타입 샘플 공급을 목표로 개발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무라타(Murata Manufacturing)도 2019년 전고체전지 양산화를 계획하고 있다.
무라타가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전지는 강점인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구조 및 제조 프로세스가 유사해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선 웨어러블용으로 실용화할 방침이다.
양사가 웨어러블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전고체전지가 높은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전 가능한 2차전지는 LiB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가연성 유기 전해액을 사용하는 LiB는 발화 문제로 고용량과 안전성을 양립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라 LiB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웨어러블제품을 개발할 때는 소형, 고용량, 발화하지 않는 배터리가 절대적인 채용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고체전지는 불연성 고체소재를 전해질로 채용함에 따라 웨어러블기기 생산기업 등 수요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FDK가 샘플 공급하는 전고체전지는 영하 20℃에서 영상 105℃까지 사용할 수 있어 가혹한 환경, 자동차에 탑재하는 전장부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맥셀(Maxell)도 2020년까지 전고체전지를 양산화할 계획이며 고체 전해질과 실리콘(Silicone)계 음극재를 조합함으로써 기존 LiB에 비해 에너지밀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일본 NGK Insulators는 자동차용 전고체전지 개발에 착수했다.
자동차용 배기가스 정화필터 제조 등에서 축적한 독자적인 소성기술을 투입해 유화물, 접착제 등 환경부담이 큰 유기화합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라믹 소재로 제조한 전해질 및 전극을 효율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술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개발(R&D) 본부에 전고체전지 개발 전문조직 ACB 프로젝트를 신설해 연구인력 60여명과 함께 소재 선택, 분자설계, 소성, 전지 조립 분야를 중심으로 자동차에 탑재할 때 최적화된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EV 항속거리를 기존 LiB의 2배로 확대하고 배터리 제조코스트에서도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학 연계, EV 및 배터리 생산기업과의 공동개발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약 3년 동안 모듈전지를 완성해 EV 생산기업에게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며 2025년경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용 LiB 개발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배터리 개발기술을 투입하거나 고가의 소재를 채용함으로써 EV 생산기업들이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전해질액 누출 방지 등 안전대책에 소요되는 코스트가 확대되면 EV 가격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기업들은 안전성이 뛰어난 전고체전지로 EV 전원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요타(Toyota)가 고체전지 개발에서 제휴관계를 맺은 파나소닉(Panasonic)과 공동으로 전지 개발 및 제조를 담당하는 신규기업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는 등 EV 시장은 2019년 초부터 고체전지 관련 프로젝트가 활기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