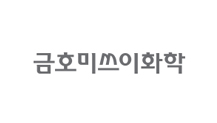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우려만큼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2020년부터 5G(제5세대 이동통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성장성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서도 재택근무 본격화, 원격의료 관심을 타고 수요를 유지했고 5G 도입도 순조롭기 때문이다.
당초 기대했던 수요 회복은 불가능해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5G는 물론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DC, 글로벌 반도체 시장 6% 역성장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Hubei)의 우한(Wuhan)에서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된 후 2020년 초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2월부터는 아시아, 3월 이후에는 유럽‧미국‧중남미 등 세계 전역으로 확산됐으며 겨울철에 진입하면서 2차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3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전자 분야의 주요 소비국인 유럽‧미국의 상황이 심각해 반도체를 비롯한 관련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았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부품 및 원료 조달난,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TV 등 최종제품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2020년 10%대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IDC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2020년 금액 베이스로 전년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2월에도 후베이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반도체만은 생산을 유지했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반도체 생산기업들은 코로나19 외에도 각종 위기상황에 대비해 리스크 분산을 위한 시나리오를 강화해왔다.
실리콘(Silicone) 웨이퍼 발주를 늘리거나 수요 흐름에 맞추어 재고를 확충해두는 식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료되고 5G 어플리케이션용 수요가 급증한다면 2분기에 축적해두었던 재고가 추후 실리콘웨이퍼 출하면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가 2020년 종식되지 않는다면 실리콘웨이퍼 출하면적이 3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코로나19 사태가 비관적인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2020년 300mm 실리콘웨이퍼 출하면적이 2분기 대폭 증가해도 2020년에는 정체되거나 소량 감소할 수 있고 200mm와 150mm는 출하면적이 각각 5%,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전자제품 판매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애플(Apple)은 매년 가을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했으나 2020년에는 10월 중순으로 일정을 미루었다.
반도체, 5G 도입 본격화 타고 고기능화
반도체는 5G 도입 본격화가 성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5G는 대용량, 초지연성, 초연결성을 통해 통신 자체의 기능이 강화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등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성 및 확장성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침투가 확대되고 있어 반도체 수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부터 기지국,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5G의 기간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반도체 관련기업들은 소재, 디바이스, 서비스 등 방대한 수요 및 고도의 요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안테나 수는 4G가 최대 3개, 5G가 최대 7개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5G는 처리 부하가 높고 싱글나노미터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하이엔드 SoC(System on Chip) 도입 확대로 이어져 디바이스 전체의 고기능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퀄컴(Qualcomm)은 스마트폰, 라우터 등 고주파통신용 모뎀, 안테나 제어용 SoC를 5G 스마트폰용으로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알프스알파인(Alps Alpine)은 자동차용 5G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후지쿠라(Fujikura)는 IBM과 제휴해 5G용 차세대 밀리미터파 RF-IC를 개발했으며 LCP(Liquid Crystal Polymer) 기판과 복합해 모듈화를 추진하는 등 IC와 기판기술 융합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기지국에서는 노키아(Nokia), 브로드컴(Broadcom)이 베이스밴드용 프로세서를 공급하고 있으며 테라바이트(TB)급 통신제어를 실현해 방대한 통신량에 대응한 기간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5G는 서브 6GHz와 28GHz대를 이용하지만 국가 및 통신사에 따라 이용하는 주파수대가 달라 자일링스(Xilinx)는 기지국에 조절이 용이한 FPGA를 공급해 신속한 다지역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 혁신은 전자부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세라(Kyocera)와 우베코산(Ube Kosan)은 5G 통신 기지국용 세라믹필터를 공급하는 합작기업을 설립했으며, TDK는 20GHz 대용 적층 밀리미터파대 밴드패스필터를 개발해 양산하기 시작했다.
무라타(Murata Manufacturing)는 밀리미터파용 표면파(SAW) 필터를 개발하고 있으며, Taiyo Yuden은 콘덴서, 필터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전자기판, 다양한 소재 개발 활성화
반도체와 함께 전자기판도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전자기판은 LCP, 불소(Fluorine) 기판에 이어 최근 들어 코스트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저유전 PI(Polyimide)가 실용화되고 있다.
미츠비시가스케미칼(MGC: Mitsubishi Gas Chemical)은 OPE(Oligophenylene Ether), 테이진필름솔루션(Teijin Film Solution)은 PEN(Polyethylene Naphthalate) 등 고주파 소재로 용도를 개척하고 있으며, 니토보(Nittobo), 아사히카세이(Asahi Kasei)는 저유전 유리섬유 등 수지 이외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Nippon Steel Chemical & Material(NSCM)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분자설계‧코팅기술로 저유전 PI 베이스 2층 CCL(Copper Clad Laminate)을 개발했으며, AGC는 5G 기판용 접착성 불소수지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쿠라레(Kuraray)는 가시마(Kashima)에 LCP-CCL 양산시험 설비를 도입하는 등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5G 대응 기판도 양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Nippon Mektron은 LCP 사업에서 축적한 고주파용 기판 관련 노하우를 활용해 안테나용 FPC(Flexible Printed Circuit)를 5G 스마트폰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기지국용은 OKI 등이 고다층기판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기지국은 고주파 대응 뿐만 아니라 열대책, 신뢰성도 높은 수준으로 요구됨에 따라 고부가가치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배터리, 기지국용 수요 증가 기대
일본 통신기업들은 상용 5G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기지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G는 전파 도달범위가 좁아 4G에 비해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고 백업용 전원으로는 소형에 고성능이고 안전한 배터리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무선 기지국은 아직 납축전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LiB(리튬이온전지)도 사용되고 있으나 교체까지는 10-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동북지방 대지진 이후 자연재해에 따른 정전 장기화에 대비해 태양광발전, 연료전지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트라이브리드형 기지국을 검토하거나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LiB는 발열 및 폭발 위험성, 저온 작동에 대한 대응이 선결과제로 자리 잡고 있어 전고체전지, 리튬 등 금속을 이용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선통신 기지국의 전원버스, 앞으로 유럽에서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자동차(HV)와 같은 DC48볼트계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기업, 신사업 창출 위해 실증 가속화
일본 통신 4사는 5G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실증시험을 가속화하고 있다.
NTT도코모(NTT Docomo)는 관련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KDDI는 페이스북(Facebook)과 제휴해 관련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소프트뱅크(Softbank)는 5G 기지국 안테나에서 실증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라쿠텐(Rakuten)은 3사에 비해 실증이 늦어졌으나 유망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도코모는 화낙(Fanuc), 히타치(Hitachi)와 5G를 활용한 제조현장 고도화를 검토하고 있어 전자파 측정, 전송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므론(Omron), 노키아와 진행하고 있는 실증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KDDI는 2019년 11월 말 페이스북과 제휴하기로 합의했다.
KDDI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을 포괄한 XR(확장현실) 기술을 5G의 필수 요소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0년 AR을 이용한 쇼핑체험 등 차세대형 콘셉트를 알리는 시설을 개설할 계획이다.
소프트뱅크는 공공도로의 트럭 대열주행, 건설기기 원격조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바루(Subaru)와 공동으로 4G LTE 망에 의존하는 비자립형(NSA: Non-StandAlone) 5G 네트워크, 자동차‧사물 셀룰러 통신(C-V2X: Cellular Vehicle-to-Everything)을 실증하고 있다.
라쿠텐은 2019년 10월 테니스 국제대회에서 NEC제 5G 기지국을 설치해 생중계했으며 인근부스, 모바일에 대한 실시간 8K 영상 전송, 헤드셋을 이용한 처리데이터 VR 체험을 제공했다.
2020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한 후 완전 가상화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를 이용해 낮은 코스트, 높은 효율과 안전성, 품질을 실현할 방침이다.
포토레지스트, 싱글나노 프로세스 양산화
반도체 패턴을 형성하는 포토레지스트는 EUV(극자외선), 액침 ArF(불화아르곤) 등 최첨단 노광기술이 대두됨에 따라 싱글나노미터 프로세스를 양산화하기 시작했으며 FoWLP(Fan-Out Wafer Level Package) 재배선층 형성 등 새로운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토레지스트 생산기업들은 최첨단 기술과 시장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TOK는 7/5나노미터의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수주하는 등 ArF와 함께 최첨단 프로세스 전반에 공세를 가하고 있다. 차세대제품인 3나노미터도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등급3 클린룸을 건설하는 등 설비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FUJIFILM Electronic Materials도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조사부위가 제거되는 네거티브형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EUV는 조사부위가 남는 포지티브형이 채용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세화로 네거티브형이 경쟁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스트림 분야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마루젠석유화학(Maruzen Petrochemical)은 포토레지스트 원료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기 경영계획에서 KrF(불화크립톤)용 포토레지스트 원료 PHS(Polyhydroxystyrene), 신규 개발한 EUV용 포토레지스트 소재, 반사방지막 소재 등의 증산투자를 판단할 방침이다.
Nippon Kayaku는 최근 FoWLP용 포토레지스트 시장에 진입했다.
FoWLP 분야에서는 히타치케미칼(Hitachi Chemical), Nikko Materials가 필름을 공급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용 프로세서에 도입됨에 따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AB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대 메이저인 타이완 TSMC는 7나노미터 대량생산과 EUV 도입을 시작했다. 5나노미터도 리스크 생산에 들어갔으며 3나노미터는 2022년을 목표로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EUV를 빠르게 도입한 삼성전자도 5나노미터 실용화를 발표하는 등 싱글나노 프로세스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고순도가스, 중국 투자 본격화
고순도 가스는 반도체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도체 미세화‧다층화에 따라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수요 호조가 확실시되고 있다.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 생산기업들은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KDK는 시부카와(Shibukawa) 공장의 배선용 WF6(육불화텅스텐), 에칭용 C4F6(Hexafluoro 1,3-Butadiene) 생산을 확대했다.
2019년에는 산하에 불화수소 생산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기업과 반도체‧액정용 특수가스 합작기업을 설립해 2017년 설립한 한국법인과 함께 BCP(사업계속계획)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쇼와덴코(Showa Denko)는 중국에서 에칭용 C4F8(Octafluorocyclobutane) 증설에 착수했다.
상하이(Shanghai) 공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가와사키(Kawasaki) 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복수제품을 현지생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장기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가와사키 공장 증설, 유럽 판로 개척 등 글로벌 수요를 고려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센트럴글래스(Central Glass)는 클리닝가스인 NF3(삼불화질소) 사업에서 철수하고 WF6과 에칭용 가스를 포함한 신규 특수가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NF3 생산을 중단한 우베(Ube) 공장에서 신규 가스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NS는 한국과 중국에서 특수가스 증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증설물량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기업도 전자용 화학소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Juhua Group은 국가IC산업투자기금공사와 공동으로 약 150억엔을 투입해 합작기업을 설립했으며 중국 전자화학소재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순도약품, 일본은 해외 생산체제 강화
일본의 반도체용 고순도 화학약품 생산기업들은 해외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고순도 화학약품은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 미세화, 구조 복잡화의 영향으로 안정공급 뿐만 아니라 니즈에 대한 대응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고순도 화학약품 생산기업들은 2019년 메모리를 비롯한 반도체 수요침체, 정치적 문제에 따라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예상되는 수요 회복, 추가 미세화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쿠야마(Tokuyama)는 중국 저장성에서 세정용 IPA(Isopropyl Alcohol), 현상액인 TMAH(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공급을 시작했으며 타이완에서도 타이베이(Taipei)에 이어 타이중(Taizhong)에서 IPA 공장을 신규 가동했다.
TOK는 타이완 합작기업의 클린 솔루션 사업을 강화해 EUV 등 최첨단 프로세스에 특화된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세정제, 시너, 현상액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간토케미칼(Kanto Chemical)은 타이중 신규 공장에서 과산화수소수, 산‧용제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타이중 생산능력을 타이베이 공장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Mitsubishi Chemical Holdings(MCH)는 2019년 4월 후쿠오카(Fukuoka) 소재 초산 유도제품 생산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오나하마(Onahama) 공장으로 집약했다.
후쿠오카에서는 RCA 대체세정, CMP(화학적 기계 연마) 후세정 등에 강점을 보유한 소재를 공급함과 동시에 파워반도체 분야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에칭액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타이완에서 운영하는 세정제 및 기기 세정 사업도 강화해 최첨단 싱글나노 프로세스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불산(HF: Hydrogen Fluoride)은 고기능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스텔라케미파(Stella Chemifa)는 초고순도 HF의 관리 입자지름을 0.03마이크로미터로 미세화했으며, 모리타케미칼(Morita Chemical)은 중국 저장성에 고순도 불산, BHF(Buffered HF)를 원료부터 수직계열화해 2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CMP, 평탄성 니즈 확대에 대응
CMP는 실리콘 웨이퍼의 평탄화 프로세스로 반도체 기술 고도화에 따라 평탄성, 내흠집성, 단사이클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연마제를 포함한 슬러리, 연마패드, CMP 후에 사용하는 CMP 후세정 등이 중심이다.
후지필름(Fujifilm)은 2020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에서 CMP 슬러리 증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R&D)을 강화하기 위해 클린룸이 포함된 연구동을 새롭게 건설하고 있다.
2017년에는 CMP 후세정제를 생산하는 Wako Pure Chemical을 인수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히타치케미칼은 2019년 초 차세대 반도체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오픈실험실을 쓰쿠바(Tsukuba)에서 가와사키로 이전했다. 시험제작부터 평가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했으며 주로 후공정 소재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연마패드는 다우케미칼(Dow Chemical)이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기업들은 부가가치제품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테이진프론티어(Teijin Frontier)는 2019년 초극세섬유 Nanofront제 부직포를 이용한 연마패드를 개발했다.
섬유 사이에 있는 공간에 연마제를 높은 밀도로 보유할 수 있어 슬러리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Nanofront는 유연성이 뛰어나고 경면으로 가공할 수 있어 공정 단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라레는 내흠집성과 고속연마를 양립한 무발포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베이스 고경도 CMP 패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후지보에히메(Fujibo Ehime)는 오이타(Oita) 공장을 신규 건설했다.
CMP 후세정제를 생산하고 있는 MCH는 2018년 반도체 장치 정밀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 Cleanpart Group을 인수함으로써 반도체 생산기업과의 관계를 심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방침이다.
봉지재, 니즈 다양화에 고기능화 전략
반도체 봉지재는 고기능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5G에 따른 고주파기기 증가, 서버, 로봇 및 산업기기에 따른 파워반도체 이용 확대, 자동차 탑재기기 진화 등 수요처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쇼와덴코가 히타치케미칼을 인수하는 등 구조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봉지재 생산기업은 기술적인 강점을 활용해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Sumitomo Bakelite(SBC)는 글로벌 반도체 봉지재 시장점유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스마트폰, 서버용은 패키지 박형화로 이어지는 MuP(Mold under Fill), 압축성형용 과립 봉지재에 주력하고 있으며 ECU(Electronic Control Unit)의 여러 칩 일괄봉지를 포함해 모터, 인버터 등 열대책 디바이스로는 EMC(Epoxy Molding Compound)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5G용 수요를 개척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가하고 있다.
Nippon Kayaku는 특수 에폭시수지(Epoxy Resin)를 고기능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첨가제가 필요하지 않고 뛰어난 난연성과 내열성을 겸비한 NC-3500은 자동차용 파워반도체에 채용되고 있으며 2019년 9월에는 에폭시수지보다 내열성이 뛰어난 말레이미드수지(Maleimide Resin)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해 5G 기지국 등 하이엔드 영역에 대응하고 있다.
히타치케미칼은 가와사키에 첨단 패키지 소재를 평가하는 솔루션센터를 개설해 차세대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FoPLP는 등급100 클린룸에 전용 노광기를 도입하는 등 세밀한 커스터마이징에 대응하고 있다.
NSCM도 자동차에 탑재하는 전자부품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유리전이온도가 20-30도로 높은 내열성 에폭시수지를 신규 개발하는 등 고온화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고 있다.
FPC, 신소재‧제조공법 개발 적극화
FPC는 5G 보급으로 저유전율, 저유전정접 등이 요구됨에 따라 전기특성이 매우 우수한 LCP, 불소수지를 시작으로 PPS(Polyphenylene Sulfide), PEN(Polyethylene Naphthalate) 등 EP(엔지니어링 플래스틱)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는 잉크젯 기술을 이용한 FPC가 등장하는 등 성능, 가격에 따라 다양한 소재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CP 시장은 무라타가 채용을 늘리고 있으며, 쿠라레는 2019년 가시마(Kashima)에 CCL 양산 시험설비를 도입해 베이스필름과 CCL 분야에서 모두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불소수지는 LCP에 비해 저유전율, 저유전정접에 대한 잠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GC와 다이킨(Daikin Industries)은 낮은 접착성을 극복한 불소수지 필름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도요보(Toyobo)는 PI와 불소수지를 접합한 신소재를 제안하고 있다. PI의 낮은 휨성과 불소수지의 고주파 특성을 겸비한 것이 특징이다.
도요보는 2019년 테이진(Teijin)으로부터 PEN을 포함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사업을 인수해 라인업을 확충했다.
도레이(Toray)는 유전정접이 0.001로 LCP와 전기특성이 동등한 특수 PI를 개발했다.
PPS 시장 진입을 목표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2축연신 PPS필름을 이용해 CCL을 개발했으며 구리박과의 접합, 납땜공정을 연구함으로써 내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로운 FPC 제조공법도 주목받고 있다.
잉크젯으로 기재에 은나노잉크 시드층을 인쇄하고 무전해 도금으로 금속을 성장시키는 에칭공정이 불필요한 획기적인 FPC로, Elephantech가 세이코엡손(Seiko Epson), 미쓰이케미칼(Mitsui Chemicals)과 제휴해 2020년 출하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OLED, 형광·도포공법 관련 기술혁신 활발
디스플레이는 기술 혁신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말부터 폴더블 스마트폰을 시장에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삼성전자, 화웨이(Huawei) 등이 신제품을 출시했다.
양사는 모두 톱커버에 투명 PI필름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플렉서블(Flexible)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와 터치패널 일체형인 Y-OCTA를, 화웨이는 BOE의 패널을 이용해 터치센서를 외부에 장착한 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양사는 톱커버에 질감과 외관이 우수한 초박형 유리 채용을 검토하고 있어 독일 SHOTT을 비롯해 미국 코닝(Corning), 일본 AGC, Nippon Electric Glass 등 유리 생산기업이 R&D를 진행하고 있다.
OLED 소재는 2019년 11월 이데미츠코산(Idemitsu Kosan)과 도레이가 TADF(열활성화 지연형광)와 적색 형광소재를 이용한 OLED 소자를 개발했다.
적색은 주로 인광 발광소재가 이용되고 있으나 원료에 인듐, 백금 등 희소금속이 포함됨에 따라 코스트가 높고 발광 스펙트럼이 넓어 색순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으나, 신규 TADF와 발광 스펙트럼이 좁은 적색 형광소재를 조합함으로써 색순도를 높이는데 성공했고 코스트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OLED 도포공법 개발도 다음 단계에 진입했다.
JOLED는 2019년 11월 세계 최초로 인쇄방식 OLED 디스플레이 양산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험제작 라인에서 디스플레이를 생산해 의료용 모니터, 하이엔드 모니터로 공급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는 인쇄방식으로 기존과 동일한 중형 패널을 생산할 계획이다.
도포공법 OLED 분야에서 고분자를 취급하는 스미토모케미칼(Sumitomo Chemical), 저분자를 취급하는 미츠비시케미칼(Mitsubishi Chemical) 등이 경쟁하고 있다.
퀀텀닷(Quantum Dot) 도포공법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DIC 등이 잉크화를 추진하고 있다.
OLED 소재는 모두 용해되는 반면 입자인 퀀텀닷은 용해되지 않아 균일하게 분산하는 기술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속소재, 첨단 프로세스 대응 가속화
금속소재는 다층화, 고속‧비휘발성 SCM(Storage Class Memory) 실현 등으로 디바이스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원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발트 배선 등 구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안도 실용화되고 있다.
금속소재 생산기업은 인수합병(M&A), 내외부와의 협력관계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JX Nippon Mining & Metals는 Japan Steel Works와 합작기업을 설립해 티타늄강 등 공급능력을 강화했다.
티타늄, 탄탈럼, 나이오븀 등 희소금속은 구리와 동일한 중심 도메인으로 설정해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호쿠(Tohoku)대학에서 출발한 벤처기업으로 배선소재에 특화된 Material Concept에 투자하는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Toho Titanium은 지가사키(Chigasaki) 공장에서 가동을 중단했던 전자빔식 용해로를 재가동해 4N-5N 수준의 저산소 고순도 티타늄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능력은 월 10톤으로 모기업인 JX Nippon Mining & Metals의 스퍼터링 타겟(Sputtering Target) 소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Sumitomo Metal Mining은 반도체용으로 순도 5N의 코발트 및 루테늄을 공급하고 있고, 싱글나노미터 디바이스는 배선소재를 구리에서 다른 원소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대응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구리배선도 헤테로(Hetero) 적층화에 따른 실리콘 인터포저 채용 등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시하라케미칼(Ishihara Chemial)은 2021년 종료되는 신규 중기 경영계획에서 웨이퍼용 구리 필러 기술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운스트림 부문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장치 메이저인 미국 Applied Materials는 비휘발성 메모리용 막 형성 시스템 공급을 시작했고, 자기저항 메모리(M램)는 타이완 TSMC가 28나노미터 프로세스 생산을 발표하는 등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M램용 산화마그네슘은 산소 개질과 직접 막을 형성하는 방법이 채용되고 있어 각 프로세스에 적합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