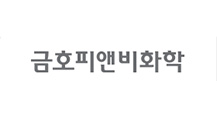화학학회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화학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국민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화학물질 등록·평가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화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가 나섰지만 실제로는 석유화학공업협회, 정밀화학진흥회, 플래스틱조합, 페인트‧잉크조합 등 화학산업 단체들을 대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학기업이나 화학산업 단체들이 직접 나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할 필요성이 절실하나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그러했으리라 생각된다. 혹시라도 밉게 보이거나 찍히면 어떠한 보복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찍힌 전경련이 몇 번 나섰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화학학회들은 화평법‧화관법이 국내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유럽연합(EU)의 REACH를 지나치게 흉내 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항은 더욱 강화함으로써 규제가 과도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명분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 화학산업이 지나치게 강력한 REACH 규제 때문에 몰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무 쓸모 없는 유해성 정보의 생산과 등록을 위해 2021년까지 총 1조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막대한 비용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의 거부감이 너무 심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화학기업들은 화학물질 관리 규제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도 지나치고, 코스트 부담까지 과도하다는 점을 내세워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시늉에 그칠 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은 정부 조치를 거스를 수 없고 비용 측면에서도 투입할 여력이 있어 그런대로 이행하고 있으나, 중소 화학기업이나 군소기업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일부 CEO들은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갈 것을 각오하고 있다며 자포자기하고 있다.
화평법은 화학기업 및 수요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용도, 특성,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대상이 너무 많고 자료를 작성하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중간에 이상한 컨설팅을 내세워 중소기업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원성도 자자하다.
그러면서 영업비밀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서자 안전정보 의무제출 제외 대상을 아주 까다롭게 규정해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며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화관법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화평법과 비슷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 부서가 너무 많아 어지럼증을 호소해야 할 판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화학기업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오기 전에 화평법과 화관법을 개정해야 하고, 특히 환경‧안전 자료 생산과 등록 코스트를 낮추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