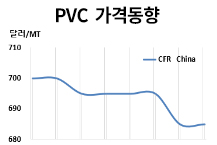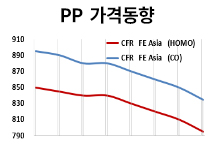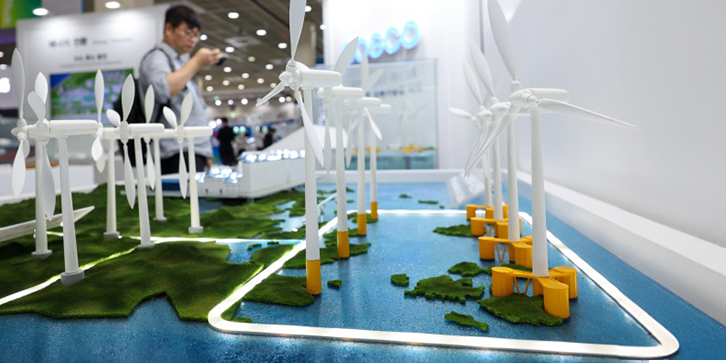중국 배터리 메이저들이 한국을 추월함은 물론 세계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CATL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 LG에너지솔루션을 간발의 차로 뒤쫓고 있음은 물론 중국을 포함하면 이미 1위로 올라섰다. CATL, BYD의 점유율은 2022년 50%, 2023년 6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K-배터리로 지칭되는 LG, SK, 삼성 3사는 점유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중국기업들은 LFP를 앞세워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국내 3사는 LFP를 개발하는 단계에 머물러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기업의 급부상은 대형 수요처 확보, 배터리 제조 코스트 절감과 함께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자동차(NEV) 보조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CATL은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급성장하고 있고, BYD는 1995년 설립 이후 배터리 생산에 집중했으나 2003년 완성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면서 내부 공급을 바탕으로 배터리 사업을 급격히 키우고 있다.
2015년 일본 파나소닉이 배터리 시장을 주도할 당시에는 글로벌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테슬라, BYD가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예견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고, CATL과 BYD이 두각을 나타낼 것을 예측하는 관계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테슬라는 고급 자동차, BYD는 중저가 자동차를 공략하면서 경쟁 없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BYD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를 시작으로 중저가 순수 전기자동차(BEV)를 주력으로 육성함으로써 하이엔드 순수 전기자동차에 집중한 테슬라와 차별화한 것이 성공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터리 저코스트화도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저가의 LFP 배터리 개발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BEV, PHEV는 공급가격 중 배터리 비중이 높아 배터리 코스트 절감을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들은 사양을 표준화하고 저코스트화를 추진하면서 완성 자동차의 사양 변경 요청을 최대한 배제하고 규모화함으로써 코스트 절감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NEV 보조금을 살포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의 NEV 보조금은 2022년 말 종료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도 중국의 BEV, PHEV 판매량이 크게 증가해 중국이 글로벌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보조금은 테슬라, BYD의 전기자동차 약진과 함께 CATL과 BYD의 배터리 수요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중국 CATL과 BYD, K-배터리 3사, 일본 파나소닉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유럽배터리연합(EBA)을 출범시키며 역외 의존도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을 통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용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테슬라는 텍사스 공장에서 배터리 내제화에 착수했고, BYD는 이미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으며, 도요타는 전고체전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배터리 3사는 LFP 배터리 개발이 늦어 중국기업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고, 전고체전지를 개발함으로써 전세를 한번에 역전시킬 필요성이 있으나 삼성SDI가 도요타와 겨룰 수 있을까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K-배터리가 미국의 중국 견제 분위기를 타고서라도 메이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