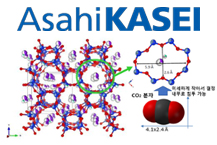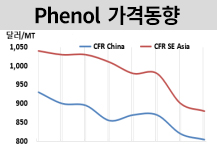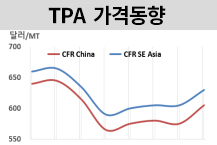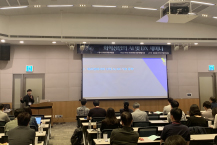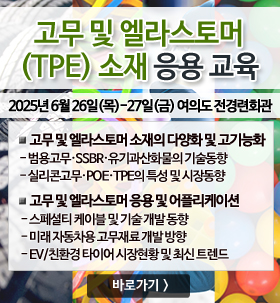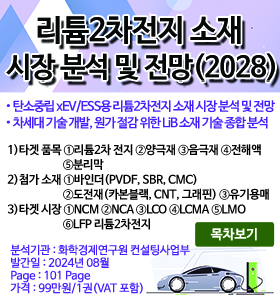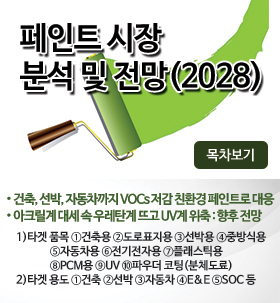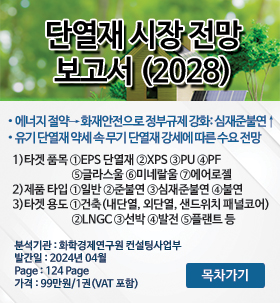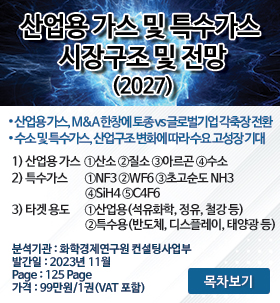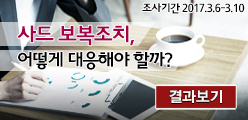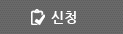|
화학저널 2025.03.10

반도체를 둘러싼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무자비한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 지형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반도체도 예외가 아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위로 떨어진 반도체 강국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글로벌 최대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메이저 타이완 TSMC가 미국에 10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나선 마당이어서 미국이 5년 후에는 글로벌 첨단 반도체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타이완에 크게 밀려남은 물론 4위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점유율은 2024년 타이완 43%에 중국 34%로 중국계가 시장을 좌우할 위치를 확보했고 2027년에는 중국 45%에 타이완 37%로 역전되며 미국 설계, 한국·타이완 제조, 중국 소비라는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도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21년 11%에서 2030년 22%로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TSMC가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추가 투자를 망설이고 있음은 물론 약속한 투자 보조금마저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TSMC는 65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3개를 건설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1000억달러 추가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한국을 완전히 제치겠다는 의중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반도체 후진국으로 전락한 일본의 부흥 의지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TSMC를 끌어들임은 물론 TSMC 공장 주변에 반도체 소재․장비 공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점을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는 일본을 넘어 타이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은 물론 중국 진출을 적극화하고 있고, 미국 투자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을 중심으로 신증설을 추진하는 전략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화권, 미국으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0년 이전까지 반도체 최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밀려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삼성전자가 경영 위기를 겪으면서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서 뒤처진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대신해 HBM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소재․장비를 국산화하지 못한 요인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다.
미국 조지타운대에 따르면, 중국은 2018-2023년 6년 동안 반도체 관련 논문을 총 16만852편, 미국 7만1688편, 인디아 3만9709편, 일본 3만401편을 발표했으나 한국은 2만8345편으로 5위에 머물렀다. 대학 진학에서도 의대 집중 현상이 두드러져 반도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TSMC가 미국에 5개에서 10개 공장을 신규 건설함은 물론 타이완에도 11개 신규 생산라인을 건설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평택․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나섰으나 전력 송전망이나 용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할 연구개발 인력까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하나 52시간제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암담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화학저널 2025년 03월 10일>
|